한로(寒露),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10월 8일(2025년도 같음)은 한로(寒露)다. 한로는 추분과 상강 사이에 드는,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다.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는 시기다. 세시 명절인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 양력으론 10월 13일)과 비슷한 시기지만 한로에는 특별한 민속 행사가 없다.
한시에, 한로를 전후하여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주를 담그며, 머리에 수유를 꽂거나, 높은 데 올라가[등고(登高)] 고향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중양절의 민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는 것은 잡귀를 쫓기 위함으로 이는 수유 열매가 벽사(辟邪)의 힘이 있는 붉은 자줏빛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한로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3후(候)로 나눠서,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들고,
차후(次候)에는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가 되고
말후(末候)에는 국화가 노랗게 핀다.”
고 하였다.
한로 즈음은 찬 이슬이 맺힐 시기여서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가을걷이인 타작이 한창일 때다. 하루가 무섭게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 이 절기가 시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한로(寒露)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한로 무렵은 무성하던 잎사귀에 단풍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제비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한로가 추워지는 기점임을 강조한 속담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
“제비가 오면 기러기가 가고, 기러기가 오면 제비는 간다.”
등이 있다.

이 무렵의 시절 음식으로 서민들은 추어탕(鰍魚湯)을 즐겼다. 양기를 돋우는 데 좋다는 미꾸라지는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고기다. ‘미꾸라지 추’ 자를 ‘고기 어(魚)’에다 ‘가을 추(秋)’를 붙여 쓰는 것은 그런 까닭일까.
한로 무렵이면 떠올리는 시가 있다. 신동집(1924~2003) 선생의 시 ‘송신’이다. ‘송신’의 시구 가운데 “바람은 한로(寒露)의/음절을 밟고 지나간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무심한 가을의 풍경을 통하여 시인은 죽음과 조락(凋落), 그 존재의 한계를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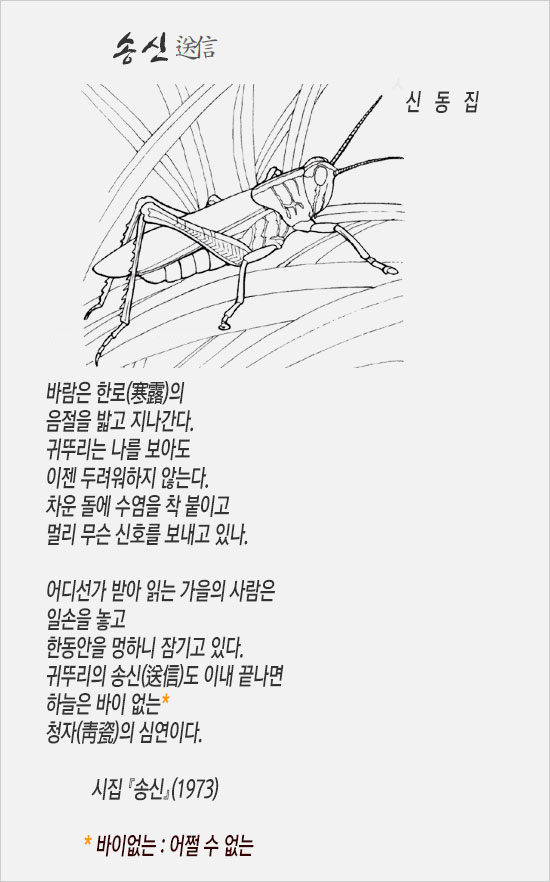
시인은 한로를 ‘귀뚜라미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로 이해한다. 다가오는 죽음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귀뚜라미는 “나를 보아도 / 이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귀뚜라미가 보내는 ‘신호’는 죽음을 예감하는 울음이다. 그 신호를 받아 읽는 화자도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떠올리며 “멍하니 잠기고 있다.” 그 역시 ‘가을의 사람’인 까닭이다.
‘송신’에 담긴 ‘시간의 순환과 죽음’


그러나 가을 “하늘은 바이없는 / 청자의 심연이다.” 유한자(有限者)에 불과한 생명, 그 조락이나 죽음과 대조적으로 자연은 그렇게 초연한 모습인 것이다. 이 시를 발표한 것은 1973년, 시인이 40대 후반일 때다. 한로 무렵의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간의 순환과 죽음’을, ‘유한자적 존재의 비애’를 노래한 시인은 지난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
대학에서 나는 세 학기에 걸쳐 그에게서 ‘교양 영어’ 수업을 들었다. 이래저래 친구들이 좋을 때라 나는 수업을 자주 빼먹었다. 출석을 부르고 난 뒤 기회를 엿보아 강의실 문을 나서다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는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그의 멋있는 은발과 무심한 듯 대범한 태도를 지금도 아련하게 떠올릴 수 있다.
굶어 죽은 모자의 주검이 몇 달 만에 발견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2019년, 한집 살던 누이가 1년 만에 옆방서 오빠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는 세상은 더는 우리 삶의 자리가 엄숙하지도 존귀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풍요와 수확의 기쁨이 있음에도 가을이 쓸쓸한 까닭은 이 ‘시듦과 떨어짐[조락(凋落)]이 계절과 삶의 순환을 환기해 주기 때문이다. 크게는 우주의 운행에서 작게는 뭇 인간들의 생로병사에 이르기까지 이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시간은 진화하고 있다.
2019. 10. 7. 낮달
[서(序)] 새로 ‘24절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을 절기
입추(立秋), 어쨌든 여름은 막바지로 달려가고
처서(處暑), “귀뚜라미 등에 업히고, 뭉게구름 타고 온다”
백로(白露), 벼가 여물어가는 분기점
추분(秋分),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도 숨는다
상강(霜降), 겨울을 재촉하는 된서리
'이 풍진 세상에 > 세시 풍속·24절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⑦ 입하(立夏), 나날이 녹음(綠陰)은 짙어지고 (8) | 2024.05.04 |
|---|---|
| 입춘과 설을 지내고 (6) | 2024.02.10 |
| 사라져가는 것들…, ‘제석(除夕)’과 ‘수세(守歲)’ (4) | 2024.02.09 |
| 갑을병정, 자축인묘…, 간지는 과학이다 (0) | 2019.02.04 |
| 새로 ‘24절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 | 2019.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