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 시대의 추억 ‘갱죽’ 또는 갱시기

지난 주말이었다. 공연히 그게 당겨서 나는 아내에게 갱죽을 끓여 달라고 부탁했다. 아내는 ‘뜬금없이, 웬?’ 하는 표정이었지만, 늘 하던 대로 죽을 끓여냈다. ‘갱죽’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래기 따위의 채소류를 넣고 멀겋게 끓인 죽’으로 올라 있다.
소리가 주는 느낌이 아주 토속적이어서 ‘고장 말’인가 싶지만 천만에 국 ‘갱(羹)’자에다 죽 ‘죽(粥)’를 쓴 표준말이다. ‘갱(羹)’은 무와 다시마 따위를 넣고 끓인 제사에 쓰는 국(<다음한국어사전>)이니, 갱죽은 거기다 식은밥을 넣은 국인 셈이다.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위키백과’에서는 내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의 향토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위키백과에 그런 소개가 올라간 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칠곡군과 경북과학대학 향토문화재연구소에서 1999년에 발간한 《칠곡군의 문화유산조사 및 문화진흥계획》이라는 보고서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갱죽’은 칠곡군만의 음식은 결코 아니다. 조금씩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갱죽은 경상도뿐 아니라 아마 전국에 전하는 음식인 듯하다. 갱죽은 ‘갱시기[갱식(羹食))’, 또는 ‘국시기’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렸다. 갱죽은 식구는 많고 양식은 부족했던 저 ‘절대빈곤’ 시대의 슬픔이 아롱져 있는 음식이다.
갱죽

갱죽은 경상북도 칠곡군의 향토음식이다. 별칭으로 ‘갱시기’, ‘갱식이’, ‘김치죽’ 등으로 불린다.
개요
국시기는 갱죽이나 갱시기라고도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갱식이, 김치죽이라고도 하는데, 칠곡 지역에서는 대체로 갱죽이라 많이 부른다. 국시기는 대부분 서민 가정에서 1970년대 이전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식구의 끼니를 때울 때 흔히 해 먹던 음식이다. 당시 식구는 많고 양식은 부족했다. 그래서 양식을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해 남은 밥이나 곡식 등에 김치나 콩나물 등 기타 채소류를 듬뿍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멀겋게 끓여서 먹었다.
만드는 법
국시기는 시대별 · 지역별 또는 가정마다 만드는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다. 현재 칠곡 지역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갱죽을 만들어 먹는다. 먼저 멸치를 찬물에 살짝 헹궈서 넣고 필요한 양의 물을 부어 멸치 맛이 우러나게 끓인다. 다음으로 멸치를 걷어내고 멸치 맛국물에 김치를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끓이다가 찬밥을 넣고 한소끔 더 끓이면 된다. 국수, 라면, 콩나물 같은 게 있으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든 함께 넣어 만들어도 별미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예로부터 국시기는 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었던 생존(生存) 차원의 음식이었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겨울과 봄 동안 보리밥 덩이에 시퍼런 무청 김치를 넣어서 끓인 국시기로 끼니를 때우면서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별미로 즐기거나 해장국으로 끓여 먹는 음식이 되었다. 생활이 넉넉해지고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다 보니, 재료 또한 고급화되어 이제 국시기는 그야말로 웰빙(well-being) 음식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위키백과>에서
나도 갱죽을 먹으며 자랐지만, 그것은 ‘양식을 아끼느라고 김치나 콩나물 등 채소류를 넣고 물을 부어 멀겋게 끓인’ 죽은 아니었다. 방앗간 집에 양식이 부족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집에서 갱죽을 먹는 것은 일종의 별미였다. 선친께서 워낙 좋아해 자주 끓인 누렁 국수와 함께 갱죽은 입맛 잃은 어른들께는 특식이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집에서 끓이는 갱죽은 시래기가 아니라 김치를 넣는다. 콩나물을 넣으면 더 좋고, 때에 따라 밀가루 수제비를 넣기도 한다. 밥은 식은 밥을 넣는 게 제격이지만, 식은 밥이 따로 없으면 아예 쌀을 넣어 끓여낸다.
절대빈곤 시대의 아픈 추억
갱죽을 배곯던 어린 시절을 달래던 음식으로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아픈 추억이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은 더욱더 애틋한 한 시절의 추억으로 아롱진 음식이다. 그것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시장기’ 같은 것이라고 나는 짐작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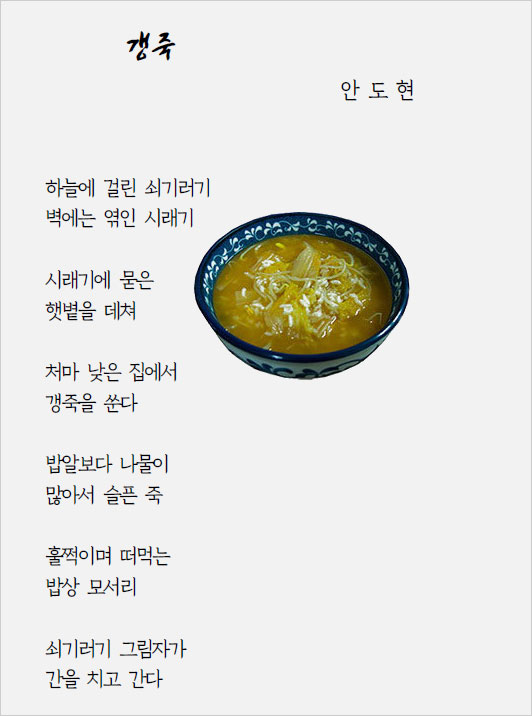
경북 예천 출신의 시인 안도현도 ‘갱죽’을 노래했다. 거기서도 역시 그것은 ‘배고픈 시장기’다. 글쎄, 안도현이 어린 시절에 배를 곯고 자랐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시인의 노래가 어찌 시인 자신의 고유한 체험뿐이겠는가. ‘밥알보다 나물이 / 많아서 슬픈 죽’이라는 표현에 담긴 것은 저 60대의 보편적 가난일 터이다.
어린 시절의 주림으로 갱죽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과 달리 나는 단지 한 시절에 대한 추억으로만 그것을 떠올린다. 미각은 가장 정직하게 한 시대의 삶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내 어린 시절의 동무들이 겪었던 가난과 주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랐으니 나는 억세게 운이 좋았다. 그러나 그건 또 어쩌면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빚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갱죽의 맛은 뭐랄까, 밋밋한 듯하면서 이상하게 구미를 당기는 무언가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묽은 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게 풀어진 밥알이 살갑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은 아주 특별하다.
묽은 죽이다 보니 어지간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지금이야 별미로 먹는 음식이지만 가난했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갱죽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속인 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죄어온다. 아, 그렇다. 내 어린 시절의 동무들은 대부분 저 갱죽으로 시장기를 면한 세월을 살았었다.
얼마 전에 시골 초등학교 동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언제나처럼 이삼십 명쯤의 옛 동무들이 모여서 지난 세월과 현재를 나누었으리라. 나이 들면서 벗들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와 옛 동무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나 보았다. 그것은 사무치는 한 시절을 함께 달려온 삶과 눈물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른다.
2010. 9. 16.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미각과 삶, 혹은 추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 이야기 (0) | 2019.06.26 |
|---|---|
| 콩나물밥, 한 시대와 세월 (0) | 2019.05.03 |
| 무, 못나도 맛나고 몸에 이롭다! (0) | 2019.04.05 |
| 진달래 화전과 평양소주 (0) | 2019.03.31 |
| 쑥, 혹은 한 시절의 그리움 (0) | 2019.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