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케의 시 ‘가을날’의 초가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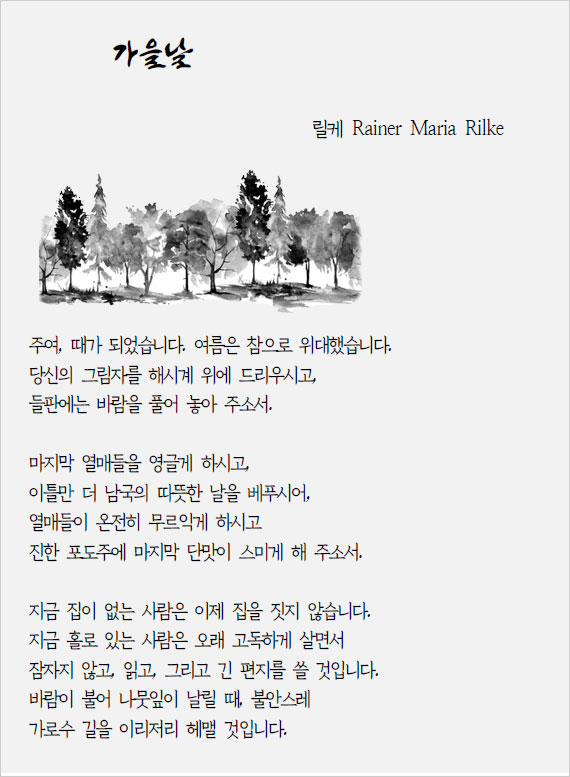
서둘러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심하게 그걸 바라보고만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일주일 후면 한가위인데도 고단한 삶이 서툰 감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일교차가 크다고는 하나 한낮의 수업도 그리 힘들지 않다. 열어놓은 출입문과 창문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의 손길은 부드럽고 살갑다.
그러나 여전히 창밖의 햇볕은 따갑다. 여름내 타오르던 정염(情炎)은 시방 마지막 갈무리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고 있는가. 익어가는 것들을 위한 ‘남국의 햇볕’을 노래한 릴케의 시구를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 이 뜨거운 햇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늦여름, 초가을의 햇볕은 모든 작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이 풍작을 예비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햇볕은 과실의 당도를 높이고, 곡식을 여물게 한다. 초가을에 불어오는 태풍을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가을날’은 아마 릴케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아닌가 싶다. 나는 그것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다.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쓴다는 ‘긴 편지’와 그가 헤맬 것이라던 ‘가로수 길’의 이미지가 오래 가슴에 남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을날’이 사람의 정서에 녹듯 스미는 것은 ‘지난여름’을 ‘위대’했다고 회고하는 서정적 자아의 경건한 태도에 담긴 진정성 때문이다. 시인은 ‘결실’과 ‘조락(凋落)’이라는 ‘역설’ 앞에 선 존재의 본질을 그윽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계절이 가진 두 속성, ‘풍요’와 ‘적막’은 각각 세계와 인간의 내면적 고독과 조응된다. 가을이 되어도 ‘영혼의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을 맞이하면서 고독과 불안 속에 침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읽고, 긴 편지’를 쓴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실존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가을의 속성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연관 지으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가 노래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다.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성싶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는다는 진술 앞에서 우리는 이 고단하고 각박한 삶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릴케는 이 땅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으면서도, 그의 시와 삶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두이노의 비가》를 그의 대표작으로 이르지만, 그 시를 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흔히들 ‘장미를 사랑했고 그 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릴케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릴케의 ‘가을날’을 읽으면서 이동원의 목소리로 고은 시인의 노래 ‘가을 편지’를 듣는다. 한가위가 코앞이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축원했던 가을의 풍요를 확인하는 명절, 올 한가위는 서민 대중들의 고단한 살림살이를 얼마나 위로할는지……. 한가위 대목 밑의 주말, 학교와 집 주변을 돌면서 찍은 사진 속에 담긴 초가을 풍경을 쓸쓸하게 들여다본다.


2008. 9. 7. 낮달
* 릴케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완전무결한 서정시인쯤으로 인식되는 이다. 그러나 박홍규 전 영남대 교수는 릴케가 실제로는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맞선 반민주 시인이었고, 독재와 영웅주의를 미화하고 전쟁과 죽음을 숭배하며 도시와 시민을 혐오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박홍규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누가 릴케를 함부로 노래하나>(푸른들녘, 2017) 참고]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가을, 산, 편지 (0) | 2021.09.13 |
|---|---|
| 숲 산책, ‘가지 않은 길’ (0) | 2021.09.07 |
| 메밀꽃의 발견 (0) | 2021.09.03 |
| [사진] 회룡포의 ‘청소년 우리 강 체험’ 행사 (0) | 2021.07.25 |
| 패랭이, 그 꽃과 갓 (0) | 2021.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