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희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좋은 시인이나 작가를 제때 알아보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부채감은 꽤 무겁다. 그것은 성실한 독자의 의무를 회피해 버린 듯한 열패감을 환기해 주는 까닭이다.
제때 읽지 못했던 시인 작가로 떠오르는 이는 고정희 시인과 작가 공선옥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시인·작가는 수없이 많을 터이다. 요컨대 내가 말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다.)
공선옥은 내게 그를 너무 늦게 읽은 걸 뉘우치게 한 작가다. 2003년에 그의 소설집 『멋진 한세상』을 읽고 나서 나는 책 속표지에다 그렇게 썼다. 너무 늦었다……. 나는 삶을 바라보는 공선옥의 눈길과 태도에 전율했다.
나는 그이의 삶과 그가 그리는 삶이 어떤 모순도 없이 겹친다는 걸 알았고, 망연자실 나머지 작품집들을 찾아 읽었다. 내 서가에 꽂힌 세 권의 소설집 속에 그려진 공선옥의 삶과 세상을 언젠가 한 번 주절대 볼 작정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고정희(1948∼1991) 시인이 1991년 지리산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잠깐 그의 죽음을 추모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그이의 시는 「고백」(그대에게로 가는/그리움의 전깃줄에/나는/감/전/되/었/다) 따위에 그쳤던 듯하다. 한때의 습작기가 있었지만 정작 시는 한 편도 써 보지 않아서인지 나는 시에 대해선 무심했기 때문이다. [관련 글 : 가사노동,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

고정희를 읽어야 할 것 같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그이의 유고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비, 2005)를 산 게 지난해 6월이다. 시인이 세상을 뜬 이듬해에 펴낸 시집인데 내가 산 책은 초판 13쇄다. 글쎄, 모두 몇 부가 팔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3이라는 숫자는 시인에 대한 독자의 기억이 만만찮다는 걸 떠올려 주기엔 충분하다.
한 해 동안 묵혀두었던 유고시집을 읽는데 그이에 대한 평가와 시적 이력이 좀 아프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함께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했고, “‘5·18 광주항쟁을 계기로 전통적인 남도 가락과 씻김굿 형식을 빌려 민중의 아픔을 드러내고 위로하는 장시(長詩)’를 잇달아 발표”했다는.
제1부 ‘밥과 자본주의’ 연작인 「몸 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을 읽으면서 나는 1964년 김수영 시인이 발표한 시 「거대한 뿌리」의 한 구절을 얼핏 떠올렸다. 김수영이 ‘네에미 씹’과 ‘개좆’, 그리고 ‘미국놈 좆대강이’를 능청스럽게 노래한 것처럼 고정희는 한 ‘몸 파는 여인’의 입으로
씹-할-놈의 세상에서 / 씹-팔-년 배 위에 다리 셋인 인간 태우고 / 씹구멍 바다 뱃길 오만 리쯤 더듬어온 여자라(‘장고, 쿵떡’)
고 노래한다. 김수영의 일갈과 고정희의 그것을 동렬에 둘 수 없을지라도 두 시인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닮아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겠다. 시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처럼 인식되는 시적 압축이나 절제 따위와는 무관하게 방심한 듯 써 내려간 무심한 서술들은 그러나, 흠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낮은 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사람의 눈길이고 목소리인 까닭이다.



시인 김남주에게 그랬듯이 고정희에게도 시는 해방을 위한 무기였다. 고정희에게 그 해방은 민족과 민중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해방이었다.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을 통해 여성 운동가로 변신한 시인은 1990년, 필리핀에서의 열린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숍’을 통해 제삼세계에서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억압, 가난과 매매춘을 확인한다.
이 유고시집은 바로 그 같은 현실에 대한 분노의 보고서이다. ‘밥과 자본주의’, ‘외경 읽기’는 자본주의의 현실과 신에 대한 신랄한 독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 밥과 자본주의 연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자매여, 네 사랑이 믿음을 구했다 / 그대 속에 인류의 어머니가 있노라 / 세상은 여자도 구원받는다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 가자, 그대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 그대 거처를 근심하지 말라…… -「밥과 자본주의 - 구정동아 구정동아」 중에서
며칠 전에는 아이들에게 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가르쳤다. 인간의 영혼을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있는 이 시를 관통하는 것은 고통과 절망에 맞서는 의지와 세계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다. 화자는 고통의 본질로 다가가고, 고통과 살 맞대고 가서, 마침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자고 노래한다.
영원한 비탄도 슬픔도 없다는 확신의 근거는 ‘캄캄한 밤이라도’ 오고 있는 ‘마주 잡을 손 하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그 손은 절대자의 그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웃의 것이니 이는 곧 연대에 대한 확신이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연대”라는 이 시의 주제가 공감으로 다가오는 까닭도 다르지 않다.[ 시 전문 텍스트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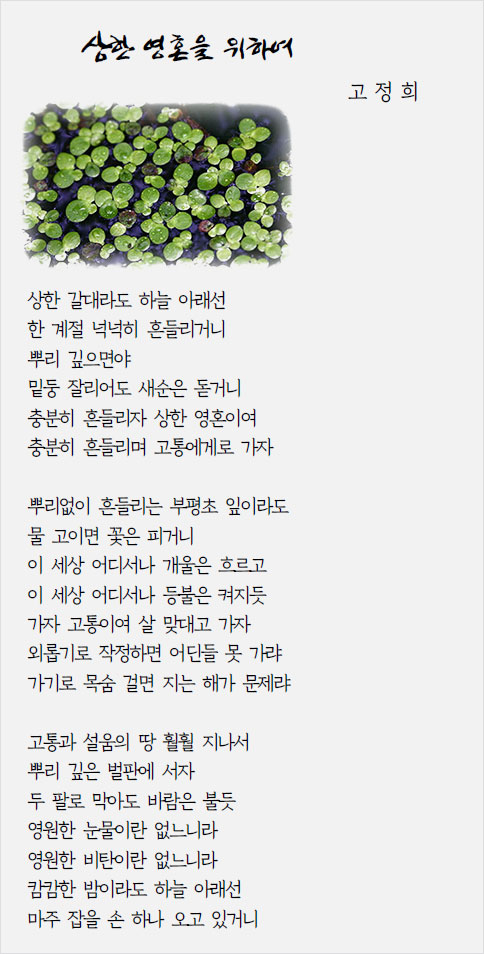
고정희의 시에는 짙은 슬픔이 깔려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는 끝 간데없는 허무감이나 좌절감을 거부한다. 그의 시는 오히려 어떤 활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이 힘이, 슬픔과 어울려 만들어 내는 절묘한 공간이 그의 시의 핵심을 구성한다. 그 공간은 오늘 우리 시에서 매우 소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시적 성취이다.
‘슬픔의 힘’으로 그의 시를 바라본 이는 비평가 김주연이다. 김주연은 또 그것을 “이 땅 어둠의 한계에 대한 통절한 아쉬움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이며, 그 어둠이 모두 우리 자신들의 것이라는 아픈 인식에서 유발되는 슬픔”이라고 말한다. 슬픔을 ‘세계를 인식하는 원초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평자에게 슬픔은 힘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표제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기왕의 연작들과는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여백을 노래한다. 그 여백은 부재의 공간, ‘쓸쓸함’이라면서 그는 우리에게 ‘사립에 걸린 노을’, ‘발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이 간 지 벌써 17년, 그이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여백이 되었다. [시 전문 텍스트로 보기]


2008. 7. 31.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공한 ‘작가’의 표절은 ‘무죄’다?” - 신경숙 표절 논란 (2) | 2020.06.04 |
|---|---|
| 그 삶과 시- 박영근 유고 시집『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0) | 2020.06.02 |
| 슬픔’과 ‘분노’를 넘어 ‘여성성’으로 (0) | 2020.05.25 |
| 50대 중반에 첫 시집, 조성순을 지지함 (1) | 2020.05.24 |
| 『청구영언』의 ‘능청능청 부르는 노래’들 (0) | 2020.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