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조성순 첫 시집 <목침>

며칠 전, 학교로 우송되어 온 시집 한 권을 받았다. 조성순 시집 <목침(木枕)>(2013년, 작은숲). 그는 내 고등학교 후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문예 동아리 ‘태동기(胎動期)’의 2년 후배, 1974년 그가 입학해 문예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나는 3학년이었다.
고교 문예 동아리 후배 시집을 내다
글쎄, 선후배 간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후배가 별로 없는 것은 세월이 꽤 흐른 탓일 터이다. 아, 시집 <홀로서기>로 유명해진 서정윤이 그의 동기다. 별 교유가 없었어도 나는 그가 예천 촌놈이란 건 알고 있었다.
학년 초였을 게다. 우리 학교만 있었던 동아리 교실에서임은 분명하다. ‘문예실’이라는 그 방은 늘 일상적 잡담과 시건방진 요설, 문학적 일탈을 모의하곤 하던 우리들의 아지트였다. 3학년 몇몇이 신입생들의 인적 사항을 따고 있던 어느 오후였을 것이다.
“조성순, 넌 집이 어디냐?”
“예. 경북 예천입니다.”
“예천? 거기가 어디쯤인고?”
“예. 안동 근처입니다.”
그쯤의 수작이 오갔을 것이다. 그러나 안동 근처라고 해서 예천이 어디쯤인지 어림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는 어차피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고작 열아홉 살이었고 아무도 자기 고향 밖을 떠나보지 못한 소년들이었으니까.
“예천 어딘데?”
“예. 예천군 감천면 찬샘골입니다.”
“찬샘골?”
“예. 와전되어서 ‘참새골’로 부르기도 하지요.”
‘찬샘골’은 촌놈 같지 않게 해사한 얼굴의 새내기 조성순을 내게 기억하게 하는 열쇳말이 되었다. 나는 ‘찬샘골’이 ‘참새골’이 되는 과정을 단박에 이해해 버렸고, 어느새 예천의 어느 한적한 골짜기 마을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다다. 더는 고교 시절에 이들 후배와의 교유는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 내가 이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몇 해 후다. 나는 조성순이 서울의 한 사립대로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작 나는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영장을 받았고, 33개월 후에 만기 전역했다.
1989년, 해직 교사로 다시 만나다

제대하던 해, 2월에 동아리 선후배들이 모임이 있었다. 거기서 조성순을 만났던가는 기억에 없고 조성순의 3년 후배로 ‘시를 기똥차게 쓴다’는 똘똘해 뵈는 작달막한 소년의 인사를 받았는데 그가 안도현이다. 안도현도 예천 출신이었으니 조성순에겐 학교뿐 아니라 고향 후배이기도 했다.
조성순과 안도현을 다시 만난 것은 89년인가 90년이다. 셋 다 전교조 해직 교사가 되어서였다. 조성순은 서울 단대부고에서 안도현은 전북 이리중학교에서 각각 해직되었다. 서울에서 열린 해고자 집회에서 우리는 만났고, 그날 밤을 나는 안도현과 함께 조성순의 집에서 보냈다.
졸업한 지 10년도 지나 만났으니 서먹하기도 했고, 안도현의 일행이 있어서였을까. 우리는 술을 한잔 마시고 그의 집에서 이런저런 이가 맞지 않는 대화를 나누다가 일찍 자리에 들었다. 안도현이 내게 몇 권의 시집을 우송해 온 것은 그로부터 몇 주 후였다.
안도현이 일찌감치 신춘문예를 거쳐 등단한 이래 차곡차곡 문명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조성순은 주로 ‘교육문예창작회(교문창)’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광웅, 김춘복, 김진경, 도종환, 안도현, 정영상, 조재도 등과 함께 교문창을 창립하고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내 주변에도 교문창에 참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 근처에 어른거리지 않았다. 서른을 전후해 습작기를 마감하고 한, 이른바 ‘성실한 독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나는 지금껏 잘 지켜왔다. 어차피 버린 길, 나는 어정쩡하게 그 주변을 서성대고 싶지 않았다. 조성순과 이후의 교유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헤어진 뒤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30대 초중반이었던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쉰이 넘어서였으니까. 내가 조성순을 다시 만난 것은 두어 해 전이다. 아직도 예천을 지키고 계신 모친을 찾은 그와 나는 술 몇 잔을 나누고 황망히 헤어졌다.
며칠 전 전화로 그를 다시 만났다. 귀향한 그를 만나 술잔을 나누던 선배 교사가 걸어온 전화를 통해서였다. 우리는 몇 해 전의 황망한 만남을 주제로 두어 마디 안부를 나누었다. 그가 시집을 냈다고 했고 나는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어저께 학교로 그의 시집이 도착한 것이다.
“살아서 시집을 내게 되니 과분한 행사”
시집 뒤표지에 실린 추천사에서 안도현은 ‘술 한 잔 따라 놓고 읽으며 울고 싶은 시’라고 말했지만 ‘오십 중반을 훌쩍 통과한 시인의 첫 시집’인데 무어 요란을 떨 일이 있으랴. 자서(自序)에서 그는 ‘옛사람은 마흔 전에 책을 내는 것을 경계했는데, 그를 넘겨서 다행이고, 살아서 시집을 내게 되니 과분한 행사’라고 했다. 굳이 ‘살아서’를 강조한 것은 그와 교문창을 함께 했던 이들 가운데 이광웅이나 정영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그러고 보니 1993년에 떠나보낸 정영상은 내 친구이기도 하다.
그렇게 쓴 그의 마음을 무심히 곁눈질하면서 나는 고개를 주억거린다. 나는 그만큼 차분하게 시집을 뒤적였다. 나는 가끔 사람과 함께 시가 늙는 것을 느끼곤 한다. 육신의 노화만큼이나 시의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나 어쩐지 그걸 확인하는 순간은 꽤 쓸쓸한 느낌이 있다.
나는 그의 시가 그의 몸만큼 늙지 않았기를 바랐다. 시 서너 편을 읽고 나서 나는 아, 이 친구의 시가 아직 그리 늙지는 않았구나 싶었다. 뭐라 할까, 그의 시에서는 고교 시절 우리의 스승이셨던 도광의 선생의 서정이 언뜻 비치곤 했는데 그것도 나는 반갑고 아련했다. [관련 글 : 옛 스승 도광의 시인과 제자들]

<목침>이라는 좀 구태의연한 제목도 오히려 절제처럼 느껴진다. 공연히 ‘무슨 척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걸 꺾어진 50대는 아는 것이다. 표제작은 그의 가족사를 다룬 듯하다. 1908년에 태어나 2007년에 세상을 버렸으니 우리 나이로 백수(白壽)를 누린 조부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이 시는 둔중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 땅에 왔다가 스러진 숱한 삶 가운데 어디 아프지 않은 것이 있으랴마는, 이웃의 이 슬픈 가족사가 이 땅의 고단한 현대사의 한 갈피였음을 새삼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건조하게 되뇜으로써 그는 그 슬픔을 담담히 넘는 법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다.
시 ‘산월 수제비’는 2008년 계간 <문학나무> 신인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늘 우리네 삶이란 게 ‘종점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중심에서 벗어나 외곽지로 가고 있는 것’. 그럴 때 산월네 ‘수제비 칼국수 한 그릇’을 ‘눈물 콧물 섞어 먹다 보면 / 어느새 하늘엔 빗방울도 성글어지고 / 내게는 반짝이는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도 일상의 위로로 넘어가는 법을 그는 그렇게 심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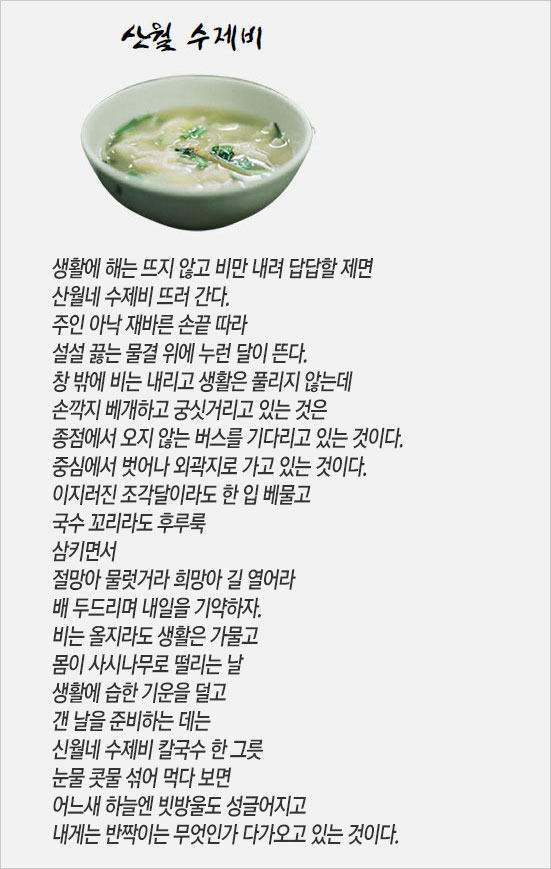
조성순은 지난번 통화에서 ‘곧 퇴직해 시골에 내려와야지요’라고 했다. 할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의 귀향을 지지한다. 오매불망 명퇴를 그리면서도 고법에서 멈추어버린 ‘정치자금법 등(等)’에 밀려서 여전히 그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다만 그가 부럽기만 할 뿐이다.
무엇보다 나는 ‘꺾어진 50대’에 분연히(!) 시집을 낸 그의 용기를 지지한다. 젊은 시절에 시집을 내는 일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듯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에 제 이름자 박힌 책을 낸다는 것도 보통 이상의 용기가 따라야 하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워낙 멀리 있으니 그에게 막걸리 한 잔을 사는 일도 쉽지 않다. 시집 속표지에 쓰인 고졸한(!) 그의 필적과 장서인(藏書印)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 ‘제법 그럴듯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다. 그가 고향인 찬샘골로 귀환할 때쯤엔 나도 팍팍한 ‘연금생활자’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책머리에 바친 헌사에 따르면 1908년에 나서 2007년에 영면한 그의 조부는 ‘선(仙)’자, ‘학(鶴)’자를 쓰시는 어른이시다.
2013. 5. 2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정희,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여백’이 된 (2) | 2020.06.01 |
|---|---|
| 슬픔’과 ‘분노’를 넘어 ‘여성성’으로 (0) | 2020.05.25 |
| 『청구영언』의 ‘능청능청 부르는 노래’들 (0) | 2020.05.14 |
| 이 그림 한 장이 보여주는 ‘역사’의 결정적 오류 (0) | 2020.04.07 |
| 에베레스트- ‘등반의 상업화’가 부른 ‘탐욕과 협잡’ (0) | 2020.03.14 |





댓글
낮달2018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