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일상, 자투리땅에도 재배하는 박 이야기



지난 주말에는 장모님 밭에 다녀왔다. 손을 못 대 하우스 안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좀 매고, 수확 시기를 놓쳐서 곯고 있는 고추를 따기 위해서다. 두어 시간 남짓 땀을 흘리고 나니 하우스 안 인물이 훤해졌다. 딴 고추는 하우스 한복판에 깔아놓은 천막지에다 널었다.
두어 시간 하우스 안에서 몸을 움직였더니 땀이 흠뻑 났다. 하우스에서 나와 밭을 돌아보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났다. 아내가 하우스에 오래 있으면 가끔 그렇다면서 쉬라고 했다. 사진기를 꺼내 이것저것 밭과 작물을 찍었다.
농로와 붙은 밭의 비탈면에는 박을 심었다. 적지 않게 따냈는데도 아직 열매를 맺기 시작한 놈부터 제법 굵어진 놈까지 박은 군데군데 열려 있다. 아내가 가끔 내어놓는 박나물도 여기서 자란 놈이다. 호박이든 박이든 이런 자투리땅에 심어서 거두는 작물인 것이다.
박은 삼국시대 ‘이전’에 들어왔다
박은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한해살이풀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원산지라고 하나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 <삼국사기>에 박혁거세의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진한 사람들은 박[호(瓠)]을 ‘박(朴)’이라 부르는데, 처음에 큰 알이 마치 박과 같았던 까닭에 박을 성으로 삼았다.(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권

당시의 박이 오늘날의 박과 얼마나 비슷한지는 알 수 없지만, 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식물 이름으로 붙인 성씨이므로 박 씨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씨인 것이다. 이 박을 소재로 한 판소리 <흥부가>가 불리었다는 것은 박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박은 밭, 인가의 담이나 지붕에 올리어 재배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박은 원통 또는 둥근 호박이나 배 모양의 커다란 액과(液果)로 긴 타원형의 씨가 있다. 삶거나 말려서 바가지를 만들고 속은 먹는다. 여물지 아니한 박의 속을 파내어 길게 오려서 말린 반찬거리를 ‘박고지’라 한다.
요즘이야 별식으로 박나물을 먹지만, 곤궁하던 시절엔 식용으로도 유용했던 모양이다. 판소리 <흥부가>에 보면 흥부 내외가 박을 타면서 ‘박 속이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자는 수작을 하는 대목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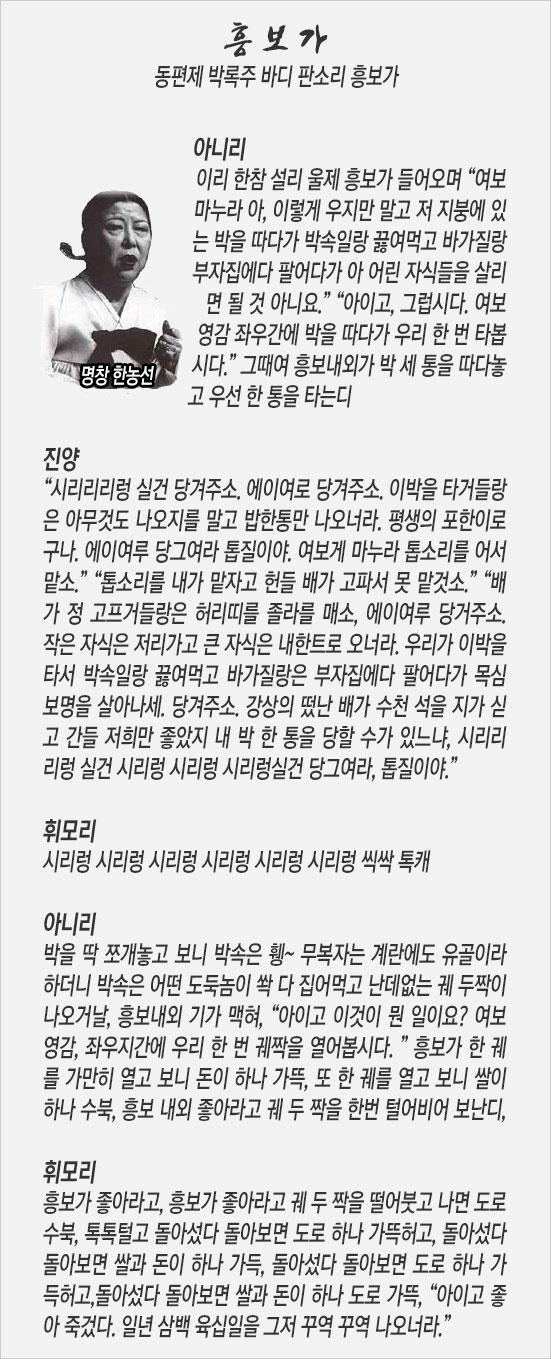
흥부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퉁겨 본즉 팔구월 찬 이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구나. 박을 따다 놓고, 흥부 내외가 자식들을 데리고 박을 타는데.
“시르릉 실근 당겨 주소. 에이 여루 당기어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抱恨)이로구나. 에이 여루 당기어 주소.”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큰 자식은 저리 가고, 둘째 놈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 속이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保命) 살아나자. 에이 여루 받소.”
“톱 소리를 받자 한들 배가 고파 못 받겠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운차게 당겨 주소.”


박은 식용이나 관상용 외에도 과피(果皮), 즉 껍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되었다. 바가지나 표주박 등은 꽃이 핀 후 40~45일 넘어 표피가 완전히 굳어진 뒤 박을 쪼개어 솥에 넣고 삶은 다음 과육을 긁어내고 그늘에 말려 만든다. 혹은 습기가 많은 흙 속에 묻어 과육을 썩힌 다음, 이 과육을 제거하고 그늘에 말려 만들기도 했다.
바가지, 무속과 민간요법에서 상징적으로 쓰여

바가지는 박을 쪼개 만든 것 외에 나무를 파서 만든 목 바가지도 있다. 목 바가지에는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다. 조선 후기 서유구가 지은 농업 백과사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도 박이 열리지 않은 해는 목 바가지로 대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바가지가 집안 곳곳에서 쓰였다. 뒤주 안에는 쌀을 퍼내는 쌀 바가지, 장독에는 장조랑 바가지, 물을 퍼내는 물바가지, 소여물을 떠내는 쇠죽바가지 등이 그것이다. 부엌의 ‘두멍’(물을 많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 안에 떠 있던 바가지의 기억도 아련하다.
바가지는 한편으로 무속이나 민속이나 민간요법 등에서 상징적으로 쓰이기도 했다. 혼인 때 신부의 가마가 신랑집 앞에 다다르면 박을 통째로 가져다 깨뜨리거나 납채(納采) 때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소리를 냈다. 바가지를 깨뜨릴 때 나는 소리로 잡귀를 쫓아내고자 한 것이다.
병액(病厄)을 쫓는 굿이나 고사에 바가지가 이용된 것도 같은 원리였다. 초상이 나면 사잣밥을 문전에 내놓고 전염병이 돌면 잡귀를 먹여 쫓기 위하여 밥과 음식, 짚신 등을 길에 놓아둔다. 이때 바가지를 함께 두거나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서 내놓기도 한 것이다.
객귀(客鬼)가 들어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급박한 몸의 이상이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가정에서 귀신을 쫓는 의례인 ‘객귀 물리기’에서도 바가지는 요긴하게 쓰인다.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주로 발병하는 이 객귀를 물리기 위해 집에서는 바가지에 된장 국밥을 마련하여 귀신에게 먹인 뒤 칼로 협박하여 내쫓았다. 바가지에 식칼을 꽂고 무슨 주문을 외우던 객귀 물리기의 서슬 푸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난다.
치질이나 어린아이 태독(胎毒)에 바가지를 태워 그 가루를 환부에 바르는 민간요법도 전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바가지를 밥상 위에 올려놓지 못하게 하거나 바가지 조각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걸 불길하게 여긴 것 등은 바가지와 관련된 민속적 금기에 해당한다.
한편 바가지가 생명력과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은 박에 씨가 많은 특성 덕분이다. 이 밖에 바가지는 고려의 악기인 생황(笙簧)을 만드는 재료였고, 제주 해녀들의 부양구(浮揚具)로도 쓰였다.
생활 용기로 요긴하게 쓰이던 바가지는 플라스틱의 등장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볍고 튼튼한 데다 어떤 색깔이든, 어떤 형태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20세기의 발명품은 어느 결인가 우리 생활 주변을 슬며시 점령해 버렸다.

수요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박의 재배도 줄었는데, 여기엔 새마을운동과 함께 들어온 슬레이트 지붕이 한몫했다. 벋어가던 덩굴에다 하얗게 익어가는 초가지붕 위의 박은 잊힌 시골 풍경의 원형이 아니었던가. 이제 초가지붕 위에 누운 박을 보려면 초가가 보존되고 있는 민속 마을 따위를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곡식·물·장(醬)을 담는 다목적 그릇이었던 바가지는 이제 공예품이나 실내장식품으로나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아이들이 겨울부터 파랑·빨강·노랑으로 물들인 호리병 박을 차고 다니다가 정월 대보름 전야에 남몰래 길가에 버리면 액을 물리칠 수 있다 하여 차고 다녔다는 옛 기록(<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이 무색할 지경이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

바가지는 뭐라 해도 여성과 가까운 물건이다. 요즘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예전에 어머니들은 식솔들 밥을 다 챙겨주고 당신은 마지막에 바가지에 담은 눌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으니 말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불평과 잔소리를 ‘바가지 긁는다’는 말이 관용구로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게 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다.
흔히들 ‘일단 신세를 망치면 거기서 헤어 나오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뒤웅박 팔자’도 바가지에서 나온 말이다. 뒤웅박은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구멍만 뚫어 속을 파내 마른 그릇으로 쓰는 바가지’다. 뒤웅박은 씨앗을 담아 처마 밑에 매달거나 성냥처럼 손쉽게 쓰는 물건을 넣어 부엌에 걸어두고 썼다.
‘뒤웅박 팔자’란 말 그대로 입구가 좁은 뒤웅박 속에 갇힌 팔자라는 뜻인데 주로 여자의 팔자를 이르는 속담으로 쓰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선 그 뜻을 ‘헤어 나오기 어려움’으로 설명하지만, 기실은 그 안에 든 물건에 따라 뒤웅박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데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에서 ‘뒤웅박 팔자’로 검색해 보았더니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 ‘82쿡(cook)’ 게시판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글이 올라 있다. 마흔네 개의 댓글 가운데 대부분은 ‘동의한다’였다.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만나기 나름 아니냐는 통 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혼과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이다.
“이게 순전히 돈 잘 버는 남편 만나 편안하게 쇼핑이나 다니는 게 최고라는 얘기라면 너무 슬프네요.” 같은 의견은 맞는 이야긴데도 그리 큰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생활의 수준이 결정되는 세상이니 저 고릿적 속담의 ‘진실’은 연면(連綿)한 것이다.
아내는 적당한 크기의 박 한 덩이를 따서 차에 실었다. 조만간 그것은 흉내 낼 수 없는 담백한 향을 내는 박나물로 식탁에 오를 것이다. 박 덩이 하나로 아침 노동은 뻐근하게 마무리되었다. 아내와 나는 내년에는 저 농사를 우리가 맡자는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 글을 쓰면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아내는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여보, 당신도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고 생각해?”
“뜬금없이 그건 왜 물으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하지,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맞다. 물어볼 일이 따로 없다. 그녀의 선택이든 아니든 삼십 년이 넘게 내가 끄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온 삶이니 물어 무엇 하겠는가 말이다.
2014. 8. 23.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 혹은 나의 초가삼간(Ⅰ) (0) | 2019.08.20 |
|---|---|
| 개구리밥과 부평초, 그리고 삶 (0) | 2019.08.12 |
| 울타리 밑의 ‘꼬마 파수꾼’, 꽈리 이야기 (2) | 2019.07.31 |
| 도라지, 도라지꽃, 도라지 고갯길 (0) | 2019.07.20 |
| 탑을 품에 안은 연꽃 (0) | 2019.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