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한 논물마다 개구리밥 풍년

개구리밥과 부평초
산으로 가는 길가 논에 모가 실하게 자랐다. 처음엔 작고 연둣빛이던 포기가 실하게 커지고 빛깔도 거무스레한 푸른빛을 띠면서 논이 어둑어둑해졌다. 논에 가득 찬 물 위에는 개구리밥이 빽빽하게 떠 있다. 흔히 개구리밥이라고 불리는 이 풀의 한자 이름이 부평초(浮萍草)다.
부평초[浮萍草]
의지할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형태분석 [+浮萍+草]
명사
(1) 의지할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평초 같은 신세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유의어 부평전봉(浮萍轉蓬)
(2) (기본의미) [식물] 개구리밥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물풀. 연못이나 논의 물 위에 떠서 산다. 늦가을에 겨울눈이 물속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물 위로 떠 올라 번식한다. 물 위에 뜬 편평한 달걀꼴의 엽상체에서 가는 뿌리가 내리며, 여름에 백색의 꽃이 핀다. 온대와 열대 지방에 널리 분포한다. 학명은 Spirodela polyhiza이다.
약어 부평1(浮萍)
유의어 개구리밥, 평초(萍草), 수선10(水蘚)
고복수가 부른 ‘타향살이’에 등장하는 그 ‘부평(浮萍)’이다. <다음 한국어사전>은 부평초를 “의지할 데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풀이한다. 이 사전에서는 기본의미인 ‘풀 이름’보다 비유적으로 쓰이는 이 뜻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뿌리 없는 삶’의 관습적 상징, ‘부평초’
유의어로 들고 있는 ‘부평전봉(浮萍轉蓬)’에서 ‘전봉’은 ‘바람에 굴러가는 쑥 덤불’이라는 뜻이니 ‘부평’과 비슷한 의미다. 물풀을 이르는 유의어는 ‘개구리밥’, ‘평초(萍草)’, ‘수선(水蘚)’ 등이 있다.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않고 물에다 띄우고 살아가는 이 물풀을 ‘뿌리 없는 불안정한 삶’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은 익숙한 관습적 상징이다. 고단하고 불안한 세속의 삶을 감성적으로 노래하는 유행가에서 이 상징이 흔하게 쓰이는 이유다.
현철의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에도 부평초는 등장한다. “산너울에 두둥실 홀로 가는 저 구름아 /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이라 하여 구름과 부평초의 관계를 통해 동병상련의 정서를 드러낸다.

한수산이 197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부초(浮草)』는 떠돌이 서커스 단원들의 뿌리 뽑힌 삶의 세계를 그려낸 작품이다. 이 소설의 제목도 ‘부평초’로 붙였다가 ‘부초’로 줄인 것이라고 한다. 뿌리 뽑힌 삶을 이르는 비유로 ‘부평초’ 대신 훨씬 간결한 ‘부초’가 된 것이다.
고정희 시인은 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제2연에서 이 부평초를 노래했다. 1연에서 ‘상한 갈대’를 ‘상한 영혼’으로 비유한 시인은 그 갈대보다 더 ‘불안한 존재’로 부평초를 소환한다. 갈대에 비기면 부평초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물풀이다. [관련 글 : 고정희, 우리 모두에게 이미 ‘여백’이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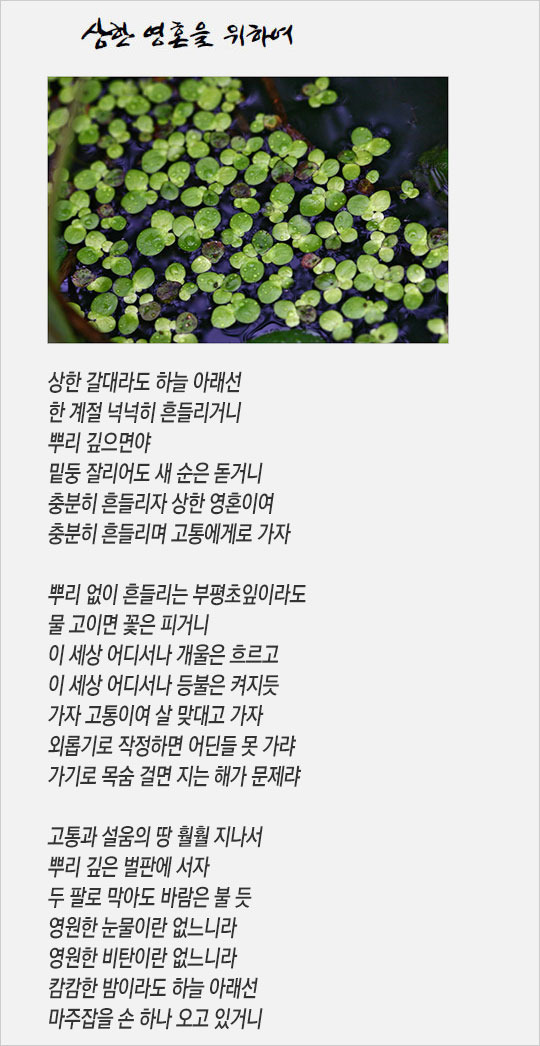
그러나 시인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도 ‘물 고이면 꽃은 피’고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른다는 도저한 낙관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고 노래하며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부평초로 그려지는 삶, 그 무게는 다 같다

대중가요에서든 소설이나 시에서든 부평초가 가진 관습적 상징은 그대로 인용된다. 어느 것이 더 가볍거나 무거운 것은 아니다. 유행가에서 신파조로 그려지는 삶이라고 그 무게가 시나 소설에서의 그것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그걸 노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저명인사의 파란만장한 생애나 노숙인의 곡절 많은 인생은 그것 자체로 같은 결과 무게일 수밖에 없다. 그걸 의도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제 계급의 삶이 훨씬 고상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의 부질없는 욕망일 뿐이지 않을까.
논 가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사진을 몇 장 찍으면서 여름이 가슴 높이까지 차 올라왔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장마 끝나고 한동안 물러나 있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아픈 손가락에 씌우는 보조기를 끼고 7월을 맞는다.
2018. 7. 4.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 혹은 나의 초가삼간(Ⅱ) (0) | 2019.08.21 |
|---|---|
| 그, 혹은 나의 초가삼간(Ⅰ) (0) | 2019.08.20 |
| 박과 바가지, 그리고 뒤웅박 이야기 (2) | 2019.08.11 |
| 울타리 밑의 ‘꼬마 파수꾼’, 꽈리 이야기 (2) | 2019.07.31 |
| 도라지, 도라지꽃, 도라지 고갯길 (0) | 2019.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