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가 유난히 장미가 더 많이 피었다는 통계가 있을 리 없다. 곳곳에서 찔레꽃 구경이 어지럽던 어느 날부터 만개한 장미가 시야를 어지럽힌다. 걸어서 출근하는 길목마다 빨갛게 장미가 불타고 있었다. 피처럼 붉던 그 꽃잎들은 이제 바야흐로 시들기 시작한 듯하다.
어느 해에는 유난히 접시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어느 해인가는 찔레꽃이 지천이었다. 유난히 그 해에만 그 꽃을 더 많이 심었을 리는 없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유난스러운 것뿐이다. 어느 해는 접시꽃이, 어느 해는 찔레꽃이 유난스레 눈에 들어와 박혔을 뿐이다.
사진기를 들고 출근길 곳곳에 흐드러진 장미를 찍었다. 가정집 담 밖으로 늘어진 놈, 대문간 위를 빨갛게 물들인 놈, 찻길 옆의 언덕을 뒤덮은 놈, 언덕바지 축대에 늘어져 붉은 신호등과 겹쳐 보이는 놈……. 그러나 시방 장미는 시들고 있다. 시드는 장미에 뒤이어 맹렬하게 꽃을 피우는 것은 금계국이다. 장미는 마치 서둘러 이 계절의 종말을 넌지시 알려주는 건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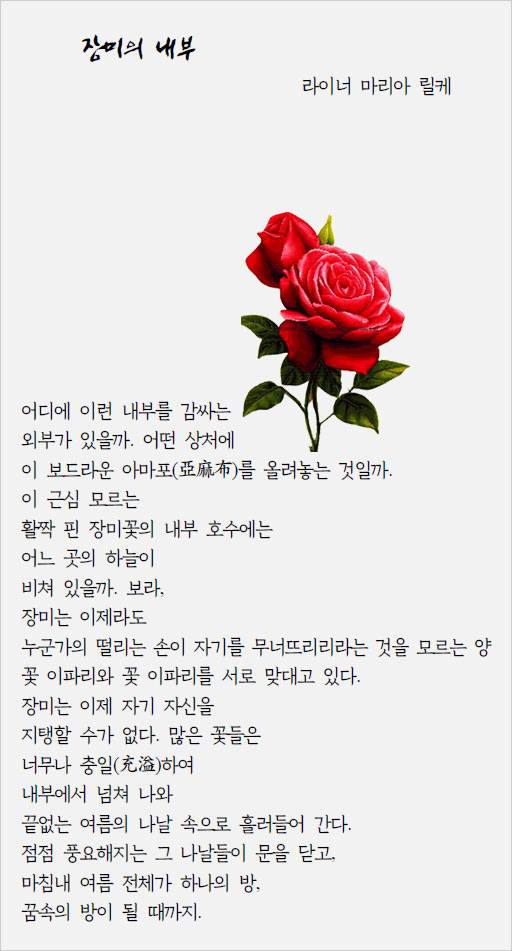
릴케의 시 ‘장미의 내부’를 읽는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편 가득 채운 시인의 호흡 저편으로 ‘장미꽃의 내부 호수’와 거기 비친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2010. 6. 11.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진] 회룡포의 ‘청소년 우리 강 체험’ 행사 (0) | 2021.07.25 |
|---|---|
| 패랭이, 그 꽃과 갓 (0) | 2021.07.20 |
| 신록과 녹음의 산길에서 (0) | 2021.05.12 |
| 스마트폰으로 담은 산길의 봄 (0) | 2021.04.06 |
| 봄, 새순과 꽃 (0) | 2021.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