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통념’의 표본, ‘비둘기’, 이제 ‘닭둘기’가 되다

비둘기는 새 중에서 인간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새다. 무엇보다 비둘기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은 기독교와 관계 깊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둘기는 두더러진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비둘기, ‘평화의 새’?
신은 타락한 인류를 벌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고, 믿음이 깊은 노아의 가족과 생물만 방주를 타도록 했다. 비가 멎자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보려고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냈다.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다. 이런 내력 때문에 비둘기와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이 됐다.
한국군 중 베트남전에 최초로 파견된 부대의 이름이 비둘기였다. 비전투 부대인 건설지원단의 이름으로 ‘비둘기’는 아주 걸맞은 것이었을 것이다. 함께 평화의 상징 노릇을 했지만 아쉽게도 세계 평화를 기치로 결성된 국제연합(UN)의 깃발에는 올리브만 올랐다.
비둘기는 노래의 주인공으로도 등장했다. 비둘기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노래는 일명 ‘비두로기’라고도 하는 고려가요 ‘유구곡(維鳩曲)’이다. 그러나 시용향악보에 실려 있는 이 노래는 “비둘기는/비둘기는/울음을 울되/뻐꾸기야말로/나는 좋아라/뻐꾸기야말로/나는 좋아라.”라고 하여 정작 주인공은 비둘기가 아니라 뻐꾸기다.
현대시로는 김광섭(1905~1977) 시인의 유명한 시 ‘성북동 비둘기’(1969)가 있다. 이 우의적인 시에서 ‘비둘기’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소외되어 가는 인간을 상징한다. 시인은 비둘기를 통하여 성북동 골짜기에 들이닥친 개발에서 드러난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의 실상을 우의적으로 폭로했다.
시인은 근대화와 산업화가 결국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에게서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빼앗아 가버렸다고 노래한다. 문명은 ‘인간성 파괴’뿐 아니라 비둘기를 ‘쫓기는 새’가 되게 했다. 평화의 사절인 비둘기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사람 가까이/사람과 같이 사랑하고/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새로 미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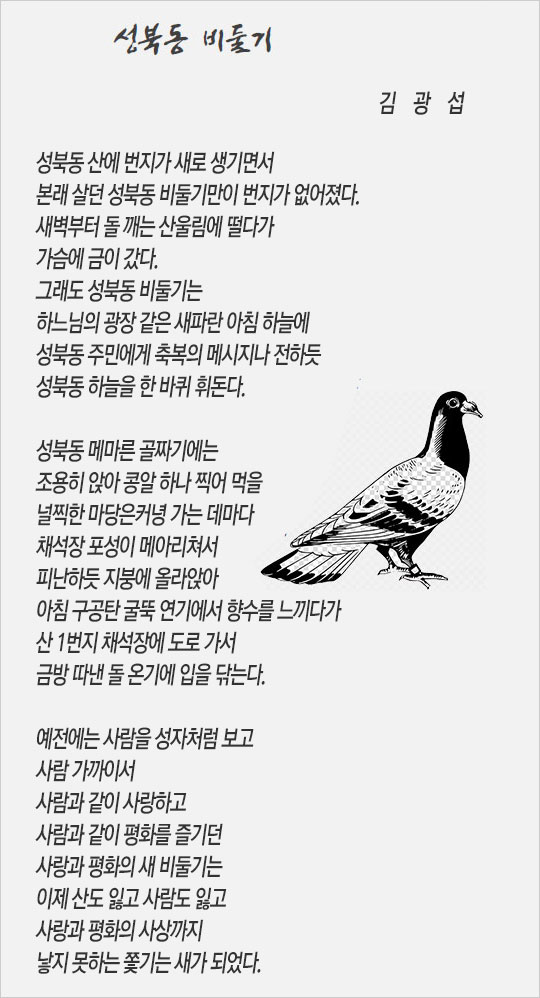
그러나 1960년대에 ‘사랑과 평화의 새’로 미화되었던, 산업화·근대화의 희생자로 기려졌던 비둘기는 1990년대에 급전직하, ‘소외된 인간(소시민)’에서 ‘이기적 소시민’으로 전락한다. 김유선(1950~ ) 시인의 시 ‘김광섭 시인에게’(1995)에서다.
‘사랑과 평화의 새’에서 ‘이기적 소시민’으로
이 시에서 ‘비둘기’는 ‘도심’에서 ‘팝콘’을 뿌리면 몰려드는 새떼다. 겁 없이 다가와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다시 오지 않’는 새다.
시에서 비둘기는 ‘마음을 닫아버린 존재’, ‘마음을 닫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소시민’으로 비판의 대상이다. 시인은 김광섭이 노래한 비둘기가 20년 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조곤조곤 노래한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쫓겨난 김광섭의 비둘기는 지금은 시청광장 같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새는 20년 전의 비둘기와 달리 사람과 친하지 못하고 사람을 멀리하면서 마음을 닫고 있다. 20년 전의 비둘기가 산업화로 소외된 도시의 소시민이었다면, 지금의 비둘기는 이익(팝콘)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것이다.
20년이란 시간은 시문학의 고유한 이미지조차 뒤바꿔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 비둘기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사랑과 평화’든 ‘이기적 존재’든 비둘기에 그런 상징을 부여한 것은 인간의 자의일 뿐이니까 말이다.

비둘기의 고향은 그리스다. 지중해 암벽지대에서 살던 바위 비둘기(Rock dove)가 인간에게 사육되어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 오늘날의 비둘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세기 이후라고 한다. 벼랑에서 살던 비둘기는 인간세계에 와서도 고가도로와 다리 밑,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트는 등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
공원의 ‘사랑스러운 새’에서 ‘도시공해의 주범’이 되다

국내에 비둘기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3천 마리가 방사된 후다. 공원이나 시청 광장 등에 자리를 잡은 비둘기들은 시민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사람과 어울려 멋진 풍경을 연출하곤 한다. 그러나 공원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둘기들은 대체로 강자들이다.
비둘기는 고양잇과의 동물처럼 ‘영역 동물’이라 다른 비둘기 떼가 장악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힘센 비둘기에게 밀린 비둘기들은 주택가나 시장 주변에 둥지를 틀고 쓰레기봉투를 파먹으며 살아간다. 그야말로 ‘강약이 부동(不同)’인 것이다.
공원에서 여유 있게 살든,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뒤지든 도시에 정착한 비둘기가 새로운 도시공해의 주범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이들이 일으키는 악취, 소음은 물론, 강한 산성의 배설물이 문화재와 건축물, 차량, 동상 등을 부식시키고 진균류 등을 옮겨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서식하는 비둘기는 1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니 그 폐해도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비둘기가 일으키는 공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2003년부터 트래펄가 광장에서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어기면 5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둘기가 쏟아내는 오물로 인해 트래펄가 광장과 넬슨 동상이 입는 피해액이 14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하니 비둘기는 바야흐로 도시의 ‘공적’이 된 셈이다.
비둘기가 ‘닭둘기’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변화의 결과다. 몸이 비대해져 멀리 날지도 못하는 데다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닭과 닮아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결국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에서 도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비둘기의 전락에 비둘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 흔하디흔한 새에게 상징과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인간이고, 거기다 새로운 이미지를 얹고 꾸민 것도 사람인 것이다. 비둘기의 상징성이 우스꽝스럽게 전락한 것은 인간이 자의로 부여한 이미지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
잘못된 ‘통념’의 표본,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는 기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시인 김진경은 1980년대에 낸 그의 수상집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진실에 대한 질문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통념’으로 비둘기를 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길조는 까치인데도 비둘기가 평화의 새로서 깊이 인식되는 것은 서구적 통념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온 것’이라 말한다. 그는 지인의 전언을 빌려 비둘기는 ‘먹이를 두고 다툴 뿐 아니라 수컷은 암컷을 차지하기에 몰두하여 싸움과 분열을 일삼는 욕심 많은 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까치이면서 자신을 비둘기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단지 우리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진실을 오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통념에 짓눌리고 왜곡된 것들이 어찌 그것뿐일까. 비둘기 이야기를 짚으며 문득 인간이 만드는 이미지와 그것의 허구성과 곰곰이 생각해 본다.
2010. 11. 4.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빼빼로 데이’? ‘농업인’과 ‘지체장애인의 날’! (0) | 2020.11.10 |
|---|---|
| <의자 놀이> 사태 단상 (0) | 2020.11.06 |
| “애비가 죽고 없어도 굳게 살아라” (0) | 2020.11.04 |
| 그 가게의 ‘공정 서비스’ (0) | 2020.11.03 |
| 가난도 가난 나름, ‘가난’을 다시 생각한다 (0) | 2020.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