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시선’ 200호 기념 시선집 <나는 상처를 사랑했네>

어제, 며칠 전 주문한 책 몇 권을 받았다. <적도에 묻히다>, <한글 민주주의>, <의자 놀이> 같은 책 가운데 흰 표지에 노랑 띠를 감은 ‘실천시선’ 200호 기념 시선집 <나는 상처를 사랑했네>가 끼어 있다. 특별히 이 책을 주문한 이유는 없다. 아마 ‘200호’라는 데 마음이 간 것인지도 모른다.
눈에 띄는 1989년 해직 교사 출신 시인들
차례를 천천히 훑는데 낯익은 이름과 시편 몇이 눈에 들어왔다. 김진경, 도종환, 배창환, 김종인, 정영상, 조재도, 신용길, 조향미……. 서울과 경상도, 충청도 어름의 중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89년 해직의 칼바람을 맞았던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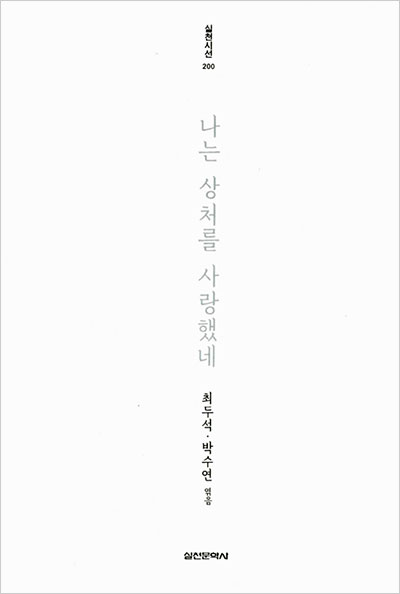
정영상(1956~1993)과 신용길(1957~1991)은 해직 기간에 고인이 되었다. 신용길 시인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생전의 그이를 알지 못했다. 전교조가 치른 그의 장례에서 나는 그와 그의 아내인 조향미 시인을 처음 알았었다.
실천문학사에서 최초로 낸 시집은 1984년에 간행한 <시여 무기여>라고 한다. 그리고 28년간 ‘실천시선’이 낸 시집은 모두 199권. 이번 시선집은 오랫동안 ‘실천시선’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시인 최두석과 문학평론가 박수연이 개별 시집들의 대표작 한 편씩 추려 모두 128편의 작품을 실었다.
‘실천시선’의 시선집이 갖는 경향성이 일찌감치 알려진 대로다. 주로 기획된 시선집들은 옥중 시, 저항시, 노동 시, 농민 시, 교육 시 등의 주제나 ‘반시’, ‘목요시’, ‘자유시’, ‘삶의문학’ 등 동인별 선집으로 나왔다. 앞에 든 시인들의 시가 이 시선집에 실린 이유다.
모두 교육운동에 동참하였지만, 김진경, 도종환, 배창환, 조재도, 조향미 시인의 시는 ‘교육 시’가 아니다. 온전히 교육 시라고 할 수 있는 시는 김종인과 정영상, 신용길의 작품이다. 공교롭게도 김종인만 현역일 뿐 나머지 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신용길이 가고 이태 후에 정영상이 충북 단양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내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고작 서른여덟 살에 세상을 하직했다. 포항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어느 산기슭에 그를 묻으며 해직 동료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어찌 이리 덧없는가. 어느덧 20여 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다.
신용길의 시 ‘식민지 국어 시간’은 제목 그대로다. 일제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지만 정작 국어 시간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외국 문화, 팝송 람보에 눌려’ ‘열없고 맥 빠진’ 시간이다. ‘국어 작문, 독서 시간은 없어도 / 영어 듣기 평가는 있’는 우리 시대의 국어 시간은 20년의 세월에도 변하지 않았다.

정영상의 시 ‘아이들 다 돌아간 후’는 전형적인 교육 시다. 아이들을 하교시킨 후 창밖을 내다보면서 감당해야 하는 교사의 회한과 성찰의 시다. 그는 안동 복주여중 수돗가에서 떨어지는 수돗물 소리를 단양의 자기 집에서 들었던(시 ‘환청’), 천생 교사였던 사람이었다.

김종인의 시 ‘한 송이 붉은 꽃’은 그가 해직 무렵에 쓴 시 ‘단식 농성장에서-저들의 미친 칼 아래 모가지를 꼿꼿이 세우고’와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보인다. 전국에 휘몰아친 해직의 칼바람 앞에 교사들이 쫓겨나던 때여서 비장한 결의와 다짐이 주조였던 시가 많았다. 시는 비장하고 강렬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는 그리 독한 사람이 아니다.
김종인은 인근 김천 사람으로 지금도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연배가 비슷해서 비교적 막역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그는 장거리 달리기에 빼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타고난 폐활량을 가졌지만, 나이 들면서 고장 난 넓적다리 관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얼마 전, 그를 잘 아는 퇴임 선배 한 분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제 구미에 와서 셋이서 소주라도 한잔하자고 했더니 사람 좋은 이 양반, 단칼에 언제든 불러달라고 호기다. 그러자, 마침 한가위도 멀지 않았다. 추석을 쇠고 어디 바람 선선한 금요일 저녁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만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 실린 시는 백 편이 넘는다. 까마득한 날의 시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김준태)가 있고,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양성우)이, ‘학살1’(김남주)이 있다. 이런 시들의 무게와 의미에 관해서는 더 덧붙일 것도, 그럴 만한 소양도 없으니 다만 줄일 뿐이다.
시집은 사서 내처 읽지 않으면 서가에 꽂혀 묵히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산 몇 권의 시집도 여전히 집안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 뿐, 마저 읽지를 못하고 있다. 때는 등화가친의 계절이라지만 여전히 마음을 맑히고 책에 침잠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012. 9. 22.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까발려진 미국의 빈곤과 계급, 그리고 ‘아메리칸드림’ (0) | 2020.10.11 |
|---|---|
| 신석정과 신석정문학상, 그리고 도종환 (0) | 2020.09.29 |
| 논란의 <한국사> 교과서, 정부의 직무유기 (0) | 2020.09.06 |
| 개천마리… 그 사나이의 삶과 진실 (0) | 2020.08.22 |
| 포복절도하다 등이 서늘… 끝내주는 <충청도의 힘> (0) | 2020.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