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보는 신석정 문학, 신석정 문학상과 수상자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면서 교사도 공부를 꽤 많이 해야 한다. 대학에서 건성으로 건너뛰었던 우리 문학을 ‘수험용 각론(各論)’으로 이 잡듯이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으로 문학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는 문학 교사 개개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입시교육을 흘러가는 것이다.
좋아도 가르치고 싫어도 가르쳐야 하는 이 ‘씁쓸한 문학 교실’에서 시를 조각조각 내다보면 때로 자신이 가졌던 시인에 대한 이해가 뒤바뀌기도 한다. 시 ‘꽃 덤불’을 가르치면서 신석정(辛夕汀.1907∼1974)을 ‘슬픈 목가’류의 서정시인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런 예 가운데 하나다.
신석정의 시를 처음 만난 게 중학교 시절이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를 배웠는데 참 신기하게 여긴 게, 어른인데도 이토록 맑고 고운 시를 쓸 수도 있구나 싶은 거였다. 중학생에게도 그의 시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느껴졌다는 얘기다.
신석정의 ‘재발견’?
신석정은 시의 소재를 자연에서 구하고 자연에 귀의하려는 시작 태도로 보여준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는 동양적 자연관에 서구의 목가적 분위기를 결합한 독특한 시 세계를 선보였지만,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소극적·도피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시인이 ‘꽃 덤불’에서는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소망을 강렬하게 드러냈다. 비록 해방 공간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요’라고 조곤조곤 속삭이던 목소리와는 꽤 거리가 먼 것이었다.

최근 신석정의 미발표 시 열세 편이 발굴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그의 시편들이 발견된 곳은 모두 작자 미상의 훼손된 시집의 여백에서라고 한다. 석정이 손수 쓴, 이 27편의 시 가운데 13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다. [관련 기사 : 신석정, 남의 시집 귀퉁이에 몰래 쓴 시…]
때는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 굳이 시집 여백에 작품을 쓴 것은 ‘인민’, ‘해방’, ‘원수’, ‘봉화’ 같은 낱말들이 쓰인 작품들을 발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파장과 곤경을 우려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시편에 쓰인 시구에 드러난 정서는 기왕의 시편에 나타난 ‘어머니’에게 건네는 소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해방 공간, 시인의 ‘현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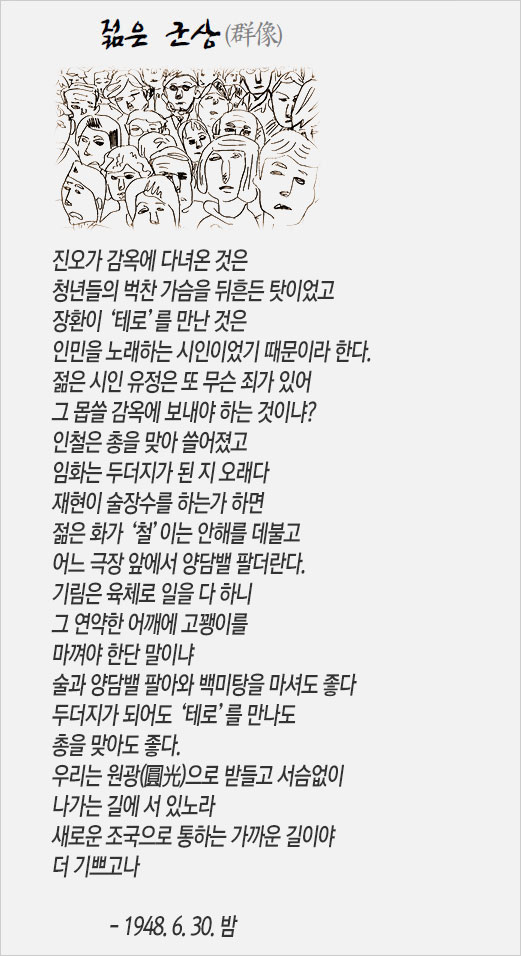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간지에 보도된 시편에 나타난 시어를 살펴보면 시인의 현실 인식의 방향이 어렴풋하게 드러난다. ‘원뢰’와 ‘지리산’은 한국전쟁 전에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을 떠올리게 하는데 ‘인민의 나라’를 노래하는 시편에 담긴 생각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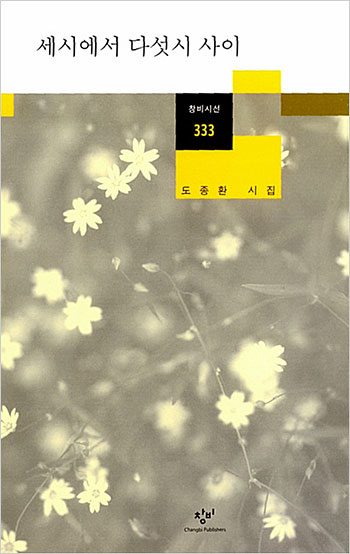
‘젊은 군상’이라는 작품은 1948년께 문인들의 동정을 전하면서 ‘새로운 조국’으로 가는 길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시인은 감옥에 간 유진오와 유정, 오장환이 당한 테러, 임화의 월북,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야 했던 김기림 등 동료 문인들의 동향을 담담히 전하는 것이다.
시편에 드러난 예사롭지 않은 현실 인식에 대해 제자인 허소라 시인은 스승은 스스로 자신의 시를 ‘암장(暗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다. 좌우 이념이 격렬하게 부딪치던 혼미한 해방 공간에서 시인은 자신의 육성을 시집의 여백에다 꾹꾹 눌러 담았던 것일까.
이 시편들은 ‘꽃 덤불’에서 시인이 노래한 ‘광복의 기쁨’과 ‘민족국가 건설’의 소망이 해방 정국을 관통하면서 어떻게 굴절되었는가를 감추고 있는지 모른다.
허 시인은 ‘그 먼 나라……’와 ‘아직 촛불을……’ 같은 초기 시를 근거로 석정을 ‘목가 시인’으로 규정하는 비평적 태도가 온당하지 않음을 미발표 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석정이 친일 시를 쓰지도,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목가 시인 신석정이 남긴 참여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올해 처음 시상하게 된 신석정문학상의 수상자로 도종환 시인이 선정된 것은 우연 같아 보이지 않는다. 신석정 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는 신석정문학상은 도종환 시인의 시집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창비, 2011)에 주어졌다. [관련 기사 : 신석정문학상 수상 도종환 시인 “국회서도 문학 놓지 않아”]
제1회 ‘신석정문학상’은 도종환 시인에게
올해 환갑을 맞은 시인의 열 번째 시집인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는 ‘인생의 오후’를 노래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황혼이라고 해도 무방할 나이지만 민중적 정서로 삶과 세상을 노래해 온 시인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시작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듯하다.
시인은 빨갛게 물드는 산벚나무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 시간이 오후 세 시에서 다섯 시에 와 있다고 술회한다. 그는 자기 인생의 열두 시에서 한 시 사이엔 치열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졌으나 자신에게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음을 고맙게 여긴다. 곧 겨울이 올 것이고, 해도 저물겠지만, 마지막 황혼과 노을을 허락받은 것도 기쁘게 여기는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읊조린다. [시 전문 텍스트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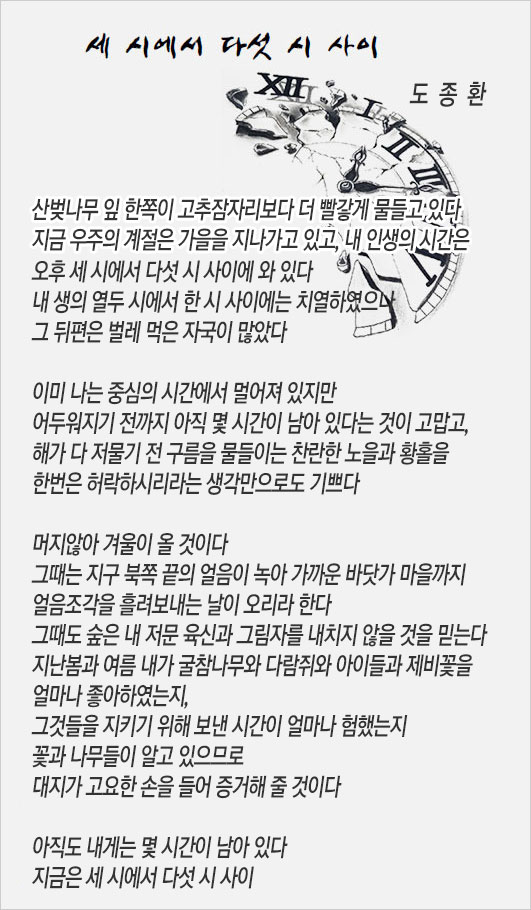
“내 인생은 어느덧 늦은 오후를 지나고 있어 곧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해지기 직전의 노을처럼 찬란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믿는다.”
그 자신 ‘치열하였’다고 회고한 ‘열두 시에서 한 시 사이’는 1989년을 전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시기로 보인다. 그 시기에 자의든 타의든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이들 가운데 나도 있었다. 해직 동지로서 집회에서 더러 만나곤 했던 그는 맑고 고운 사람이었다. 20년이 훌쩍 흘렀지만, 그는 그 세월의 갈피마다 부지런히 시를 쓰고 시집을 펴냈다.
그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가 선 곳은 여전히 중심이다. 그가 소망한다는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쯤은 시인이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세월이 아무리 박절하게 흐른다 해도 그는 변함없이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터이기 때문이다.
2014. 9. 3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효근 시인 <따뜻한 외면>으로 ‘신석정문학상’ 수상 (1) | 2020.10.23 |
|---|---|
| 까발려진 미국의 빈곤과 계급, 그리고 ‘아메리칸드림’ (0) | 2020.10.11 |
| 그 ‘상처’로 오늘이 여물었네 (4) | 2020.09.22 |
| 논란의 <한국사> 교과서, 정부의 직무유기 (0) | 2020.09.06 |
| 개천마리… 그 사나이의 삶과 진실 (0) | 2020.08.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