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성어 ‘주야장천(晝夜長川)’은 어떻게 ‘주구장창’이 되었나

세계에서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과 우리 어휘체계에 한자어 비중이 높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文語)로서 한문의 지위는 굳건한 것이어서 15세기 중반의 훈민정음 창제도 그 지위를 흔들지 못했다.
여말선초에 들어온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은 한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자 생활을 영위했다. 대신 한글은 일종의 여기(餘技)로 시조나 가사 같은 노래를 표기하는 데 썼다. 한자는 조선조 5백 년 동안 주류문자의 지위를 온전히 누렸다. 그러나 역사의 진전 앞에 이 중국 문자도 결국 그 소임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온전히 한글문학이 시작된 것은 개화기 이후 근대문학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한글전용 시대의 ‘사자성어’
교육과 행정 등에서 한글전용이 시행되면서 더는 한자어는 한자를 함께 적지 않고도 고유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원어(?)로 표기되는 게 기본인 낱말이 있다. 흔히들 ‘사자성어’로 이르거나 더러는 옛이야기에서 유래했다 하여 ‘고사성어(故事成語)’로 불리는 어휘들이 그것이다.
뜻글자인 한문은 네 자만으로도 완결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자다. 물론 제대로 새기자면 훨씬 많은 의역(意譯)이 필요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주류문자로 기능하면서 얻은 의미망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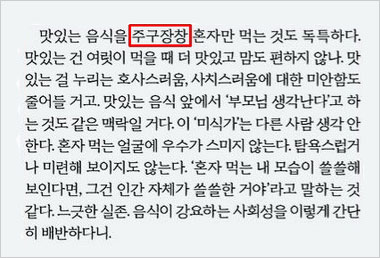
단 네 자만으로 어떤 사실과 명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꽤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일간지에서조차 한자를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사자성어가 끊임없이 회자하는 이유는 그래서다. <교수신문>에서 해마다 연말 연초에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새로 맞는 해에 대한 희망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글 시대의 진전에 따라 굳이 한자를 함께 적지 않게 되면서 이 사자성어가 잘못 쓰이는 예가 적지 않다. 멀쩡한 사자성어가 엉뚱한 소리로 쓰이게 되는 이유는 역시 ‘와전(訛傳)’에 있는 듯하다. 한자와 같이 쓰이지 않다 보니 통용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음으로 바뀌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홀홀단신’(혈혈단신), ‘야밤도주’(야반도주), ‘양수겹장’(양수겸장) 따위가 있다. 원래의 성어가 이처럼 바뀐 것은 대체로 비슷한 음의 한글 어감과 서로 뒤섞이면서 일어난 변화인 듯하다. ‘홀홀’이나 ‘(야)밤’, ‘겹(장)’ 같은 소리의 우리말이 ‘어감’으로 원래의 한자어를 대체하면서 일으킨 변화로 볼 수 있겠다. [관련 글 : ‘심심파적’과 ‘불여튼튼’]
‘풍지박산’이나 ‘절대절명’도 비슷한 형태의 변화로 추정된다. ‘바람’에 ‘흩어지는’ 상황을 이르면서 ‘땅’[지]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에서 ‘풍비’가 ‘풍지’로 바뀐 듯하다. ‘절체절명’은 ‘몸과 목숨이 다했다’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이르는 표현인데 그 위급한 성격을 ‘절대’라는 익숙한 단어와 조합한 게 아닌가 싶다.
‘산수갑산’과 ‘성대묘사’, ‘평양감사’와 ‘오곡백화’ 같은 성어는 역시 와전이 주요 원인인 듯하다. ‘삼수’와 ‘갑산’은 각각 함경남도 북서와 동북에 있는 오지(奧地)인데 ‘자연’을 뜻하는 ‘산수’와 겹쳐진 것이다. 또 ‘모사’ 대신 낯익은 ‘묘사’를 선택했거나, ‘평안’이 발음하기 쉽고 귀에 익은 지명인 ‘평양’과 겹쳐진 것이다.

평안도는 8도 가운데 하나니 부(府)인 ‘평양’과는 위계가 다르다. 도에는 관찰사, 즉 감사를 두고 평양부에는 ‘부윤(府尹)’이 있다. 평안도 감영이 있는 평양의 부윤은 평안도 관찰사가 겸직했으니 ‘평양 감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확한 표현은 ‘평안감사’인 것이다.
너무 웃겨서 배를 안고 넘어지는 게 ‘포복절도(抱腹絶倒)’다. 그런데 ‘절도’를 ‘졸도’로 바꿔 쓰는 것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아예 ‘기절’한 것으로 과장한 게 아닌가 싶다. 상황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담긴 것이다.
위에 든 성어는 한두 자가 바뀐 예라면 ‘주야장창’, 또는 ‘주구장창’으로 쓰이는 ‘주야장천’은 원래의 말에서 너무 나가버린 예다. ‘주야’는 ‘밤낮’이고 ‘장천’은 ‘긴 시내’니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밤낮’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는 ‘주야장창’을 거쳐서 ‘주구장창’에 이르렀다. 어저께 <한겨레>에 실린 어떤 칼럼(임범, 맛없는 집의 ‘고독한 미식가’, 2014. 8. 4)에서 ‘주구장창’이란 표현을 발견하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잘못된 표현을 쓴 게 필자나 편집자의 실수였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 <한겨레>는 그 표현이 현실과 일상에서 일정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던 듯하다.
‘주야장천’과 ‘주구장창’의 거리

스마트폰 앱 ‘한글교정기와 모든 사전’에서 ‘주구장창’을 검색해 보니, <사전>이 아닌 ‘지식in 오픈사전’에 풀이가 있다. 지역의 사투리로 볼 수는 없고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줄곧’, ‘계속해서’의 뜻을 가진, ‘주야장천’에서 변형된 말이란다.
나는 써 본 적이 전혀 없지만, 한 번씩 이 ‘주구장창’이란 표현이 상황을 아주 ‘적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가끔 생각하곤 한다. ‘주야장천’이라는 원래의 성어를 기준으로 보면 ‘주구장창’은 너무 멀어졌지만,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고려하면 굳이 원래의 한자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듯도 하다.
한자어 ‘삭월세(朔月貰)’가 어느 날부터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글세’를 바뀌고 이 말이 당당히 표준어로 사전에 올림말로 오른 과정을 생각해 보라. 순우리말로 착각되는 한자 귀화어(歸化語)는 꽤 된다. ‘김치’가 ‘침채(沈菜)’에서, ‘짐승’이 ‘중생(衆生)’에서 온 말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밖에도 한자어에서 온 우리말은 적지 않다. 배추는 ‘백채(白菜)’에서, ‘상치’는 ‘생채(生菜)’에서 온 말이다. ‘동치미’도 ‘동침(冬沈)’에서, ‘가게’도 ‘가가(假家)’에서 왔다. 무엇보다 ‘곳간’을 뜻하는 ‘광’이 ‘고방(庫房)>고왕>광’으로 변해 온 말이라는 걸 상상하는 건 쉽지 않다. [관련 글 : ‘눈록빛’을 아십니까, 우리말 같은 한자어들]
요즘은 우리말 어법의 근간을 흔드는 형식이 아니라면 언중들이 익숙하게 쓰는 말을 우리말의 범주에 넣어줄 만큼 한글맞춤법이 너그러워지는 추세다. 지금은 ‘아닌’ 말이 어느 날부터는 우리말의 일원으로서 대접받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014. 8. 7. 낮달

윗글을 쓰고 6년이 지났다. 다시 ‘한글교정기와 모든 사전’에서 ‘주구장창’을 검색해 보니, <다음 한국어사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부사, 쉼 없이 줄곧. ‘주야장천(晝夜長川)이 변할 말이다.”라는 뜻으로 표제어에 올라 있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오르지 않았다. 새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음 한국어사전>이 훨씬 유연한 편이어서다. 어쨌든 사전에 오르지 않고도 기존의 사자성어를 대체한 이 말이 국립국어원에서 언제쯤 사전에 올린 것인지도 흥미롭다.
2020. 8. 7.
'이 풍진 세상에 > 가겨 찻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되(어)’와 ‘돼’의 구분 (0) | 2020.08.17 |
|---|---|
| ‘갈게’와 ‘갈께’, 어느 게 맞나? (0) | 2020.08.13 |
| ‘조사’와 접미사 ‘-하다’는 붙여 쓰자 (0) | 2020.08.07 |
| ‘병’과 ‘빙’, 혹은 ‘빙모’와 ‘병모’ (0) | 2020.08.05 |
| ‘마더(mother)하세요’, 혹은 ‘엄마 되세요’? (0) | 2020.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