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찔레꽃의 계절’

해마다 찔레꽃이 필 무렵이면 사진기를 둘러메고 여기저기 찔레꽃을 찾아 나서곤 해 왔다. 철 되면 피는 꽃이 올해라고 달라질 리 없건마는 4월이 무르익을 때쯤이면 나는 고개를 빼고 산기슭이나 골짜기를 살펴보곤 하는 것이다.
* 찔레, 그 슬픔과 추억의 하얀 꽃(2010/05/28)
* 장미와 찔레, 그리고 이연실의 노래들(2015/05/16)
그러나 찔레꽃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나 반 박자쯤 늦다. 조금 이르다 싶어 잠깐 짬을 두었다 다시 찾으면 이미 그 하얀 꽃은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던 게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무슨 일로 바빴나, 그저께 며칠 만에 오른 산어귀에서 만난 찔레꽃은 바야흐로 그 절정의 시기를 막 넘고 있는 참이었다.




지난 9일 치른 대선이 ‘장미 대선’이었던 것처럼 오월은 흔히 장미의 계절로 불린다. 그러나 찔레꽃은 장미가 계절의 여왕으로 다투어 기려지는 시기에 양지바른 나지막한 산기슭과 골짜기, 냇가에 소리 없이 피었다 진다.
요즘 도시의 거리는 장미 천지다. 장미는 공단의 간선도로 양옆 울타리에 끝없이 이어지고 끝나는가 싶으면 다시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도시의 거리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빨간 꽃을 사람들은 무심히 일별하고 가던 길을 재촉할 뿐이다.
빨갛게 피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장미의 꽃말은 ‘사랑, 욕망, 절정, 기쁨,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절정을 보았는가. 마침내 그것은 시들어가고 온몸으로 뿜어낸 욕망과 기쁨은 쇠락과 소멸, 그 덧없는 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찔레꽃, 죽어서 돌아온 ‘젊은 아비’
장미에 비기면 숨은 꽃, 한적한 골짜기에 산기슭에 처연히 피었다 지는 찔레꽃은 아련하게 슬픔과 추억을 환기하는 꽃이다. 찔레를 노래한 이연실의 노래와 장사익의 노래는 얼마나 서럽고 아픈가.
찔레꽃의 꽃말은 ‘온화(溫和), 고독, 자매의 우애’라고 한다. 장사익의 노래를 들으면서 지리산 시인 이원규의 시 ‘찔레꽃’을 곰씹으며 거듭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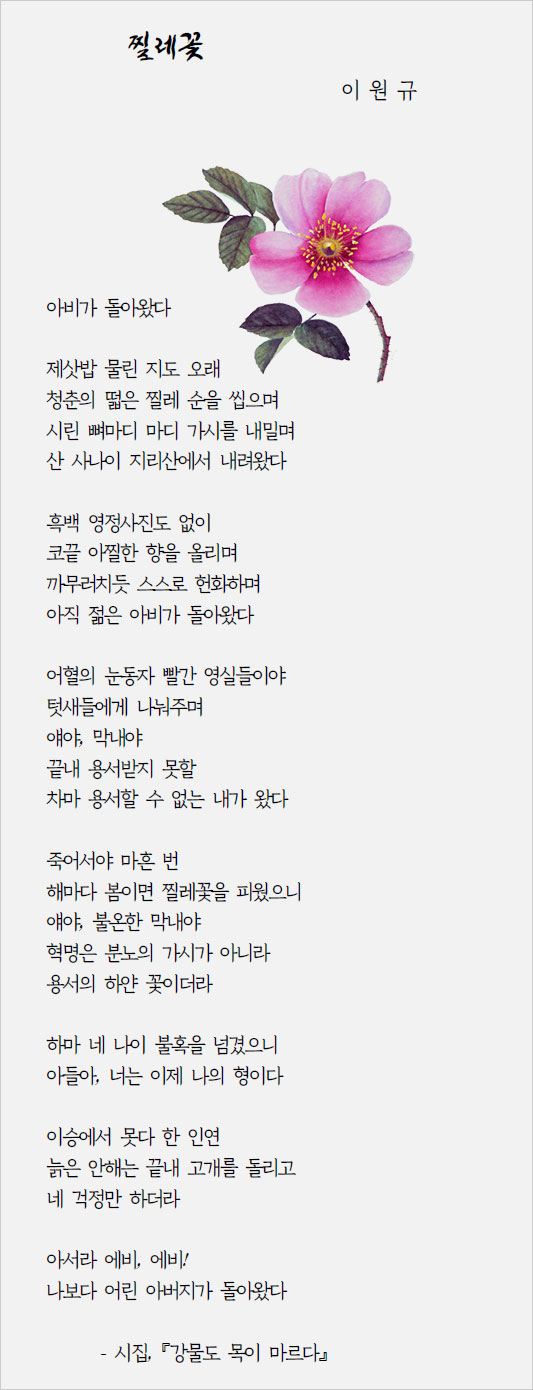
아, 시인의 찔레꽃은 지리산으로 든 ‘산 사나이’였던가. ‘흑백 영정사진도 없이’ 청춘에 떠났던 아버지는 ‘코끝 아찔한 향’으로 불혹을 넘긴 아들 앞에 돌아왔다. ‘죽어서야 마흔 번/해마다 봄이면 찔레꽃을 피웠’던 아비는 ‘나보다 어린’ 아버지로 돌아왔다.
‘청춘의 떫은 찔레 순을 씹으며/시린 뼈마디 마디 가시를 내밀며’ 돌아온 ‘차마 용서받지 못할’ 아비가 막내에게 건네는 말은 ‘혁명은 분노의 가시가 아니라/용서의 하얀 꽃이더라’이다. 그것이 찔레로 돌아온 아비의 전언이다. 세월은 분노의 가시를 용서의 꽃으로 바꾸어냈다. 그리하여 마흔 넘긴 아들에게 돌아온 젊은 아비는 ‘아들아, 너는 이제 나의 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장미’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권리’(빵과 장미)를 이른다. 그러나 이 땅의 고단한 현대사 속에서 시인의 찔레는 산 사나이로 죽어서 불혹의 막내에게 돌아오는 젊은 아비의 현신이다.
북봉산 들머리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다. 장사익이 쥐어짜는 목소리가 노래하는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을.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각도로 찍힌 찔레꽃은 산란하는 빛 속에서도 의연히 침묵하고 있다.
2017. 5. 1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월에 익어가는 것들, 혹은 ‘화해와 평화’ (0) | 2020.06.12 |
|---|---|
| 송홧가루와 윤삼월, 그리고 소나무 (0) | 2020.05.23 |
| 나들이 못 권하는 봄, 그래도 ‘황매산 철쭉’ (0) | 2020.05.19 |
| 팔공산 자락의 숲길 (0) | 2020.05.12 |
| 순애보(殉愛譜) 묘비명과 4월의 신록 (0) | 2020.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