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홧가루와 박목월 시 윤삼월, 그리고 소나무 이야기

박목월의 시 「윤사월」을 배운 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첫 국어 수업에서다. 1972년이었고, 국어과 담당 교사는 도광의 시인(관련 글 : 옛 스승 도광의 시인과 제자들)이셨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였는데 그 시는 국판의 조그만 교과서 맨 앞쪽에 ‘권두시’ 형태로 실려 있었다.
「윤사월」을 배우던 시절

몸소 시를 쓰시는 분이시라 과연 선생의 강의는 남달랐다. 그 시 한 편을 배우는데 한 시간은 너끈히 걸렸으리라. 선생께선 대단한 열정으로 시의 느낌과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려 했던 것 같은데, 정작 그때 배운 내용은 거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시골에서 자랐지만 내게 ‘송홧가루’는 낯설었다. 글쎄, 어릴 적부터 지게를 지고 땔나무를 해야 했던 내 동무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다. 나는 막연하게 사월의 어느 봉우리를 생각하고, 문설주에 기대어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눈먼 처녀’를 떠올렸을 것이다.
5월 초에 우리 내외는 큰누님을 모시고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다. 주변에 칡이 너무 우거지고 아까시나무가 묘역을 먹어가고 있어 산수 주변을 정리할 겸 해서였다. 봉분의 잔디도 가꾸고, 잡풀도 뽑으려 했는데 주변의 칡을 뿌리까지 찾아서 제거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다.
쉴 참에 바람이 제법 불었다. 그런데 주변 솔숲이 갑자기 뿌예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웬 연기인가 싶어 일어섰는데, 그제야 그게 송홧가루라는 걸 알았다. 아, 「윤사월」을 배울 때 만났던 ‘송홧가루’가 바로 이놈이로구나…….
‘풍매화’, ‘암수한그루’의 소나무
바삐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댔지만, 원하는 사진을 얻지는 못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사진 한 장이 오래 마음에 남아 있다. 이 사진을 찍은 사진가는 어디서 이런 송홧가루를 만난 걸까. 그러고 나니 소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소나무’ 공부를 좀 했다.
소나무는 이른바 바람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지는 풍매화(風媒花)다. 또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피어 있는, 대표적인 ‘암수한그루’[자웅동주(雌雄同株)] 식물이다. 소나무의 수꽃은 봄에 새로 생긴 가지의 아랫부분에 모여서 피고 암꽃은 자주색으로 가지의 윗부분에 모여서 핀다.

암꽃이 위쪽 가지 끝에 피는 것은 바람을 타고 오는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이고 수꽃이 아래쪽에 피는 것은 근친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꽃가루인 송홧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은 수분에서 수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수정이 된 암꽃의 열매가 바로 솔방울이다.
이 솔방울은 가을에 황갈색으로 익어 속에 들어 있는 날개 달린 씨앗을 바람에 날려서 씨를 퍼뜨리게 되는 것이다. 노랗고 연둣빛이 나는 고운 가루, 송홧가루의 여행은 수분과 수정을 거쳐 연둣빛 어린 솔방울이 되고, 마침내 황갈색으로 익으면서 끝나는 셈이다.
소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나무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나라 크고 작은 산마다 솔숲이 우거져 있지만 정작 소나무가 꽃을 피워 열매인 솔방울을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소나무는 구과목(毬果目) 소나뭇과의 식물로 한국과 일본이 원산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란다. 사람들은 소나무라면 으레 예전 ‘솔’ 담배의 도안에서 부는 것 같은 ‘구부정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소나무는 본디 기름진 땅에서 볕을 알맞게 받으면 곧게 자라는 나무다.
소나무의 덕성, ‘푸름’과 ‘절의’
그런데도 우리가 굽은 소나무만 떠올리는 것은 쓸모 있는 곧고 좋은 소나무는 대부분 베어 내어 목재로 쓰이면서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자라난 굽은 것만 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소나무의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소나무는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생기거나 휘거나 갈라지지도 않아서 궁궐이나 사찰을 만드는 재목으로 쓰였다. 특히 궁궐을 짓는 목재는 소나무 외에는 쓰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강원도와 경북 울진, 봉화에서 나는 춘양목은 결마저 고와 최고급 목재의 대명사가 되었다.
소나무는 은행나무 다음으로 오래 사는 나무로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다. 일찍이 고산 윤선도가 다섯 벗[오우(五友)]의 하나로 솔을 꼽은 것은 이 나무가 가진 변함없는 ‘푸름’, 그 절의(節義)의 덕성을 기린 것이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 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天)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추사 김정희는 ‘스산한 겨울 분위기 속에 서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 몇 그루를 갈필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 「세한도(歲寒圖)」의 발문에서 소나무의 ‘푸름’을 지적한다. 그 ‘푸름’은 물론 어려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지사의 높은 뜻을 이른다.


공자께서, “일 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대로 푸름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셨다. 소나무․잣나무는 사철을 통해 늘 잎이 지지 않는 존재이다. 엄동이 되기 이전에도 똑같은 소나무, 잣나무요, 엄동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는 소나무, 잣나무이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유달리 엄동이 된 이후에 그것을 칭찬하셨다.
- 추사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발문 중에서
국가인 ‘애국가’의 2절에서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노래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불변’의 기상을 민족과 연결한 것이다. 소나무의 덕성을 상록의 기상에서 찾은 것은 우리 민족만은 아니다. 독일 민요 ‘소나무’도 그 변함없는 덕성, 변하지 않는 ‘푸른빛’을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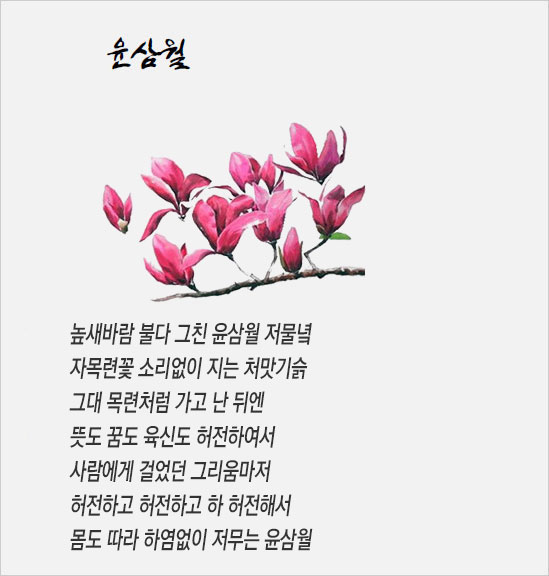
올해는 윤삼월이 끼었다. 도종환은 시 「윤삼월」에서 송홧가루 대신 ‘자목련꽃’이 지고 ‘그대는 목련처럼 가고’ 없는 시간을 노래한다. 육신도 그리움마저도 ‘허전하고 허전해서’ ‘몸도 따라 하염없이 저무는 윤삼월’이다.
박목월의 「윤사월」을 다시 들여다본다. 열일곱 소년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는 이 서정시 저편으로 문득 이 시를 가르쳐 주신 옛 스승의 백발 성성한 모습이 마치 환영처럼 떠오른다. 아, 그러고 보니 그로부터 40년이 속절없이 흘렀다. 그 시절, 책상을 같이 했던 동무들의 모습을 무심히 떠올리면서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시의 첫 연을 덧없이 뇌어본다.
2012. 5. 23.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6월의 연꽃 구경 (0) | 2020.06.14 |
|---|---|
| 6월에 익어가는 것들, 혹은 ‘화해와 평화’ (0) | 2020.06.12 |
| 장미보다, 다시 찔레꽃 (0) | 2020.05.20 |
| 나들이 못 권하는 봄, 그래도 ‘황매산 철쭉’ (0) | 2020.05.19 |
| 팔공산 자락의 숲길 (0) | 2020.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