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자꽃 혹은 산당화

자색이 남달랐던 꽃, '명자'

명자나무를 처음 만난 건 2007년, 안동에 살 때다. 내가 사는 아파트 엉성한 뜰에 키 작은 관목 한 그루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 꽃봉오릴 눈여겨 두었는데, 어느새 꽃을 피웠다. 무심코 지나다니다 그 자색(姿色)이 여느 꽃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사진을 몇 장 찍었고, 나무 이름을 알아봐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블의 이웃이 쓴 글에서 ‘명자나무’라는 이름과 모습을 본 순간, 그게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던 꽃이라는 걸 알았다. 바로 뜰로 나가 보았는데, 아직 꽃봉오리조차 제대로 영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 거기 꽃이 핀 걸 확인한 게 한 열흘쯤 전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명자나무를 확인하고 나니 웬걸, 아파트 반대편 뜰 주위로 심어진 녀석들 여러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날이 갈수록 가지에 총총 피어나는 꽃송이가 탐스러웠고 나날이 짙어지는 붉은빛 꽃잎과 노란 꽃술이 곱디고왔다.


김춘수 시인이 그의 시 “꽃”에서 노래했듯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본질 인식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모든 관계론의 기초이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스쳐 갈 무명의 풀꽃 앞에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그 고운 속살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안도현이 소환한 '산당화'
인터넷에서 확인한 정보에 따르며 명자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이다. 원산지는 중국. 그 자색이 남달라 관상용으로 길러왔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꽃을 보면 바람이 난다고 하여 예전에는 집안에 심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꽃은 분홍색, 붉은색·담백색 등으로 다양하게 피는데, 붉은색 꽃잎이 고혹적이라면 분홍 기운이 도는 담백색 꽃잎은 그 기품과 청초함이 예사롭지 않다. ‘은은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는 꽃 때문에 ‘아가씨 나무’라고도 하며 보춘화(報春花), 산당화(山棠花)라고 부르기도 한다.

‘명자(榠樝)’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산당화’라는 이름은 훨씬 정겨워 보인다. 시인 안도현은 ‘산당화’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다. 아마 그가 익산의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때의 시인 듯하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리(지금의 익산시)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나는 그와 고등학교 동문이고, 꽤 활동적이었던 문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이태 후에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 당연히 내가 그를 만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그는 뛰어나게 시를 잘 써서 문예 장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어쩌다 보니 80년대 후반의 역사적 격랑 속에 우리는 함께 있었다. 우리 둘만이 아니라, 내게 두 해 후배인 친구도 있었다. 1989년의 전교조 해직 사태 때 우리 셋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학에서 쫓겨났다. 그는 복직했다가 전업 시인의 길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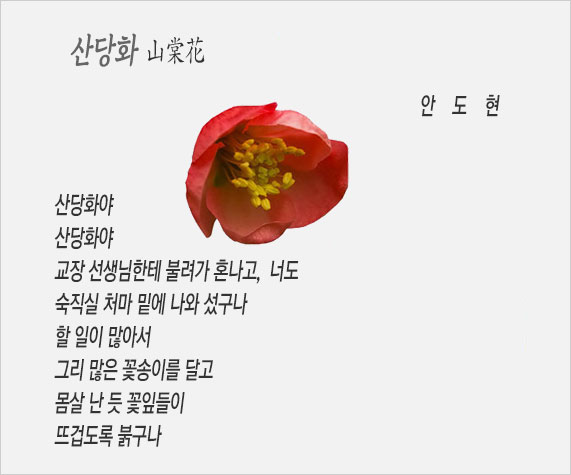

고교 때 활동을 같이한 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를 썩 잘 알지 못한다. 집회나 행사 때 잠깐 만나거나 술자리를 두어 번 같이한 게 고작이지만, 그가 좋은 시인이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친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시 ‘산당화’는 그의 맑고 따뜻한 품성이 시나브로 드러나는 작품인 것 같다.
그가 근무했던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 숙직실 앞에 산당화 한 그루가 서 있었던가. 젊은 초임 교사가 교장실에 불려가 꾸중을 듣는 건 한 시절 전에 다반사였을 터. 호되게 욕을 먹고 나온 젊은 교사가 애꿎은 담배를 태우다가 숙직실 처마 아래서 발견한 꽃이 산당화였던가.
시인의 눈엔 산당화 가지에 다닥다닥 붙은 꽃송이들은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붉디붉은 꽃잎은 몸살 난 영혼의 뜨거움으로 비쳤던 걸까. 산당화야, 산당화야. 나직하게 읊조리는 시인의 목소리가 4월의 뜰로 처연히 건너오는 듯했다.
그래서였나. 당시 근무하던 학교 처마 아래에 지난해에는 뵈지 않았던 산당화가 피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안도현처럼 숙직실은 아니고 학습실 앞쪽 두 그루 백목련 가운데서 이 조신하고 기품 있는 꽃이 다소곳이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나는 봄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꽤 쏠쏠하게 산당화를 만났다. 봄의 산행길 두 군데에서 나는 산당화를 만나곤 했다. 지난해 들른 안동 임청각 군자정 앞마당에, 내앞마을 의성 김씨 종택에도 명자꽃은 피어 있었다.
처음 만난 명자 '열매'
어저께는 의성 사는 벗에게 들렀다가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 있는 그의 화단에서 낯선 열매를 만났다. 마치 사과 같기도, 배 같기도 한 주먹만 한 열매가 보기에 좋았다. 아내는 모과인가 머리를 갸웃했다. 벗에게 물었더니 명자 아닌가, 한다. 맞다, 거긴 지난봄에 산당화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던 데다.


명자는 원산지가 중국인 장미과의 낙엽 관목이다. 꽃은 잎보다 먼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홍자(紅紫)색, 흰색 등으로 핀다. 꽃이 지면 맺는 열매는 사과 모양인데, 가을철에 노랗게 익는다. 열매가 비슷한 데다가 같은 장미과여서 명자나무를 모과나무의 사촌이라고 한다.
모과 같다고 본 아내는 반은 맞춘 셈이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명자는 관목, 모과는 교목이라는 점이다. 명자는 열매나 잎, 가지를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도(木桃)라고도 부르는데 모과와는 다른 품종이다.
명자는 가래를 삭이고,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 구토나 구역질, 신물을 토하는 증상, 근육경련, 이질을 치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냄새가 향기로워 옷장에 넣어두면 벌레와 좀이 생기지 않는 특징도 있다.
새로운 풀꽃과 나무를 만나고 그 이름을 하나씩 익히게 되면서 삶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에 고무된 적이 있다. 나이 들어서도 무언가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실 나는 여전히 청맹과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관련 글 : 꽃과 나무 알기-관계의 출발, 혹은 삶의 확장]
2019. 8. 2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절집 안으로 들어온 숲, 직지사(直指寺) (0) | 2019.09.04 |
|---|---|
| 찔레, 그 슬픔과 추억의 하얀 꽃 (0) | 2019.08.26 |
| 그, 혹은 나의 초가삼간(Ⅱ) (0) | 2019.08.21 |
| 그, 혹은 나의 초가삼간(Ⅰ) (0) | 2019.08.20 |
| 개구리밥과 부평초, 그리고 삶 (0) | 2019.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