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소화, ‘금등화(金藤花)’, ‘양반꽃’이라고 불리는 꽃의 계절


능소화(凌霄花)의 계절이다. 한여름엔 꽃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능소화는 다른 꽃들이 더위에 지쳐 허덕이고 있을 때 담장을 타고 하늘로 기어올라 주황색 고운 꽃을 피우는 것이다.
‘능소(凌霄)’란 ‘하늘을 뚫고 치솟아 오르다’의 뜻이다. 한여름 땡볕 속에 지치지도 않는 듯 하늘을 향해 휘감아 오르는 능소화의 모습에서 그런 이미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능소화는 달리 ‘금등화(金藤花)’라고도 부르는 모양이다. 등나무와 비슷하지만, 훨씬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 ‘금(金) 자’를 붙여 금등화라 부른 것이다. 능소화는 꽃이 질 때도 깔때기 모양의 꽃송이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쏙 빠져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빛깔이나 모양은 물론이고, 꽃이 질 때의 모습조차 고고하고 깔끔한 것이다.
그래서인가, 조선시대에는 이 꽃을 양반집에서만 길렀다고 한다. 상민들이 능소화를 심으면 양반을 능멸한다고 붙잡아다 볼기를 쳤다니 숨 막히는 중세의 풍경은 씁쓸하고 슬프다. 능소화를 달리 ‘양반 꽃’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 있다.
호젓한 골목 안 여염집 대문간에, 시골 대갓집 담벼락에 치렁치렁 핀 능소화를 나는 여느 꽃처럼 심상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나는 이 꽃의 전설이 가진 곡절과 사연에 앞서 이미 충분히 젖은 눈길로 능소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내게는 능소화와 관련된 기억도 추억도 없다. 철들 때까지 내겐 능소화를 만난 기억이 있는지조차 희미하다. 그런데도 늘 능소화는 아련한 비애의 이미지로 내게 다가온다. 능소화는 내게 선험적으로 슬픈 꽃인 것이다.
‘능소화’라는 제목으로 쓴 나태주, 김선우 시인의 시를 읽는다.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호흡의 산문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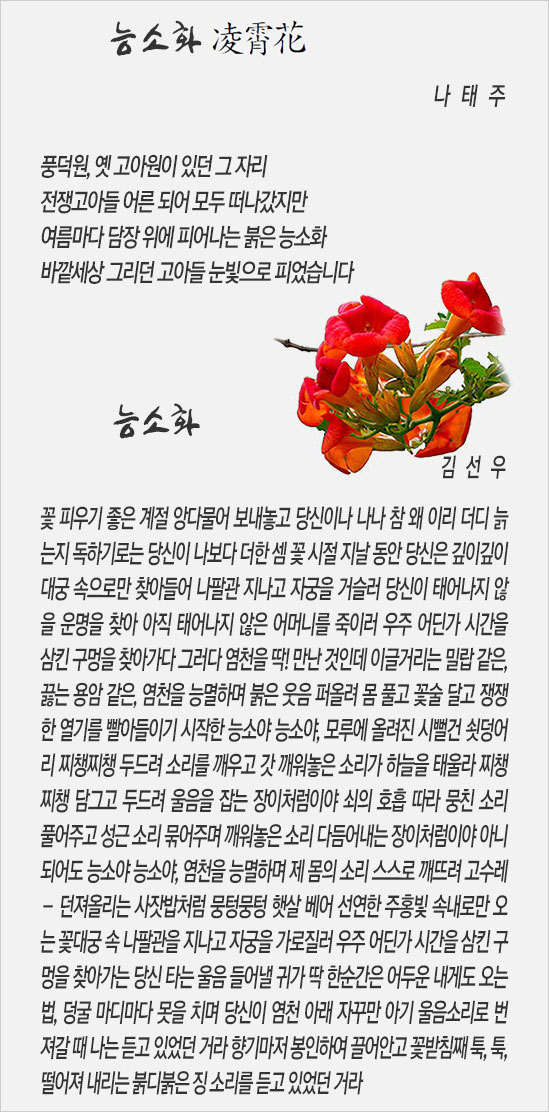
나태주 시인의 ‘능소화’는 어린 시절, 아스라한 기억의 창고로 인도하는 꽃이다. 고아원 자리, 전쟁고아들의 눈빛으로 핀 능소화, 그것도 슬프긴 매일반이다. 김선우 시인의 능소화는 징그럽다. 징그러운 원시적 생명력이다. 그것은 춘삼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찌쟁찌쟁 쇳소리를 울리며 그 뜨거운 가슴의 열기로 염천을 능멸하며 피는 꽃이다.
능소화에 깃든 전설은 미완성의 소품 같다. 드라마틱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은 이 전설의 컨셉은 ‘기다림’이다. 단지 그것은 이 꽃의 모습과 생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담장 주변을 서성이며 그것을 휘어감고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복숭앗빛 같은 뺨의 ‘소화’라는 아름다운 궁녀가 있었다. 어쩌다 왕의 눈에 띄어 빈(嬪)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것으로 ‘승은(承恩)’도 끝,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세월만이 남았다. 기다림과 오매사복(寤寐思服)의 세월에 지쳐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유언에 따라 그녀는 자기 처소의 담장 가에 묻혔다.
여름이 되자, 그 여자가 묻힌 곳에서는 담장을 휘감고 덩굴로 자라는 아름다운 꽃 한 포기가 피어났다. 살아생전에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멀리 밖을 내다보려고 높게, 발걸음 소리를 들으려고 꽃잎을 넓게 벌린 그 꽃이 바로 능소화다. 능소화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담장을 휘감고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데 그 꽃잎은 정말 귀를 활짝 열어 놓은 듯하다.

퇴직한 내 마지막 학교는 주도로에 바투 붙어 있었다. 첫 출근을 하면서 보니 한길을 따라 이어진 꽤 높다란 담장에 마치 말라붙은 등나무 줄기 같은 것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다. 그게 무언지 궁금해했는데 능소화란 얘길 듣고 긴가민가했다. 머릿속에 떠올린 능소화의 모습과 그 바싹 말라붙은 줄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로 접어들면서 능소화 줄기는 무성하게 잎을 매달기 시작했다. 황지우의 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에서 노래한 대로 능소화는 비로소 ‘마침내, 끝끝내’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가 된 것이었다. 마치 말라죽은 나무처럼 보이던 그 앙상한 줄기에서 들불 번지듯 벋어나간 싱그러운 줄기의 생명력은 경이롭다.
능소화는 중국 원산의 갈잎 덩굴나무다. 담쟁이덩굴처럼 줄기의 마디에 생기는 ‘흡반’이라 부르는 뿌리를 건물의 벽이나 다른 나무에 붙여 가며 타고 오른다. 담장의 메마른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오른 능소화 줄기를 지탱한 것은 뿌리다. 능소화는 7~8월에 가지 끝에서 나팔처럼 벌어진 주황색의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학교 담장에 피어난 능소화는 철 이른 꽃인 셈이다.
사진을 찍어서 바라보면서 능소화가 생각보다는 훨씬 고운 꽃이라는 걸 깨닫는다. 주황색의 좀 심심한 빛깔은 보정을 거치면서 훨씬 짙은 주홍으로 변했다. 사진기가 재현한 빛깔이 ‘공갈’이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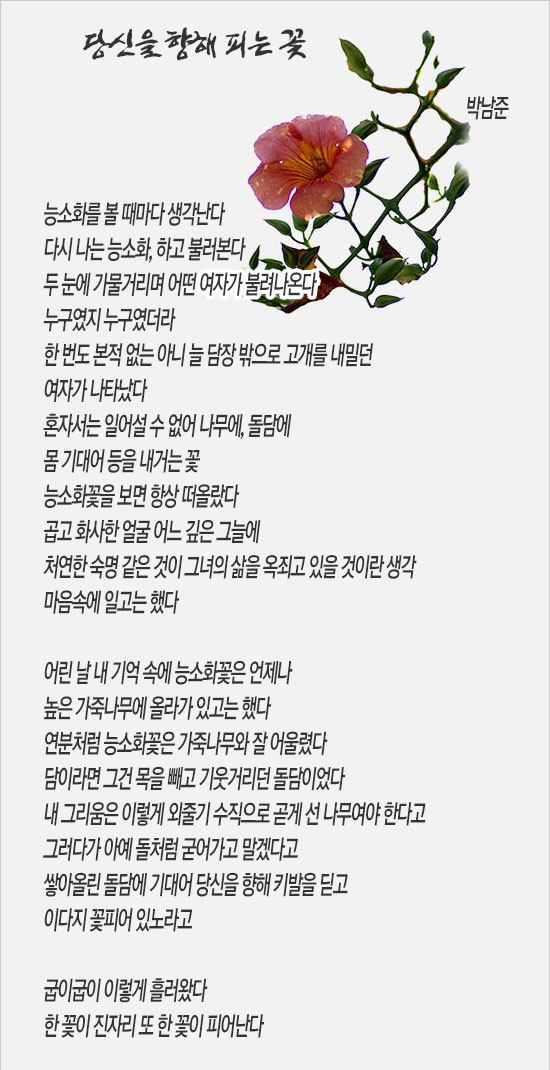
박남준이 노래한 능소화(“당신을 향해 피는 꽃”)를 읽는다. 그가 능소화를 부르면 어떤 여자가 불려 나온다고 했다. 맞다, 능소화는 그런 꽃이다. 시인은 또 능소화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어 나무에, 돌담에/몸 기대어 등을 내거는 꽃’이라 했다. 그렇다. 능소화는 담벼락에 내걸린 꽃등이다.




학교 담장에 핀 능소화는 여름이 깊어지면 담벼락 전체를 뒤덮곤 했다. 등불처럼 내걸린 능소화를 쳐다보며 출근하는 길이 소담스러웠는데, 어느 해부턴가 담장의 능소화가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나보다 반년 먼저 퇴직한 교장이 지저분하다며 베어내 버렸다 했다.
학교의 주요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그는 구성원들의 의견 따위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학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교사들과 소통 장애로 외면 받았던 그는 제대로 격식을 갖춘 퇴임식을 치르고 학교를 떠났다. 얼마 전 학교 앞을 지나는데, 능소화도 없는 그 골목길 이름이 ‘능소화길’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2019. 6. 26.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라지, 도라지꽃, 도라지 고갯길 (0) | 2019.07.20 |
|---|---|
| 탑을 품에 안은 연꽃 (0) | 2019.07.18 |
| 사라진 모래톱, 낙동강 제1경 상주 경천대(擎天臺) (0) | 2019.06.23 |
| 상주 공검지(恭儉池), 그 논 습지의 연꽃 (0) | 2019.06.19 |
| [사진] 주산지(注山池), 왕버들과 물안개의 호수 (0) | 2019.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