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정영상 30주기-정영상 문학전집 <감꽃과 주현이>를 받고

6월인지 7월인지, 상주의 선배 조 선생이 정영상의 시와 산문을 묶은 책을 보내주었다. 추모 정영상 30주기 정영상 문학전집 <감꽃과 주현이>이다. 시인의 고교 후배인 이대환 소설가가 엮은, 508쪽의 두툼한 장정판이다. 지난 4월 15일, 그의 모교인 공주대학교 교정에서 베풀어진 30주기 추모식에서 전집을 펴낸다고 하더니 그새 책이 나왔나 보았다. [관련 글 : ‘그’가 가고 30년, ‘그’는 우리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
책을 받아, 나는 그걸 책상 옆 프린터 위에다 얹어두고 볼 때마다 글쎄, 책 출간 소식이라도 한 자 끄적여야지, 하고 생각만 하면서 두어 달을 보냈다. 그가 낸 시집과 산문집은 모두 내 서가에 있으니, 굳이 따로 읽을 일도 없을 듯해서였다.
대학에서 만나 함께 문학을 공부한 절친한 벗이 1988년에 안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1990년 벽두에는 동료 교사 배주영 선생을 보낸 곳이 또 안동이었다. 그리고 1993년 봄, 4월에, 안동에서 활동하다 해직된 정영상이 죽령 너머 신단양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늘 안동을 매개로 그를 기억한다. [관련 글 : 안동에서 10년째 살기]

미술 교사로 그림을 그렸고, 그보다 더 열심히 시를 썼던 그를 나는 1987년 1급 정교사 연수에서 만났고, 동갑내기여서 쉽게 친해졌다. 그는 고향 영일의 바다가 보이는 낮은 산 중턱에 묻혔다. 우리 나이로 서른일곱 살. 그를 묻으면서 해직 동료들은 숨죽여 울음을 삼켜야 했다.
살아생전에 그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와 <슬픈 눈> 등 두 권의 시집을 냈고, 1993년 4월 황망 중에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은 사람들이 유고 산문집 <성냥개비에 관한 추억>, 유고 시집 <물인 듯 불인 듯 바람인 듯>이 펴냈다. 2003년에 그의 시비가 공주대(옛 공주사범대학) 교정에 세워졌다.
전집에는 정영상의 시 255편과 그의 희소하고 귀중한 산문 18편이 수록되어 있다. 독자와 정영상의 대화는 그의 고향 풍경·어린 시절을 짚고 넘어가야 독자가 그의 시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유고 산문집의 제1부를 이 책의 맨 앞에 배치했고 이어진 시편들은 시집 세 권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전집은 문학평론가 권순긍의 ‘정영상론’으로 마무리됐다.

오늘에서야 책을 뒤적였다. 출간된 산문집에 있는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표제작을 비롯한 몇 편의 산문을 읽었다.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그랬듯 주리고 헐벗은 유년을 보냈던 모양이다. 밤과 감꽃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의 유년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매우 유복하게 자란 행운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갑내기지만 나는 그의 유년을 공유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산문 두어 편만을 읽고도 우리가 단지 동갑내기였을 뿐, 유년의 어떤 부분에 대한 기억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훤칠한 용모에서 풍기는 귀티만 보았을 뿐, 그가 “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풋감을 무수히 주워다 먹”고 떨어지는 감꽃을 주우러 새벽과 하교하면 서둘러 돌감나무 밑으로 달려오는 유년 시절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밤송이’를 ‘밤이식이’라고 부른 건 지역 방언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치더라도, “설익은 하얀 밤을 더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허기와 가난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덜 익은 푸른 밤이식이를 한 가마니씩 따와 “빈 쇠죽솥에다 발로 꽉꽉 밟아서 넣”고 삶아낸 밤이식이를 “형, 동생, 엄마까지 모두 달려들어” 까서 먹는 “그런 날은 무슨 축제일처럼 집안이 희희낙락했다”라는 이야기도 낯설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보늬’라고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방앗간을 운영한 부친 덕분에 동무들처럼 배를 곯지 않고 쌀밥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던 내게 그의 유년 시절은 단지 상상만으로 가능한 어떤 시간이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감히 공유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삶의 공간에서 각각의 유년을 보낸 것이다.
어릴 적엔 나도 아이들을 따라 송기(소나무의 속껍질)를 벗겨 먹어보기도 했고, 어린 찔레순을 씹거나, ‘삐삐’라고 부른 띠의 어린 꽃이삭인 ‘삘기’를 따 까서 먹었다. 나는 그게 무슨 맛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한 채 씹다 뱉어냈지만, 그때의 동무들은 허기를 달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등허리가 서늘해진다.
1960년대는 내륙의 두메든, 바닷가 마을이든 가난이 성장기 아이들의 유년을 주림과 가난으로 할퀸 시대였음을 나는 다시 부끄러움으로 돌이킨다. 그 시절의 가난과 그것이 덧낸 상처를 이해하는 척했을 뿐이지, 공유하지 못했음을 뉘우치면서 옛 동무들을 떠올렸다.
나는 임하면 추월리 뒷산에 내 옛 친구를 묻고 나서부터 망자를 추모하는 일 따위는 고작 산 자를 위무하는 일뿐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그래서 산 자들은 얼마간의 위로를 받을 뿐이겠지만, 흙으로 돌아간 이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나는 우정 허무의 심연에 침잠하곤 했다.
그러나, 그게 산 자의 위로에 그칠 뿐이라고 할지라도, 망자의 뼈조차 흙이 되어버린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이 그를 잠시나마 되살리는 일은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가 남긴 시편과 산문들, 그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들에게 남긴 말과 말, 그 행간의 기억들이 그를 소환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서른여덟 살의 정영상을 생각한다
그의 30주기 추모식을 다녀온 뒤 쓴 글에서 밝혔듯 동갑내기로 편하게 지냈지만, 나는 정영상을 잘 모른다. 내가 직접 겪은 그의 모습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는 게 훨씬 쉬울 정도다. 그와 온전히 둘만 만난 일도 한두 번에 그치고, 그가 늘 했다는 통음도 함께 한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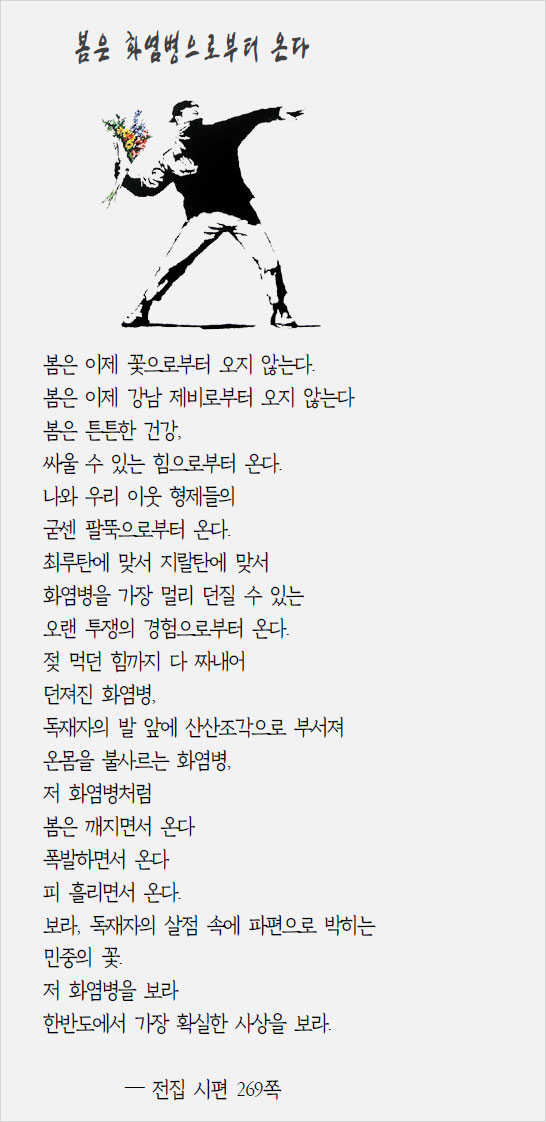
나는 그가 여린 감성의 시인이고, 격정을 감추지 않는 투사였다는 사실만을 알 뿐, 그가 잘 드러내지 않는 속내를 요만큼도 알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 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으레 그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것도 30년이나 지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 인간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집을 뒤적이다가 정영상의 시 가운데 투사로서의 격정을 보여주는 시 한 편을 천천히 읊조려 본다.
2023. 9. 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필사용 시집, ‘큰언니’와 노년 세대에 건네는 ‘따뜻한 연대’ (7) | 2024.10.02 |
|---|---|
| 600일·3만km를 달린 ‘자전거 여행’의 기록, 4권으로 묶여 나오다 (49) | 2023.11.08 |
| 브레히트 ‘독서하는 노동자의 질문’ (2) | 2023.05.02 |
| 시인은 생각의 길마저 끊어진 그 ‘높고 푸른 거기’ 가고 싶다 (1) | 2023.03.17 |
| 63세 라이더, ‘자전거 세계여행’의 서막을 열다 (2) | 2023.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