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섭 시집 『어디 어찌 그것뿐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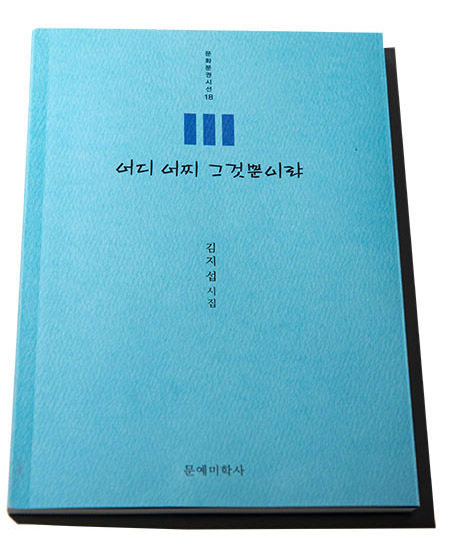
김창환 선생 10주기 추모식에서 김지섭 선생을 뵈었다. 2019년 5월, 내 출판 기념회에 와 주셔서 뵙고 어언 4년 만이다. 선생님은 김창환 선생보다 2년 위시니 우리 나이로 일흔일곱, 내게 9살 연상이시다. 언제나처럼 차분해 뵈는 모습이었으나, 여든에 가까이 이른 세월의 자취는 지우기 어려운 듯했다.
경황 중에 하직 인사도 못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지난해 낸 시집을 보내주겠다면서 전화를 주셨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편으로 시집이 왔다. 그러나 시집을 받아놓고도 며칠 동안이나 책을 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시를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다.
‘시 읽기’의 어려움, 혹은 그 준비
대체로 문학도들은 시를 끄적이면서 문학에 입문하는 듯하지만, 나는 그런 경로를 밟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설에 꽂혀 있어서 그랬던가, 나는 시를 거의 읽지 않았고, 흉내라도 시를 끄적인 적이 없다. 그것은 시를 읽으면서 어떤 울림에 감동하거나 내면의 분출을 겪지 못해서였는지 모르겠다. 소설을 함께 공부하던 벗들이 저마다 습작 시편을 적잖이 두고 있는데도 시화전에 낼 시 한 편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곤 했던 건 그래서다.
소설을 십여 편쯤 끄적이다가 ‘콩꼬투리’만 한 가난한 재능으로 삶과 세상을 그려선 ‘감자 한 알도 적시지 못’(황석영)하리라는 걸 깨달은 30대 어귀에 나는 ‘문청(文靑)’을 길을 접어버렸다. 그리고 국어 교사로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며 30년 넘게 살았다.
중도 작파하긴 했지만, 읊조린 풍월이 있어서 소설을 가르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시를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였다. 시에 대한 내 이해는 고작 문학 참고서류의 해석에 간신히 토를 붙이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 식의 해석을 넘지 못하는 내 강의를 적당히 분식한 것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문학적 감수성이었다. 초임 시절, 고교 1학년 소녀들에게 시 단원을 가르치면서 예정된 시수(時數)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쓰는 ‘만용’을 불사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어쨌든 그러고도 교단에서 밥을 먹었는데, 교단에 선 지 스무 해가 넘을 즈음에야 교과서에 실린 시가 ‘참고서 식 해설’을 넘어 조금씩 그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으니 그건 전적으로 세월의 힘이다. ‘서당 개 삼 년’의 ‘풍월’이 말하자면, ‘척 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 것이었다.
교단을 떠나 자유인이 된 지 7년, 가르칠 일이 없으니 시 읽기는 점점 멀어졌다. 최근 2년여에 걸쳐 내가 주변의 선후배와 벗에게서 받은 시집은 얼추 10권에 가깝다. 손 닿는 데 두고서 틈나면 읽어야지 하면서도 그걸 펴는 일은 거의 없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시를 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다.
시를 읽으려면 최소한도 차분하게 시의 언어 속으로 젖어 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소설이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며 읽어도 상관없는 서사 문학이지만, 시는 마음으로 스며오는 울림의 교감으로 완성되는 서정 문학인 까닭이다.
잠깐 읽어도 거기 몰입해서 읽지 않으면 시편이 전해주는 울림은커녕 난삽한 감정의 범람만 남을 뿐이기 때문이다. 집중은 필요하지만, 인물과 사건을 잇는 서사의 축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소설과는 다른 점이다. 나이 들면서 집중이나 몰입이 점점 힘들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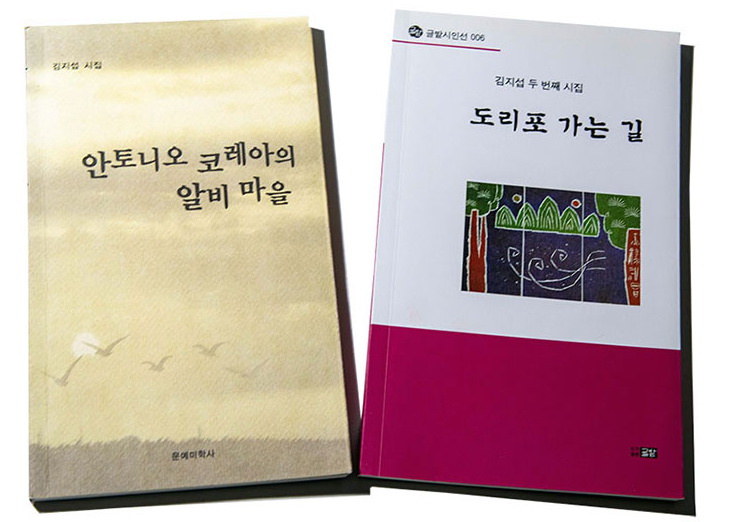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을 읽으며
선생의 세 번째 시집 <어디 어찌 그것뿐이랴>를 편 것은 그러고도 며칠이 지나서였다. 선생이 앞서 내신 첫 시집 <안토니오 코레아의 알비 마을>(2005)과 두 번째 시집 <도리포 가는 길>(2020)은 내 서가에 얌전히 꽂혀 있다. 18년 전에 낸 첫 시집을 읽은 기억조차 희미하고, 3년 전에 낸 두 번째 시집도 뒤적이다 만 듯하다.
나는 책머리의 ‘시집을 엮으면서’부터 읽었고,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책을 접었다가 펴곤 했다. 책머리에서 선생은 자신에게 ‘시가 온 날’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연관되면서 시작되었고, ‘빛나는 말씀’이라고 여겼던 시가 “신산한 삶”의 “아픔과 절망의 몸부림” 같은 거로 생각이 바뀌기도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요즘에야 시란 “불생불멸 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푸라기나 먼지, 티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빛나는 말씀”에서 “아픔과 절망의 몸부림”을 거쳐 “보푸라기나 먼지, 티끌”로 돌아온 시간 앞에서 그는 가끔씩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서 시 ‘거기’를 소개한다.
가고 싶다 / 사람들의 말 이제 들려오지 않고
내 말조차 사라진 외로운 오솔길
아니/ 내 생각의 가는 길마저 / 문득 끊어진
어느 절벽의 / 높고 푸른 / 거기
시인이 젊은 날부터 천착해 온 시가 마침내 닿고 싶은 곳은 사람들의 말은 물론 자기 말도 사라진 “외로운 오솔길”이다. 마침내 “생각의 가는 길마저” 끊어져 버린 “어느 절벽의 / 높고 푸른 / 거기”다. 시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나는 그의 ‘거기’에 공감했다. 언어의 교직으로 세계를 노래해 온 시인은 어느 날, 언어조차 넘어선 ‘거기’를 지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일까.

생각의 길마저 끊어진 그 ‘높고 푸른 거기’
표제작 ‘어디 어찌 그것뿐이랴’는 여든을 앞둔 시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자연과 사랑의 순환이다. 시인은 피었다 지는 ‘꽃’과 찼다가 이지러지는 ‘달’, 흘러와 다시 흘러가는 ‘강물’, 다가왔다 멀어지는 ‘임’을 통하여 자연과 사랑의 순환을 ‘-랴’로 끝나는 종결어미를 써서 어찌 그럴 것이냐고 반문한다.
2연은 1연의 내용을 순환의 순서만 바꾸어서 되풀이하면서 ‘어디’보다 더 강한 부정의 뜻을 지닌 부사 ‘어찌’로 그 순환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된다. 이 시가 여든 편이 넘는 수록작 가운데 표제가 된 점은 이 시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관점을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김지섭 시인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시를 가장 감동적으로 낭송하는 이로 기억하고 기린다. 2000년대 초반 어떤 행사에서 선생이 시를 한 편 낭독했는데, 나는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낮지만 힘이 실린 중후한 목소리로 시종일관한 그의 낭송은 톤과 호흡에서 압도적이었다.
글의 호흡을, 생각의 흐름이 빚어내는 리듬에 대한 언어 감각이라고 여기는 나는 산문 문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편이다. 그의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차분한 호흡이 퍽 편안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짧은 시들의 흐름에서는 시인의 묵직한 시력(詩歷)이 절로 읽혔다.

시 ‘재야(在野)’가 그렇다. 시인이 왜 제목을 한자어로 붙였는지가 어렴풋이 짚이는 듯했다. 그것은 퇴직 이후, 그가 선택한 구도의 길, 외로이 시를 쓰면서 돌아본 고독과 실존의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또, 가득한 “풀벌레 소리”와 “냇물이 도란거리며 흘러가”는 그 뜰에 “달빛이 가득”한 까닭이 아닐는지.
2000년대 초반에 주말이면 선배 동료들과 함께 안동의 인근 낮은 산에 오르곤 했다. 학가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동네 천주동이 나오는 시 ‘천주동 일기’를 읽으면서 그 시절을 아련하게 떠올렸다. 아직도 선생은 산을 오르시는가, 시 ‘달빛 산행’도 정겹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안동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그때처럼 산행을 함께할 기회는 이제 다시 없을 것이다. 20년 전 어느 봄날 산행을 함께한,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만년을 보내시기를, 좋은 시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고 있다.
2023. 3. 1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 정영상 시인의 문학전집 <감꽃과 주현이> 출간 (34) | 2023.09.05 |
|---|---|
| 브레히트 ‘독서하는 노동자의 질문’ (2) | 2023.05.02 |
| 63세 라이더, ‘자전거 세계여행’의 서막을 열다 (2) | 2023.01.03 |
| 창비의 ‘독점구조’와 김사인의 ‘만해문학상 사절’ (0) | 2022.09.03 |
| 21년차 검사의 ‘부적격 F 평가’를 각오하고 쓰는 대국민 고발장 (1)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