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에 공휴일과 국경일이 많아서 달력이 울긋불긋하던 시절도 옛날이다. 올 10월 달력에 빨간 날은 개천절(3일)뿐이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국군의 날(1일)과 한글날(9일)이 공휴일이었으니, 이런 날들이 주말이나 주초에 걸려서 연휴가 되거나 징검다리 휴일이 되어 샐러리맨들을 흥분시켰던 기억도 까마득하다.
UN의 날도, 아폴로 달착륙에도 놀던 시절
더 오래전,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때의 일인데 유엔의 날(24일)도 공휴일이었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였다 해서 7월 어느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 쉬었던 기억도 있다. 60년대 말께인데 당시에는 우리가 유엔에 가입도 하지 못했던 때였다. [관련 글 : 아폴로 11호 ‘달 착륙’과 공휴일]
그런데도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쉬었던 것은 아마 ‘UN군’이 ‘6·25 동란’ 때 우리를 ‘북한 공산군’으로부터 지켜 준 ‘은혜’를 기린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놀았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거의 만화 같은 이야긴데, 그 당시 이미 우리 정부는 글로벌한 국제감각(?)을 겸비하고 있었던가 보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은 이승만 정부 때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10월 1일로 정해졌는데,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는 국군의 날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다.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온 ‘자주적 민족의 군대’라는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임시 정부의 정식 군대였던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일파 일색의 이승만 정부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국군의 날 제정은 일단 ‘졸속’의 혐의가 짙다. 또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냉전 시대의 자취로 볼 수 있는 현행 국군의 날은 개정되는 게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인 ‘국민학교’를 버리는 데 50년이 넘게 걸렸음을 생각하면 이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하다.
개천절
개천절(開天節)은 기원전 2333년(무진戊辰), 즉 단군 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단군의 단군조선 건국을 기리려 제정된 날인데, 그 연원을 상고시대의 제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의 시월제 등이 그것이다.
농경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 해 농사를 거두고 햇곡식을 바치는 제천행사를 치르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여 상달[上月]이라 불렀다. 또 숫자 3도 길수(吉數)로 여겨 왔다는 사실은 개천절 본래의 의미와 이어지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한글날
올 한글날은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반포(1446)한 지 561돌이 되는 날이다.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에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을 만들어 그 뜻을 기리고 1997년 10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 세계 최고의 문자를 기념하는 날은 그러나, 만만찮은 길을 걸어왔다.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제외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권 때의 일이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는데, 한글날을 기념일로 격하한 명분이 가관이었다. ‘노는 날이 많아 산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과소비 풍조가 발생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여론을 존중했다는 것.
당시 노 정권이 신정 연휴와 별개로 ‘민속의 날(설날)'과 추석을 연휴로 늘렸는가 하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다음 날까지 휴일을 연장하기도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였던 것.
14년만인 2005년 12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한글날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이 된 것이다.
올해는 국경일이 된 지 두 번째로 맞는 한글날. 국경일 휴무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국경일 지정이 곧바로 공휴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특별히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13년이다.)

마침 한글날은 24절기 중 한로(寒露)와 겹친다. 이 시기는 온갖 곡식과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로, 이슬이 서리로 변하기 직전이다. 또한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등 여름새와 기러기 등 겨울새가 바뀌는 시기라 한다. 우리나라에선 국화전(菊花煎)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과문한 탓인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한로라 하면 늘 생각나는 시가 신동집 시인의 시 “송신(送信)”이다. 이 시는 가을을 노래하면서 ‘죽음과 조락(凋落)의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순환과 죽음’을 노래한다. 대학에서 학점 후하기로 소문난 이 노시인에게서 나는 교양 영어를 들었고, 뜻한 대로 에이플러스를 받았다.
“바람은 한로(寒露)의 / 음절을 밟고 지나간다.”라는 시행은 마지막 절기인 대한(大寒)을 향하여 질주하는 계절을 노래하면서 시간 앞에 무력한 유한적 존재의 비애와 숙명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옛 유엔의 날이었던 24일은 상강(霜降). 열여덟 번째 절기다. 된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로, 들에서 본격적인 가을걷이가 시작된다. 벼 베기와 타작을 하며, 벼를 베어낸 논에는 다시 이모작용 가을보리를 파종하기도 하는 때지만, 요즘은 보리를 심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계절은 입동(立冬, 11월 8일)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집을 짓지 못할 것’이며, ‘지금 홀로 깨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외롭게 머물며, 잠이 깨어,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게 될 것‘이라고 노래한 시간이다. [관련 글 : 초가을 풍경, 릴케의 ‘가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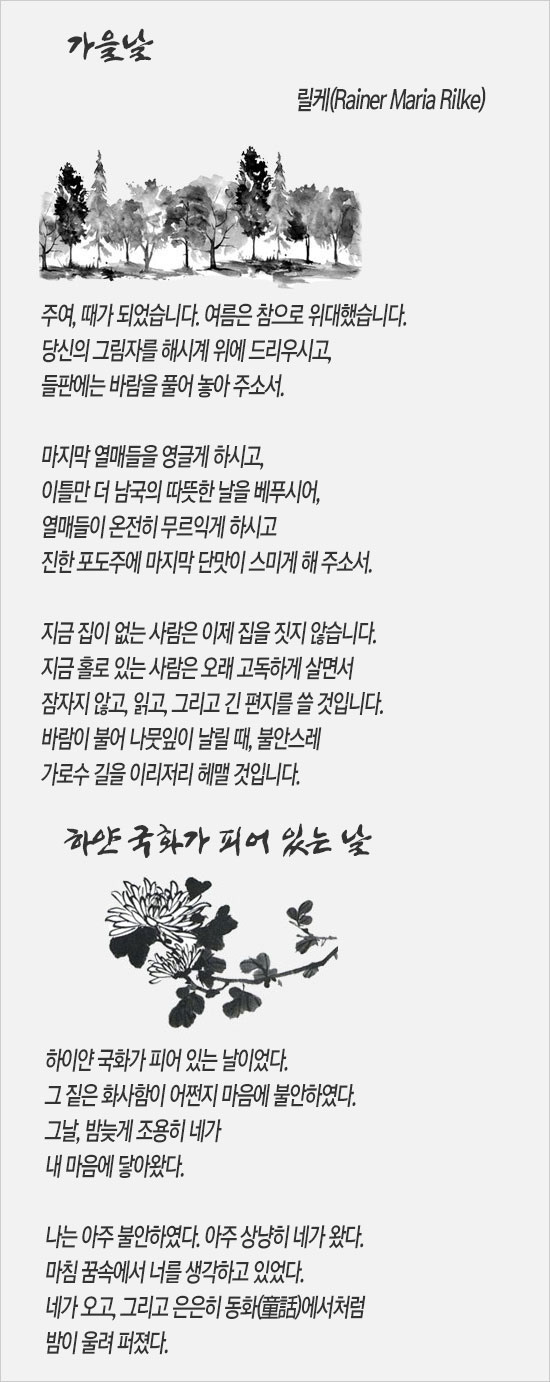
새로 입속으로 신동집과 릴케의 시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마음이 허해지는 느낌이 있다. 늦더위로 잠시 주춤했지만, 가을은 이미 세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룬 게 없어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란 바스러지는 낙엽 같은 것이다.
‘자기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임을 깨닫는 겸손함’과 ‘자기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을 이루어주는 한 부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랑이 된다는 쇠귀 선생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연대(連帶)’다.
연대는 멀리 있지 않다. 이랜드와 KTX 여승무원의 투쟁에 대해서, 버마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는 것, 그것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낮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연대인 것이다.
2007. 9. 3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SPC(파리바게뜨) 불매운동, 혹은 ‘윤리적 소비’ (0) | 2022.10.29 |
|---|---|
| 감 이야기(3) - 이른 곶감을 깎아 베란다에 걸다 (2) | 2022.10.15 |
| [전시] ‘지주중류’와 ‘백세청풍’으로 기린 야은 길재 (0) | 2022.09.23 |
| 통일 햅쌀, 밥 (0) | 2022.09.19 |
| [사진] <2021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2021.9.10.~11.2.) (0) | 2022.09.14 |





댓글
낮달2018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