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원 시인의 ‘한 잎의 여자’

나는 오규원(1941~2007) 시인을 잘 모른다. 물론 이는 선생의 명성과는 무관하게 내가 ‘무심하고 형편없는 독자’여서이다. 나는 그의 시를 제대로 읽지 않았고 그가 펴낸 시집 <사랑의 기교>나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등 시집을 마치 유행가 제목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얼마간 우리 집 서가에는 민음사에서 펴낸 ‘오늘의 시인 총서’ 시리즈 중의 하나였던 그의 시집 <사랑의 기교>가 내내 꽂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시집을 읽었던지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에 없다. 가끔 어디선가에서 우연히 읽은 그의 시 ‘한 잎의 여자’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에게 참 미안했다.
내가 민음사에서 펴낸 <사랑의 기교>를 다시 산 것은 지난해 2월이다. 서지사항을 확인해 보니 이 책의 초판은 1975년에 나와 16쇄까지 발행했고, 내가 산 책은 2006년에 낸 개정판 2쇄다. 글쎄, 잘은 몰라도 초판이 16쇄까지 나왔다는 건 이 책이 대중의 사랑을 일정하게 받았다는 뜻이겠다.

책을 사고 나서도 그걸 펴 본 기억이 아스라하다. 책상머리 가장 가까운 서가에 꽂힌 그 시집을 다시 펴 보게 된 것은 순전히 ‘심수봉’의 노래 때문이다. 심수봉의 노래가 오규원을, ‘한 잎의 여자’를 떠올리게 된 것은 뜬금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요즘 차 안에서 가끔 심수봉의 노래를 듣는다. 나는 그녀가 부른 ‘그때 그 사람’도 좋지만, 요즘에야 알게 된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에 좀 빠져 있다. 그녀가 가진 독특한 음색을 뭐라고 해야 하나. 누구는 ‘퇴폐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달착지근한 소리맵시가 썩 마음에 든다. 어쩌면 그런 목소리가 ‘유행가’답지 않은가 말이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 ‘그때 그 사람’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 ‘백만 송이 장미’
물론 내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달리 없고,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따위는 듣지 않았다. 그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마찬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나른한 음성을 들으면서 누구나 그런 젊은 날의 사랑의 자취쯤은 쌓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뒷날에 떠올리는 젊음이란 누구에게나 미몽과도 같은 것.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찰나였고, 그 젊음도 찰나가 되어버린 중년의 문턱에서 떠올리는 청춘의 시대란 쓸쓸하고 외로운 ‘회한’이고 사위어 버린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
심수봉의 목소리는 그런 현실을 환기하면서도 잠시나마 회한으로 덧칠된 과거를,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준다. 그것은 입 안에서 녹는 박하사탕의 향내같이 입안을 알싸하게 만들면서도 그게 잠깐 머무는 순간의 미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지는 않는다. 그게 나는 심수봉의 목소리가 가진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아침이었을 게다. 출근길에 심수봉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녀가 환기하는 세계를 오규원의 ‘한 잎의 여자’와 잇게 된 것은. 심수봉의 노래가 젊은 시절의 애틋함을 환기해 주었다면 오규원의 시는 그 여자의 모습을 뚜렷하게 떠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는 자신에게 각인된 여인의 모습을 마치 일상의 풍경처럼 되뇌고, 그리고 그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그가 뇌까리는 여인의 모습은 보일 듯 말 듯, 보랏빛 안개 속으로 침잠하고 종내 그녀는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슬픈 여자’로 남는다.
시인은 뒷날 다른 시집에 이 시를 실으면서 ‘언어는 추억에 걸려 있는 18세기형 모자’라는 부제를 첨가함으로써 ‘여자’가 ‘언어’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던가. 그러나 아무려면 어떤가. 우리는 모두 그 ‘한 잎의 여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질 ‘그 여자’는 ‘물푸레나무 한 잎’과는 무관해도 좋다. 그녀는 뚱뚱하거나, 고약하거나, 수다스러운 여자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중년의 문턱에서 기억되는 과거의 여인이란 그런 것이다. 그녀들은 늘 ‘한 잎의 순결과 자유’로 떠오르게 된다는 말이다.
심수봉의 나른한 목소리, 젖은 듯 마른 듯한 묘한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한 잎의 여자’를 입속에서 뇌곤 한다. 그러면서 깨닫는다. 과거의 여자란, 그 존재라는 것은 그 모습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추억 속의 여인이란 모든 기억의 총합으로 남는다.
우리가 떠올리는 과거란, 과거의 여인이란 빛바랜 사진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존재를 둘러싼 총체적 느낌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의 목소리, 찌푸린 미간, 머리칼과 살 내음, 온몸으로 쓰러져 오던 육체의 양감(量感), 손과 뺨의 온기, 때로는 잠에서 막 깨어난 부스스한 모습, 입에서 풍기던 아스라한 쉰내까지…….
저급한(!) 대중가요로 시인과 시를 능멸했다고 꾸짖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미 고인이 된 시인에겐 죄송한 일이다. 그러나 그이가 기억했던 ‘한 잎의 여자’나 우수마발(牛搜馬勃), 장삼이사인 우리 독자에게나 ‘한 잎의 여자’는 비슷한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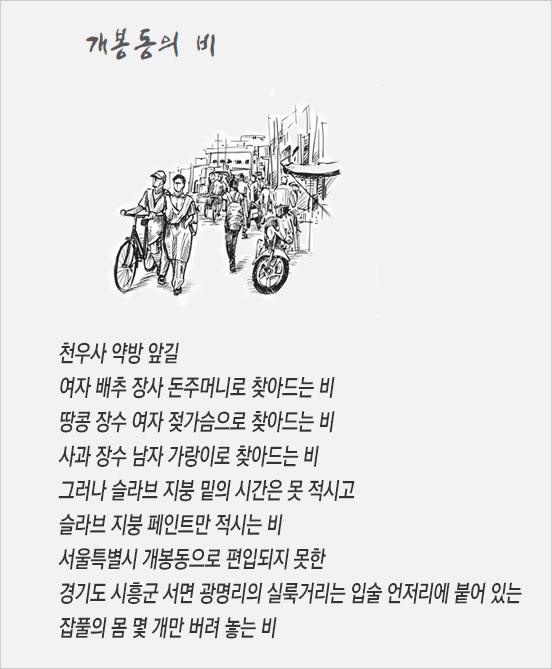
2009년 2월에 산, 묵은 시집을 꼭 1년 만에 뒤적여 보다가 나는 ‘개봉동의 비’를 읽는다. 때마침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봄을 재촉하는 비다. 오늘,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있어 여전히 아릿한 과거를 떠올리기엔 그만인 날씨다.
2010. 2. 2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D수첩’에 서린 PD들의 땀과 좌절의 세밀화 (2) | 2022.03.20 |
|---|---|
| 새로 만난 시인들 - ③ 신용목 (0) | 2022.03.19 |
| 비와 우산, 그리고 시(詩) 세 편 (0) | 2022.01.31 |
| 새로 만난 시인들 - ② 손택수 (0) | 2022.01.30 |
| 새로 만난 시인들 - ① 안현미 (0) | 2022.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