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읽어보는 시

비는, 혹은 비 오는 날의 이미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 극단으로 나뉜다.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모처럼의 외출이나 손꼽아 기다려온 경사를 망치는 불쾌하고 짜증나는 날씨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당히 쓸쓸하면서도 적당히 기분 좋은 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가 맑고 투명한 햇살을 삼켜버리며 일시에 세상을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로 바꾸어 가긴 하지만, 그것이 연출하는 적요(寂寥)와 우울(멜랑콜리melancholy)을 사랑하는 이도 적지 않다. 비는, 또는 비 오는 날은 잊었던 감상(感傷)과 애상(哀傷)의 정서를 환기하며 그를 그리움과 추억, 슬픔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기도 한다.

비는 물이다. 이 빗물이 가진 정화(淨化)의 이미지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증폭된다. 그것은 때로 가만가만 어둠을 흔들면서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 휘몰아치는 비바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가 보여주는 힘의 강약이 사랑과 그리움의 그것과 비겨지곤 하는 까닭이다.
눈비가 교차했던 주말에 ‘비’를 노래한 시, 몇 편을 읽었다. 유하의 ‘비가’, 나희덕의 ‘비 오는 날에’, 안도현의 ‘빗소리 듣는 동안’이 그것이다. 시인에게 포박되면서 비는 사랑과 그리움이 되고, 추억의 시간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웃과 공감하게 하는 아픈 현실이 되기도 한다.
비 오듯 한 그리움, 유하의 ‘비가’

유하는 내가 ‘무림일기’ 연작으로 만난 시인이다. 같은 시로 <문예중앙> 신인상을 받을 때 나는 그 계간지를 정기구독하고 있었다. 신군부 독재의 5공 시기를 ‘무림’으로 비유한 이 연작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나는 그의 시집 <무림일기>도 샀다.
그리곤 잊어버렸는데 그는 어느 날 영화감독으로 돌아왔다.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 <쌍화점> 따위가 그가 연출한 영환데 나는 아직 그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못했다. 양귀자의 단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패러디한 제목의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가 데뷔작이다.
그의 시 ‘비가’는 제목부터 좀 헷갈린다. 우리 세대는 너무 익숙하게 ‘비가(悲歌)’를 떠올리지만, 그는 단지 ‘내리다’의 주어로 ‘비가’를 썼을 수도 있다. 아무려면 어떤가. 그게 ‘슬픈 노래’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니 말이다.
그 사랑은 그리움이다. 한 방울의 비가 그의 얼굴이고, 그의 노래다. 비 오듯 한 그리움이지만 흩어지는 빗방울 속에 그대는 사라지고 숨는다. 그리하여 그는 너무 멀고 멀다. 압권은 마지막 행, ‘그대가 빗발치게 그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다. 빗발치는 그리움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비 오듯 한 그리움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나누는 아픔과 공감, 나희덕의 ‘비 오는 날에’

나희덕 시인에게 비 오는 날은 ‘비를 나누어 맞는 기쁨, / 젖은 어깨에 손을 얹어 / 따뜻한 체온이 되어줄 수도 있는’ 날이다. 그것은 ‘만물이 눅눅한 슬픔에 녹’는 날, ‘우리의 살끼리 부대낌’으로 ‘빗발의 드세기’를 넘는 공간이다.
그런 비 오는 날, 비닐우산을 향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팽팽하고 / 단단한 강철의 부리를 지니고 있’는 나의 우산은 ‘댓살 몇 개가 엉성하게 받치고 선 / 네 약한 푸른 살을 찢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나의 단단함이 가시가 되고 / 나의 팽팽함이 너를 주눅 들게 한다면 / 차라리 이 우산을 접어 두겠다’고 한다.
이 시에서 ‘비’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라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이 우산들은 살끼리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삶이다. 비를 나누어 맞으며 이웃과 공감하는 삶이다. 시를 읽으며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 우산은 어떨까. 혹시 어느 비닐우산의 푸른 살을 찢어 버릴 수 있는 단단한 강철의 부리를 지니고 있지나 않을까, 내 단단함이 가시가 되고 그를 주눅 들게 하지는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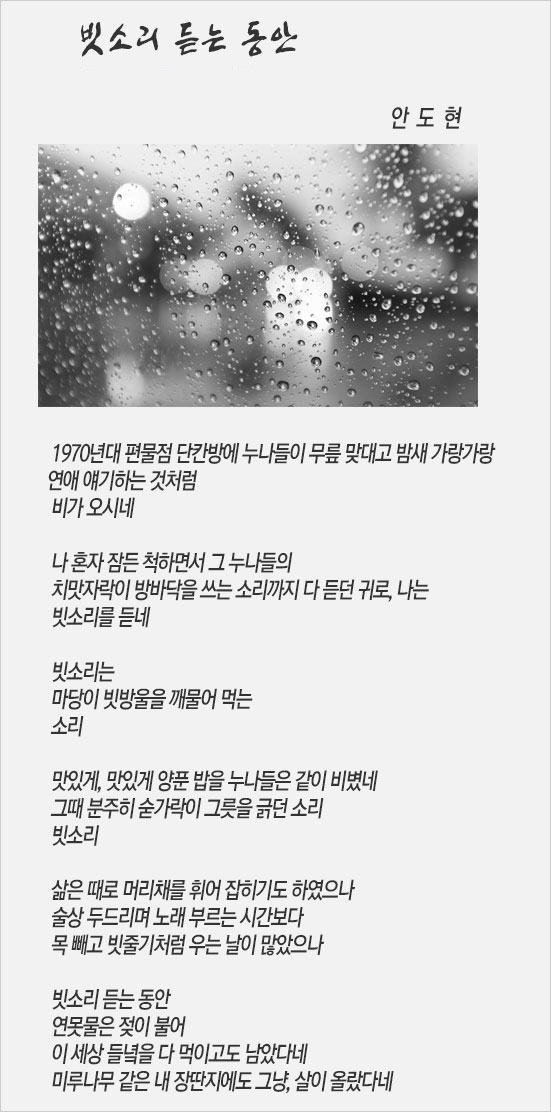
‘빗소리를 듣는 동안’은 처음 읽는 시다. 안도현은 내 고등학교 5년 후배다. 나이 차 때문이 아니라 그는 경북 북부 출신이니 남부에서 자란 나와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시를 읽고 그와 나는 같은 시대의 추억과 삶을 공유한 세대라는 걸 깨닫는다.
70년대의 추억과 성장, 안도현의 ‘빗소리 듣는 동안’‘’
그는 빗소리를 노래했다. 1970년대의 편물점과 거기 모여 놀던 누나들, 그리고 그들이 비벼 먹던 양푼 밥……. 그것들은 내게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익숙한 장면이다. 거기서 누나들이 나누던 수다조차 익숙하다. 잠든 척하면서 누나들의 사소한 움직임을 귀로 듣고 있는데 들려오는 빗소리…….
빗소리를 ‘마당이 빗방울을 깨물어 먹는 / 소리’라고 느끼는 화자에게 그것은 누나들이 숟가락으로 양푼을 긁던 소리와 겹친다. 그리고 성큼 자란 화자가 다시 떠올리는 삶이란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우는 날이 많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한다. 빗소리 듣는 동안에 ‘연못물은 젖이 불어 / 이 세상 들녘 다 먹이고도 남았다네 / 미루나무 같은 내 장딴지에도 그냥, 살이 올랐다’고. 한 소년이 성장하는 길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어찌 빗소리뿐이었을까.
유례없는 한파가 한바탕 지나가더니 며칠 후면 입춘이다.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지만, 그 속에 봄이 자라고 있었던 게다. 진부하지만 삶이 그러하지 않던가. 나는 자꾸만 가라앉는 기분을 추스르며 개학을 기다리고 있다.
2016. 1. 3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 만난 시인들 - ③ 신용목 (0) | 2022.03.19 |
|---|---|
| 우리 모두의 ‘한 잎의 여자’ (0) | 2022.02.24 |
| 새로 만난 시인들 - ② 손택수 (0) | 2022.01.30 |
| 새로 만난 시인들 - ① 안현미 (0) | 2022.01.28 |
| ‘진보의 희망’으로 살아온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 (0) | 2021.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