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야산에서 만난 매화

오늘 오전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근 야산에서 매화를 만났다. 남도에서는 진작 핀 꽃이지만, 아직도 봄은 먼 경북 북부지역에선 ‘아직’이다. 야산 비탈길로 오르는 어귀, 오종종하게 서 있던 가느다란 매화나무 몇 그루에 잔뜩 물이 올랐다.
막 윤기가 흐르는 줄기에 다투어 벋은 가지에 꽃망울이 잔뜩 부풀었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다. 뿌리에 가까운 쪽에 한두 송이가 힘겹게, 그것도 꽃잎을 7부만 벌리고 있다. 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산등성이에서 상기도 한기를 품은 바람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어이없게도 매화(梅花)를 나는 화투 그림을 통해서 먼저 알았다. 거의 직각으로 꺾인 가지 위에 꾀꼬리가 앉아 있는 2월 ‘매조(梅鳥)’로 말이다. 눈썰미가 없었던가, 아니면 주변에 매화가 드물었던지는 잘 모르겠다. 매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마흔이 다 돼서니, 참 우리네 앎이란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매화는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다. 그래서 이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를 설중매(雪中梅)라 하여 기린다. 매란국죽, 사군자 가운데 매화가 그 으뜸이 되는 까닭도 같은 것이다.
매화를 읊은 노래를 ‘매화사(梅花詞)’, 혹은 ‘영매가(詠梅歌)’라 한다. 매화사 가운데 스승 박효관과 함께 시조집 <가곡원류(歌曲源流)>를 엮었던 고종 때의 가객 안민영의 연시조 매화사를 다시 읽는다. 모두 8수의 이 연시조는 매화의 고결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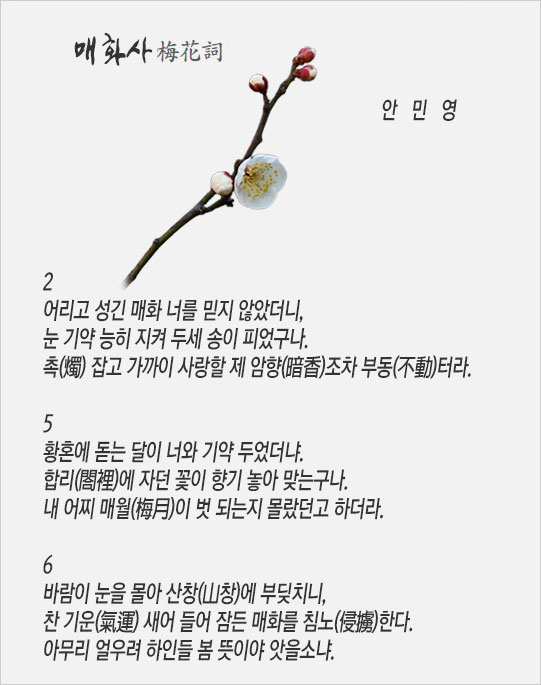
매화는 ‘눈 기약’의 꽃이다. 그 기약은 눈 속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이다. 비록 어리고 성긴 가지지만 매화는 그 기약을 능히 지키는 꽃이다. 매화는 또 화분에 잠들어 있다가도 그윽한 향으로 돋아오는 달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매월(梅月)'이 서로 벗이 됨을 몰랐다고 화자는 고백한다.
아직도 찬바람이 산창(山窓)에 부딪치는 날 새어든 찬 기운이 잠든 매화를 흔든다. 그러나 찬바람 따위로야 어찌 오는 봄을 막겠는가. 설사 그 바람이 매화 꽃잎을 얼린다 한들, 매화가 알리는 봄의 뜻과 그 기운을 어찌 빼앗을 수 있겠는가. 매화는 이미 당도한 봄의 전령(傳令)인 것이다.

안도현은 시 「3월에서 4월 사이」에서 그 봄의 맨 처음 알리는 꽃으로 매화를 노래한다. 매화는 3월에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에 있는 산서고등학교 관사 앞에서 핀다. 그리고 이어서 술도가 담장에선 산수유꽃이, 중학교 뒷산에선 조팝나무꽃이, 우체국 뒤뜰에선 목련꽃이 피는 것이다. [시 전문 텍스트로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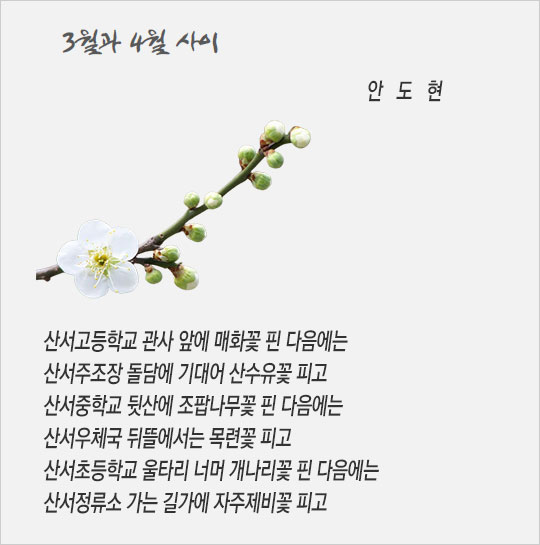
초등학교 울타리 너머에는 개나리꽃이, 정류소 가는 길가에선 자줏빛 제비꽃이 핀다. 안도현의 시에 피는 꽃들은 3월과 4월을 잇는 봄꽃들이다. 꽃들은 시간을 다투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는 봄과 여물어가는 봄, 무르익는 계절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안동 태화동 야산에 핀 매화꽃은 고작 두어 송이지만 말구리재 70사단 담장 앞에는 산수유가 기지개 켜듯 피는 중이다. 안동여고 뒤편 영남산 생강나무꽃은 이미 피었겠다. 옥련지 연못가에 선 매화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리라. 뒤늦게 오는 봄이 산 아래 동네에 차고 넘칠 때까지는.
2009. 3. 14.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9년 3월, 의성 산수유 마을 (2) | 2019.03.22 |
|---|---|
| ‘순박한 민얼굴’, 화전리도 변했다 (0) | 2019.03.21 |
| 성주 성밖숲과 백년설 노래비 (0) | 2019.03.19 |
| [사진] 의성 화전리, 산수유 꽃그늘이 지키는 마을 (0) | 2019.03.18 |
| 봄, 매화, 권주(勸酒) (2) | 2019.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