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찰밥과 새로 산 책들

정월 대보름이다. 아침 식탁에 찰밥과 나물이 올랐다. 아내는 찰밥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고 투덜댔지만, 나는 대추와 밤까지 넣어 지은 밥 한 그릇을 얌전히 비웠다. 나물은 고사리, 취, 냉이, 시금치 등이었는데 내가 늘 입에 올리는 아주까리 나물이 예전 맛이 아니었다.
나물 맛, 혹은 입맛
잎의 결이 살아 있으면서 담백한 풍미를 가진 게 아주까리 나물인데 어째 식감이 예전 같지 않았다. 너무 삶아 물러서 그런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나는 입에서 뱅뱅 도는 말을 삼켜버렸다. 아주까리 나물 맛이야 거기가 거길 터, 변한 건 내 입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저께 며칠 전 주문한 책 몇 권을 받았다. 퇴직 신청을 하면서 이제 책 사 읽는 것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매사가 뜻과 같지 않다. 퇴직은 불발, 어쨌든 또 한 해를 덤으로 살아야 할 터이니, 그때까진 예전처럼 가는 거라고 나는 우정 생각한 것이다.
이번에 산 책은 네 권이다. 지금 고공농성 중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창근이 쓴 <이창근의 해고 일기>와 영한 대역의 <데미안>, 사진집 <청량리 588>, 그리고 이병주 소설집 <예낭 풍물지>다. <해고 일기>와 <청량리 588>은 신간이지만 나머지 책은 좀 묵은 책이다.
새삼스레 <데미안>을 산 이유는 언제 새로 그걸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다. 중학교 때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 나는 소설의 자자한 명성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학적 감수성과는 거리가 먼 아주 단순한 성격의 절친 녀석 하나가 이 책에 매료되어 소설의 주요 내용을 입에 달고 다녔다.
내 책 읽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잠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녀석도 이해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정작 나만 새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데미안 따위는 잊어 버렸다. 온라인 서점에서 <데미안>을 본 순간 나는 사춘기 이후, 이 소설에 진 빚이 있다는 걸 기억해 낸 것이다.

<이창근의 해고 일기>를 고른 이유는 굳이 뇔 필요는 없으리라. 내가 <데미안>에 대한 미련을 ‘빚’이라고 표현했듯 2015년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적잖은 사람들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청량리 588>은 눈빛에서 낸 사진집이다. 나는 작가(조문호)를 알지 못하지만 ‘30여 년간 사회 환경을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라는 이력에 끌렸다. 무엇보다 사진집으로서는 너무 ‘착한’ 가격이어서 나는 이 책을 골랐다. 권당 수만 원을 호가하는 사진집을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말이다. 유명한 집창촌이었던 ‘청량리 588’에 대한 흥미도 물론 한몫을 했다.

이병주의 중편소설 <예낭풍물지>를 고른 것은 얼마 전 다녀온 가족여행의 낙수 때문이다. 1박 2일의 통영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이 동피랑 마을이었다. 아니 마을 꼭대기 정자에서 내려다본 통영 시가지의 풍경이었다.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과 좁은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잠깐 통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돌아와 사진을 뒤적이다가 나는 문득 고교 시절에 읽었던 소설 ‘예낭풍물지’를 떠올렸고, 예낭이 어쩌면 ‘통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까닭이다.
70년대 초반에 형이 정기 구독하던 잡지 <세대(世代)>에 실렸던 소설 ‘예낭 풍물지’를 떠올리고 혹시 싶어서 온라인 서점을 검색했더니 거짓말처럼 단행본 <예낭풍물지>를 팔고 있었다. 이 소설에 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만 ‘예낭’이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뿐이다. 소설을 읽고 나는 동피랑 마을과 도시 통영 답사기를 쓸 것이다….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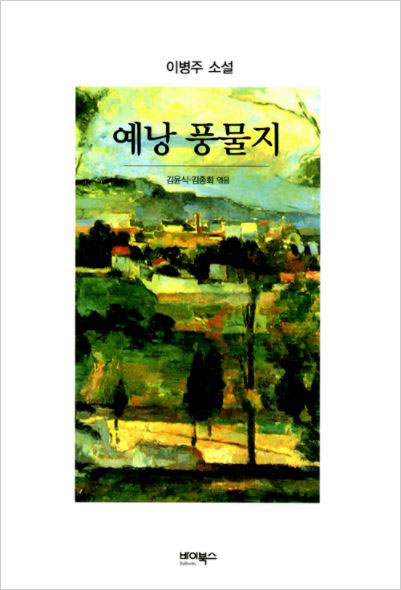
나머지 책은 지난해 연말에 산 책이다. 뜬금없이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을 산 것은 그걸 반값으로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뜬금없이’라고 말한 것은 새삼스레 지금 그걸 읽어 어쩌자는 거냐는 뜻이다. 설사 읽는다 한들 그걸 얼마나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냐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값싸게 사긴 했는데, 열어보니 평균보다 작은 활자가 빽빽이 들어차 있어 읽기도 전에 기가 질리는 느낌이 있었다. 보나 마나 저 책은 두어 번 열었다가 덮고 하다가 서가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기 쉽겠다. 이태 전인가 산 <이론과 이론 기계> 꼬락서니가 된다는 얘기다.
<아버지는 그렇게 작아져 간다>는 아들이 기록한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이다. 나는 그와 비슷한 경험조차 없지만 어쩌면 자신이 어느 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은 느낌에 망설이지 않고 산 책이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다가 멈추고 말았다. 글쎄, 이유는 내 실낱같은 ‘인내력’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책은 어쩌다 보니 뒷날 작가의 부음과 관련하여 몇 자 적었다. [관련 글 : <아버지는 그렇게 작아져 간다>의 작가 이상운 떠나다]
어느 날부터 책 읽기가 순조롭지 않아지고 있다. 엔간히 흡인력 있는 내용이 아니면 중간에 멈추면 또 한동안 잊고 지낸다. 그러다 다시 읽기 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이미 읽은 내용은 희미하게 희석되어 있다. 그러니 한 권을 내처 읽어내는 게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그나마 <그들의 손에 총 대신 꽃을>은 열심히 읽었다. 영화 <얼음 강>을 연출한 영화감독 민용근이 전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야기’인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국가와 사회의 야만이 어떤 얼굴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을 읽고 나면, 서평을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언제쯤에 이걸 마저 읽어 낼 수 있을는지…….[관련 글 : 병역 거부, 우리 안의 ‘편견’과 ‘낯섦’을 넘어]
이문구의 연작소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다. <관촌수필>을 읽고 이 작가의 저력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굳이 찾아서 산 책이다. 그런데, 역시 차일피일 시간만 죽이고 있다. 문득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종의 지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는 좀 쓸쓸해지기도 한다.
책 읽기도 예전 같지 않다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여유가 있는 시간은 대부분을 아무 일도 못 하면서 궁싯거리고 있는 거니. 어쩌다 일을 찾아서 앉아도 거기 전념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지체도 역시 퇴화의 일부라고 인정해야 할까.
점심때도 찰밥을 먹었다. 여전히 아주까리 나물 맛은 그저 그렇다. 나는 우적우적 나물을 씹어서 목 너머로 보낸다.
2015. 3. 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말! <아깝다, 학원비!> (0) | 2021.04.01 |
|---|---|
| <무소유>를 다시 읽으며 (1) | 2021.03.24 |
| 남자는 가라,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고픈 공구책 (0) | 2021.02.21 |
| 그래도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0) | 2021.02.07 |
| 김주대 시집 <그리움의 넓이> (0) | 2021.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