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두 권, 이규배와 김주대 시집

모처럼 책 몇 권을 샀다. 결제를 하자말자 온라인 서점에서는 내가 다시 ‘실버회원’이 되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서점에서야 내가 산 책의 양으로 회원등급을 매긴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게 내가 결제한 돈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 따로 유감은 없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프란츠 파농의 저작 <대지의 저주 받은 사람들>, <버자이너 모놀로그> 개정판,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조지 오웰의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다 시집 두 권이다. 오래 전에 찜 해 두었다가 뒤늦게 구입하는 김주대 시집 <나쁜 사랑을 하다>와 김 시인이 최근 소개한 이규배 시집 <아픈 곳마다 꽃이 피고>다.
언젠가 김주대 시인에 대해서는 엉성한 글(이웃 시인들-김주대와 이대흠)을 쓴 바 있다. 사실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실 시에 대한 내 이해는 얄팍하기 짝이 없다. 고작 문학 참고서류의 해석에 간신히 토를 붙이는 수준이니 말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시 말고는 시도 거의 읽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를 좀 읽어야겠다는 기특한 생각이 든 것은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무슨 ‘천형(天刑)’ 같은 것일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 ‘-였다’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생각이 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가 제대로 알아주지도, 읽어주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견뎌냈을, 주인 없는 언어와 함께한 고통스러운 ‘연금(鍊金)’의 시간을 나는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 읽기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소설처럼 달아서 곧장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짬을 내어 한 편씩 읽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시를 읽는 게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워낙 팍팍한 탓이다. 한 편의 시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네 삶은 여유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탓이다. 무어 그리 대단한 일을 하며 사는 것도 아니건만 자투리나마 시간 내는 일조차 만만치 않은 것이다.
독자는 드물고 시집은 팔리지 않는다. 그래도 시인들은 시를 쓴다. 함민복 시인은 자신의 시를 ‘쌀 두 말’과 ‘국밥 한 그릇’과 ‘굵은 소금 한 됫박’으로 비유하면서 시로 쓰는 ‘밥’을 긍정했지만(시 <긍정적인 밥>) 거기 못 미치는 시인도 쌔고 쌨다. 그래도 시인들은 시를 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연금의 언어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블에서 블로그 <사진을 읽어주는 시>를 열고 있는 김주대 시인(풍경과시)이 17년 만에 시집 <나쁜 사랑을 하다>를 낸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그리고 김 시인과 막역한 벗이라는 이규배 시인이 14년 만에 시집 <아픈 곳마다 꽃이 피고>를 상재한 것은 얼마 전이다. 김주대 시인의 블로그에서 이를 확인한 나는 그간 오래 온라인 서점의 보관함에 묵혀두고 있던 김 시인의 시집과 함께 이규배 시집도 함께 구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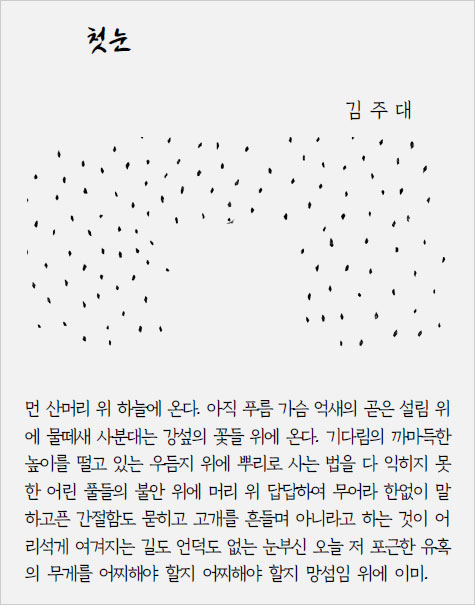
이규배 시인의 시집 출판기념회를 전하는 김주대 시인의 글(어떤 출판 기념회 - 아픈 곳마다 꽃이 피고)을 나는 아프게 읽었다. 4, 5명이 참여한 조촐한 그 모임에서 김 시인은 10분마다 이 시인의 시를 낭송했고, 그예 이 시인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 울음은 김주대 시인이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다던가.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주 조금 알 듯하다.
김주대 시인은 예의 글에서 “우린 만날 때마다 시를 얘기하곤 했지만 사실 만리 변방에서 도성의 기라성 같은 시인들을 부러워하며 세월이나 죽인 만년 무명의 시인들일 뿐이었다. 그나 나나 17년 14년 그런 긴 세월동안 시 한 편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으니 무늬만 시인이지 평범한 세속인에 지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나는 그가 예사롭지 않은 울림을 지닌 좋은 시인이라는 걸 안다. 설사 내가 그걸 모른다 한들, 시인은 그 존재 자체로도 우주고 세계가 아닌가.
나는 두 시인의 근작 시집을 두고두고 읽어볼 작정이다. 그래서 이 글은 두 시집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붙이는 걸로 맺으려 한다. 미욱한 사람의 한갓진 해석보다는 책 표지에 실리거나 알라딘의 책 소개에 실린 글이 훨씬 담백하게 시집을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두 <시집>을 말한다
▶ 이규배 시집 <아픈 곳마다 꽃이 피고>
그의 시가 때로는 처절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듯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음을, 또한 젊은 시절 품었던 절개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그가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긍정도,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결국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한 여름 밤의 꿈처럼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규배 시인은 낭만으로 덧칠하지 않은 날것의 현실을 문학적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그곳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알라딘 <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 김주대 시집 <나쁜 사랑을 하다>
시적 진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냐고 몇 번씩이나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물어볼 수 없었다. 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 물음은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일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내 질문은 시보다 사건에 관심을 둔 옹졸한 호기심이 되기 때문이었다. 시를 보다가 울었다. 그는 시의 진실과 시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시인이다. 너무도 슬픈 이 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적 진실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니까.
- 김별아(소설가) 시집 뒤표지에서
2010. 2. 4.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보름 아침, 책 몇 권 (2) | 2021.03.02 |
|---|---|
| 남자는 가라,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고픈 공구책 (0) | 2021.02.21 |
| 김주대 시집 <그리움의 넓이> (0) | 2021.02.06 |
| 세기를 넘는, 젊은 시인과 혁명가의 만남 (0) | 2021.01.08 |
| <작은책>과 사람들 (0) | 202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