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에서의 짧은 만남

어제는 부산 동래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 영남 연합 체육대회가 열렸다. 고교생(?)이 치르는 대회라기엔 대회 규모도 내용도 만만찮다. 우리 학교도 세 대의 전세버스 편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애당초 친선행사인 만큼 승부에 집착할 일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행사에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것 같았다.
영남권의 방송고는 모두 10개교다. 경북 4개교를 비롯하여 대구, 울산에 각 1개교, 부산과 경남에 각 2개교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 남녀공학인데, 부산의 동래고는 남학교, 경남여고는 여학교라는 점이다. 입장식에서 모두 남녀가 같이 들어오는데, 두 학교는 단출하게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만 들어왔다.
십 대 청소년도 아닌 나이 지긋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오는 광경도 좀 이채롭다. 한편으로 쑥스럽고, 한편으로 이 축제를 온전히 즐기겠다는 만학도들의 유쾌한 미소와 함성 속에 대회는 잔뜩 무르익었다.
연지와의 짧은 만남
본부석 맞은편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 학교 천막 아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다. 낯익은 여자애 하나가 배시시 웃으며 내 앞에 와서 쪼그리고 앉았다. 이럴 때엔 정말 당혹스럽다.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나는 그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결국 솔직하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가만있어 봐. 얘가 누구지?”
아이는 서운하다는 듯 잠깐 뽀로통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배시시 웃는다.
“연지예요.”
아이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이내 깨달았다. 아이는 지난 4월에 부산으로 전학을 간 우리 반 학생이다. 학년 초에 편입한 아인데 부산에서 통학한다고 했다. 기차로 구미에 와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학교에 온다기에 힘들어서 어쩌나 걱정을 했다. 옆에서 듣던 오지랖 넉넉한 50대 아주머니 급우가 역 근처에 산다며 하교할 때는 태워 주마고 자청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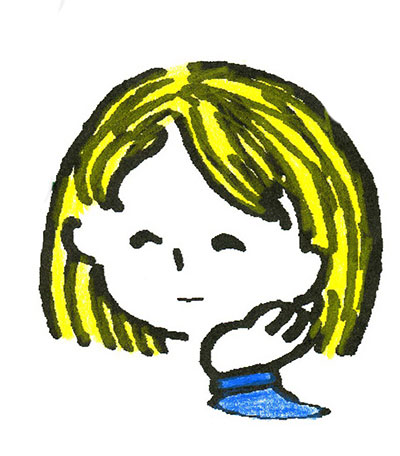
이 엽렵한 아주머니들은 점심도 시니어 그룹에 끼어 먹도록 주선해 주어서 담임으로서 걱정을 덜었다. 아이는 출석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격려해 주었다. 방송고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들 같은 20대 아이들이다. 시니어 그룹에 속하는 고령 학생들이 시기를 놓친 이들이라면 이들은 대부분 정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일까, 나이 많은 학생들의 특징인 ‘학업’에 대한 애착이 이들에게는 없다. 당연히 중도 탈락의 가능성도 크고, 학적을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나는 이들에게는 늘 부지런히 학교에 나와서 올해로 과정을 마치라고 신신당부하는 편이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학급의 나이 든 어른들처럼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는 차를 탈 물을 끓이는 등으로 아주머니들을 돕기도 했다. 4월 말께 다시 부산의 방송고에 자리가 난 모양이었다. 간다고 인사를 왔기에, 결석하지 말고 내년에는 꼭 졸업해야 돼, 간곡히 말하고 손을 꼭 잡아 주었더니 아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는 스물을 갓 넘었다. 학년 초에 편입한 것은 정규 과정을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게 분명하다. 얼핏 봐서는 그리 말썽을 부린 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방송고에서는 짐작만 할 뿐, 그런저런 사연을 구태여 묻지 않는다. 모두가 성인인 데다 따로 상담 시간을 둘 만큼 여유롭지 못한 탓도 있다.
아이가 비운 자리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또래의 남학생이 전입해 왔다. 직장을 옮기면서 학교도 옮겨온 것이다. 중도 탈락이 많은 방송고여서 전출입도 잦은 편이다. 최근에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안동으로 전출하겠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지가 부산으로 가고 나서 나는 이내 그 애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아, 그래. 연지구나.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선생님 찾느라 얼마나 돌아다녔다고요…….”
아이는 일순 새초롬해지는 듯하다가 이내 배시시 예의 미소를 짓는다. 날 찾는다고 꽤 애를 먹었다는 얘긴데 그걸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이다.
“학교 이름을 보고 찾아오지 그랬니?”
“그런데 반을 모르더라고, 참…….”
우리는 마주 보고 입을 벌리고 웃었다. 출석한 게 불과 서너 번이니 전학 후에 몇 반이었는지가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 뜻밖의 손님이 정말 반가웠다. 어른들이 주축인 행사니, 조퇴하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단 며칠간의 인연을 확인하느라 아이는 운동장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긴 여운
만남은 불과 2, 3분에 그쳤다. 무어 따로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는 마주 보며 학교가 재미있느냐는 둥 몇 가지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늘 그거다. 학교 열심히 다녀라.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다…….
“연지야, 정말 반가웠다. 찾아와 줘서 고맙고. 학교 열심히 다녀서 내년에는 졸업하는 거야. 알고 있지? 미루면 미룰수록 늦어지는 거.”
“알아요, 선생님.”
나는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고 내 눈길을 피하지 않고, 아이도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아이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이도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꾸벅하고 인조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가로질러 사뿐사뿐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량없이 애틋해졌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는 우리의 만남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 거였다. 그래서 아이는 운동장에 나왔고, 나와 짧은 재회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나는 잠깐 가슴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가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데는 어떤 형태로든 ‘사연’이 있었을 거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그러했듯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문제아로 찍혀 늘 꾸중이나 욕을 듣는 게 일상이었을 수도 있다. 고등학생이라 해도 아이는 아이다.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내 ‘관심’이 아이를 땡볕의 운동장으로 불러낸 것이다.
경력이 오랠수록 교사가 저지른 오류는 더 많을 수 있다. 아이를 보내고 나서 잠깐,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저지른 무관심과 방임을, 아이들에게 주었을지 모를 상처와 아픔을 생각했다. 참, 죄가 많구먼. 나는 혼자서 우정 그렇게 중얼거렸다. 떠날 날을 견주고 있는데 교단에서 보낸 시간의 갈피마다 돌아봐야 참회의 제목들은 여전히 쌓여 있는 것이다.
2012. 6. 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교단(1984~2016)에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들, 광산 폐기물로 오염된 낙동강을 탐사하다 (0) | 2020.08.04 |
|---|---|
| 이웃 아줌마들을 위하여 (0) | 2020.07.24 |
| 그들만의 커뮤니티, 광고 두 개 (0) | 2020.05.31 |
| ‘일베’와 우리 아이들 (3) | 2020.05.23 |
| 두 고교생의 죽음 (0) | 2020.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