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일가의 생계를 짐 지고 살아가는 ‘가장’

‘어버이날’이다. 이날이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뀐 게 1973년부터라고 하는데 나는 그즈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 내 기억 속에 여전히 5월 8일은 ‘어머니날’일 뿐이니 거기 굳이 ‘아버지’를 끼워 넣을 일은 없는 것이다.
그 시절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비길 수 없을 만큼 ‘지엄’한 존재였다.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말 그대로 ‘가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었다. 굳이 그들을 기리는 날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족이거나 ‘불경(不敬)’에 가까울 만큼. 아파트 베란다에서 명멸하는 담뱃불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가장에게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 외롭고 고단한 가장의 삶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와는 또 다른 애잔한 마음의 파문을 나는 어쩌지 못한다. 일찍이 고려 시대의 민중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그것에 비길 수 없다’라고 노래(‘사모곡’)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호미라면 어머니의 그것은 ‘낫’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같은 어버이건만 자식들과의 친밀도와 세정(細情)에서 어찌 아버지를 어머니와 비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전근대적 가부장으로서의 지엄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아버지는 고독한 존재였던 것 같다. 그 시대의 가장은 가족의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대소사에 대한 책임을 잔뜩 짐 져야 했다. 마을과 문중 등 지역과 혈연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그들의 몫이었다.
무겁고 고단해도 그들은 아무에게도 그것을 내색할 수도 없었다. 요즘 같으면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를 합창해 주기도 하겠지만 그 시절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감히 가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불경한 일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유난히 술과 유흥을 즐기고 주사가 심했던 것은 어쩌면 그런 까닭이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술에 탐닉하고 취하면 통과의례처럼 부리곤 했던 주정은 가슴을 내리누르는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넘어서는 그들만의 생존 전략은 아니었을까.
흐르는 세월이 ‘아비’를 ‘아빠’로 만들었다. 지엄한 가장의 권위와 광휘(光輝)는 간곳없고, 남은 것은 고단한 삶에 지친 우울한 중년의 초라한 모습이다. 이 시대의 가장이란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 와서는 역시 엽렵한 마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는 명목상의 ‘가장’일 뿐이다.
세월, ‘아버지’에서 ‘아빠’로
우스개로 남편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요,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웬수 덩어리’라 하지 않는가. 이사 갈 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불 위에 앉아 있거나’, ‘먼저 이삿짐 차량에 타고 있거나’, ‘애완동물을 껴안고 있어야’” 하는 게 오늘날 가장의 모습이다.
예전의 영광을, 그때의 지엄한 권위를 잃었다고 해서 아비가 가장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는 일터로 나가야 하고 일가의 생계를 걸머지고 있다. ‘일하는 아내’를 둔 덕분에 가사나 육아의 일부를 군말 없이 담당해야 하기도 한다. 시대에 따른 변화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 시대의 아비들은 거기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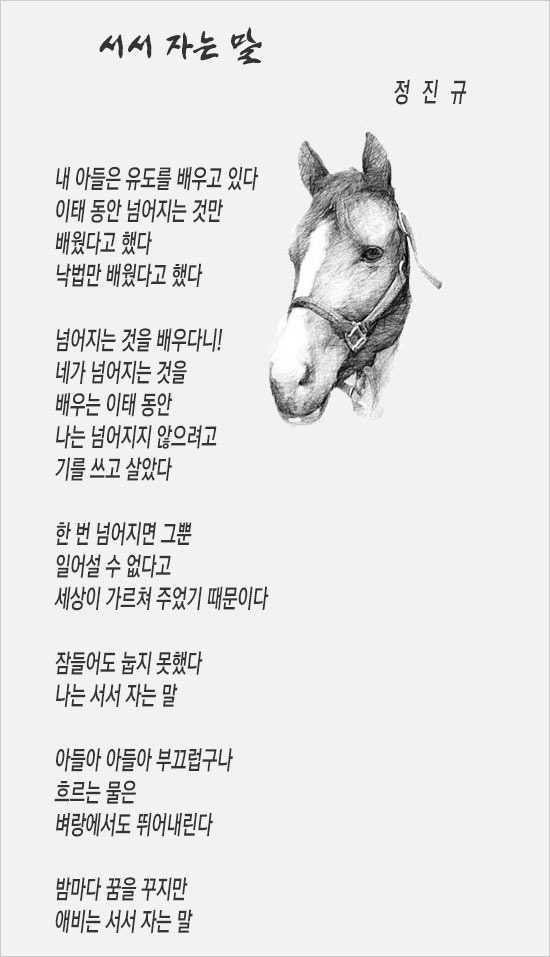
일가의 생계를 짐 지고 살아가는 ‘가장’을 일러 정진규 시인은 ‘서서 자는 말’이라 불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워서 잔다. 그러나 일가의 고단한 삶을 등에 진 가장은 잘 때조차 눕지 못한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잠자다 여명의 새벽을 서서 맞이한다.
시 ‘서서 자는 말’은 일찍이 저 가장의 고독과 비애를 노래한 시다. 80년대의 끝, 해직 무렵에 나는 그의 시를 처음 만났다. 거짓말처럼 출근할 일이 없어진 어느 날에야 나는 비로소 그가 노래하는 ‘아비’의 자리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었다. 새벽녘에 귀가해 잠든 아내와 어린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열린 창밖으로 쏟아지던 9월의 달빛을 지금도 기억한다.
서서 자는 말, 고단한 아비의 삶
아들은 유도를 배운다. 다른 말로 그것은 ‘넘어지는 법’[낙법(落法)]을 배우는 운동이다. 아비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아들이 유도를 배우는 동안 아비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아야 했다. ‘한번 넘어지면 그뿐’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이다. ‘흐르는 물은/벼랑에서도 뛰어내’리는데, 아들 앞에 아비는 자신의 고단한 삶이 부끄럽다. 그게 아비의 삶이다.
나는 아비로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야 비로소 선친의 삶을 떠올렸다. 돌아가신 지 어언 25년이 지났으니 당신께서는 이미 흙이 되셨으리라. 당신께선 간암으로 세상을 버렸다. 1985년, 내가 임용된 이듬해였다. 아버지의 초상은 그해 여름에 뵈었을 때의 초췌한 모습으로 내게 남아 있다.
병마는 아버지의 두꺼운 몸피를 아주 간단히 무너뜨렸다. 급격하게 체중이 줄고, 쇠약해진 당신의 모습, 후줄근한 엷은 베이지색 여름 양복을 걸친 당신의 실루엣은 지금도 아프게 내게 다가온다. 첫 봉급을 타고 사드린 내복 한 벌이 막내아들이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게 시방도 내내 마음에 밟혀서 나는 아버지께 양복 한 벌 해 드리지 못한 자신을 아직도 자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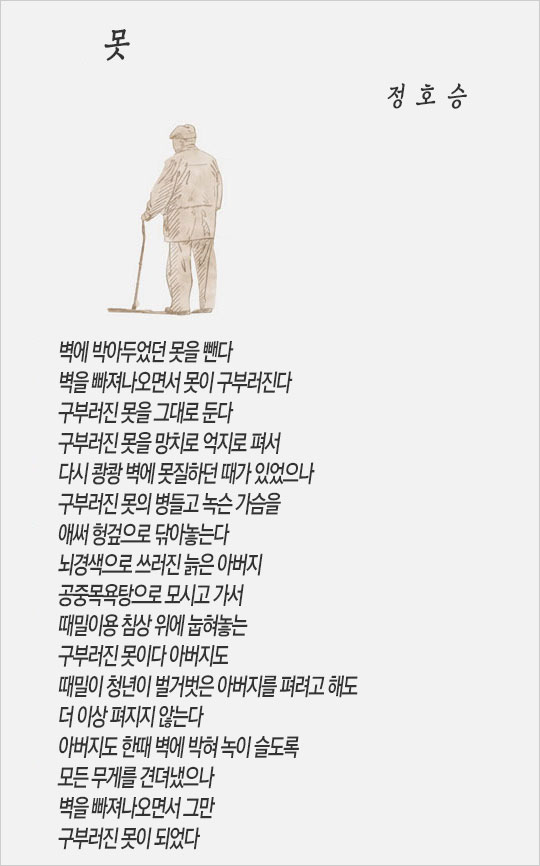
얼마 전에는 정호승 시인의 시 ‘못’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 노년의 ‘가장’, 아버지를 생각했다. 시인은 벽에 박은 못을 빼다가 구부러진 못을 늙고 병든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공중목욕탕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은 아버지는 ‘구부러진 못’이다.
무게를 견디다 ‘구부러진 못’의 이름, ‘아버지’
때밀이 청년이 ‘펴려고 해도 / 더 이상 펴지지 않는’ 아버지는 한때는 모든 무게를 견뎌온 못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구부러진 못’이 된 것이다. 올해 회갑을 맞는 시인의 부친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가. 구부러진 못이라도 좋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나 잘 벼려진 튼튼하고 야무진 못일 때가 있었다. 그 못은 온 가족의 바람벽 높이 단단하게 박혀 온갖 무게를 견뎌내면서 한 집안을 건사했다. 자신이 흔들리거나 부러지면 일가의 삶이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것. 못은 쇠심에 가해지는 온갖 장력을 견뎌내며 한 집안의 안녕을 지켜온 것이다. 하기야 아버지만 못이랴. 어머니가 견딘 인고의 세월도 다르지 않으리라.
어버이가 계시지 않은 어버이날, 나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가 지내온 ‘서서 자는 말’의 세월을, 결국은 ‘구부러진 못’으로 마감한 한 생애를 추억한다. 돌아가신 어버이 대신, 우리는 며칠 전 처가에 들러 장모님을 뵙고 왔다. 장인어른 대신 한 집안을 건사해 온 장모님도 이제 ‘구부러진 못’이 되셨다. 구부러진 몸으로나마 남은 세월을 편히 쉬실 수 있다면 좋겠다.
아침에 병원에 들러 혈압을 재고 약을 타 왔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뭐, 괜찮긴 한데요. 썩 개운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 어디 아픈 곳은 없지만 ‘쾌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유 없이 가끔 팔이 아프고, 이명인지 귀에서 나는 소리가 한 번씩 어지럽다. 아이들은 장성했지만, 아직 나는 여전히 서 있어야 한다. 내가 진 짐의 무게를 가늠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아직 벽에 박혀 있어야 한다. 언젠가는 벽을 빠져나오면서 ‘구부러진 못’이 될 터이지만.
오기택이 부른 ‘아빠의 청춘’을 듣는다. 이 코믹한 노래에 담긴 것은 노년의 위안이다. 스러지는 꿈과 청춘을 놓지 않으려는 안쓰러운 안간힘이다. 그러나 거기에 무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노욕은 담겨 있지 않다. 자신의 현재를 처연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무심 때문에 노래 속의 ‘원더풀’과 ‘브라보’는 애교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저 유행가가 우리 자신의 노래가 되는 어느 훗날의 세월을 떠올리면서 어버이날 아침, 우리는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넣는다.
2010. 5. 8.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안의 고서 몇 권 …, 거기 남은 선친의 자취 (8) | 2023.05.24 |
|---|---|
| ‘4·19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기록물’,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6) | 2023.05.22 |
| [4·19혁명 59돌] 미완의 혁명과 ‘노래’들 (2) | 2023.04.19 |
| 다시……, ‘4·16 세월호 참사’ 여섯 돌이 온다 (2) | 2023.04.16 |
| 급식 총파업 … 고교생의 ‘응원과 공감’의 대자보 (4)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