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두 번째 폭설 뒤의 매화


밤새 눈이 푸짐하게 내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파트 주차장의 자동차 지붕에 좋이, 한 뼘가량의 눈이 마치 시루떡 켜처럼 쌓여 있었다. 겨울에 눈이 드문 지방, 봄인가 싶었는데 3월의 두 번째 폭설이다. 오늘이 춘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조간신문을 받아보고서다.
춘분 날, ‘설’은 녹고 ‘매’만 남은 설중매(雪中梅)
어제 산에 다녀오는 길에서 산 아래 전자 공장 마당에 핀 매화 두어 송이를 만났다. 그 며칠 전부터 봉오릴 맺고 있었지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개화를 기대하지 못했었다. 반갑게 찍은 사진 몇 장을 벗에게 보냈더니 오늘에야 그걸 읽은 벗 왈, “이 매화, 오늘은 설중매로 살아야 할 듯”이라는 답을 보내왔다.
아, 그렇다. ‘설중매(雪中梅)’! 그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두어 달째 낫지 않는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렀더니 ‘설’은 녹고 ‘매’만 남아 있었다. 그나마 가지 곳곳에 얼다 만 눈이 엉켜 있는 게 눈 소식을 전해줄 뿐이었다.



이 사진들이 오늘 찍은 매화다. 꽃 주위엔 눈이 없지만, 가지에 붙은 눈만으로도 너그럽게 ‘설중매’라 여겨주면 좋겠다. 매화는 아직 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한파 속에 피어나는 매화의 기상을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는 이유다.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를 설중매라 하여 기리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매화를 모르면서 ‘매화사’를 가르친 초임 시절
나는 초임 시절에 여학교에서 고1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안민영(安玟英)의 ‘매화사’를 가르쳤다. 어이없게도 그때만 해도 나는 매화를 알지 못했다. 매화가 어떤 꽃인지도 모르는 교사가 가르친 ‘매화사’는 어땠을까. 내가 매화를 알게 된 것은 마흔이 다 돼서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래도 나는 매화의 그윽한 향을 ‘암향(暗香)’이라고 한다면서 시치미를 떼었다. 마치 그 향기를 제대로 아는 척하면서 주절댄 내게서 ‘매화사’를 배운 그 열일곱 살 여자애들은 올에 쉰한 살이 되었다. 나와 띠동갑인 이 중년 부인들과 같이 나이 들면서 우리는 가끔 삶의 장면들을 나누기도 한다.
나는 왜 매화를 몰랐을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것은 젊은이들이 그러하듯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무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젊음이란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벗과 이성, 술과 유흥 따위에 쏟기에 바쁜 것이다. 꽃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는 ‘한가한 청춘’이 어디 있겠나 말이다.
요즘처럼 꽃나무가 흔하지 않았던 탓도 있을 것이다. 사는 게 힘겹던 시절이라 꽃과 나무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요즘은 도심의 공원과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에도 조경수로 매화나 산수유를 심는다. 우리 동네에도 매화를 심은 집과 가게가 여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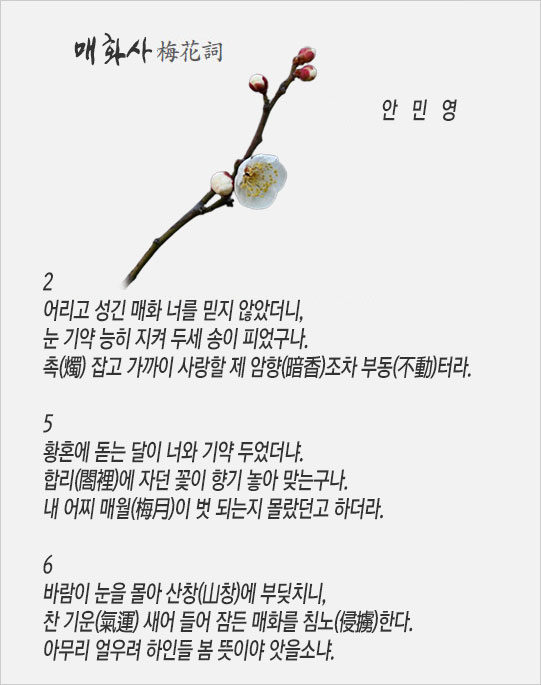
찍어온 매화 사진을 뒤적이면서 다시 1980년대 큰아기들에게 가르친 매화사 몇 수를 다시 읽어본다. 2009년만 해도 둘째 수가 좋더니 오늘은 여섯째 수가 그때와는 다른 울림으로 다가온다. [관련 글 : 매화, 서둘러 오는 봄의 전령]
안민영은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치는 바람, 그 찬 기운으로 매화를 침노하지만, 꽃 피운 매화의 ‘봄 뜻’을 어찌 빼앗을 수 있겠느냐고 노래했다. 김윤아의 노래 ‘봄이 오면’을 들으면서 이 사군자의 으뜸 꽃이 전하고자 한 ‘봄 뜻’을 무심히 헤아려 본다.
2018. 3. 21.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삿갓, 구비시(口碑詩)의 창조자 (0) | 2020.03.24 |
|---|---|
| 거기 ‘은빛 머리 고승’들, 무더기로 살고 있었네 (0) | 2020.03.20 |
|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0) | 2020.03.17 |
| 보성 차밭 구경 (1) | 2020.02.06 |
| 강화도, 안개, 사람들 (0) | 2020.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