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감꽃, 홍시, 곶감, 그리고 까치밥까지





곳곳에서 만나는 감나무마다 가지가 휘어질 듯 주렁주렁 감이 달렸다 싶더니 올해는 감이 풍년이란다. 일전에 아내가 처가에 가더니 감을 한 광주리 얻어왔다. 팔순의 장모님께서 몸소 장대로 딴 감이다. 아내는 그놈을 곱게 깎아 대바구니에 담아 베란다에 내어놓았다.
그게 제대로 말라 온전한 곶감이 될지 어떨지, 아내는 미덥지 않아 한다. 볕이 모자라거나 날씨가 궂어서 감 표면에 곰팡이가 피어 못쓰게 된 경험이 한두 해가 아니다. 제대로 말라 뽀얗게 분이 나는 곶감의 달콤한 감칠맛을 기대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다.
감은 우리나라에선 가장 흔한 과일이다.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토담 가까이 감나무 한 그루씩은 갖추고 사는 게 우리네 시골 풍경이 아닌가. ‘단과(丹果)’라고도 하는 감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에서 재배된다. 감의 생산량도 중국이 세계 최고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뒤를 잇는다.
덜 익은 감에는 디오스 푸린이라는 타닌(tannin)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이 떫은맛의 주범이다. 타닌은 많이 섭취할 경우,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마땅한 주전부리가 없었던 어린 시절, ‘땡감’으로 허전한 속을 달래다 보니 아이들은 변비를 피해 갈 수가 없다. 이웃의 내 동무 동생이 자주 그런 변비로 고생했는데 그 어머니는 연신 볼기짝을 때려가며 꼬챙이로 아들의 뒷구멍을 파내곤 했다.
감은 익으면 단맛이 나는 단감, 완전히 익혀서 먹는 홍시(紅柿), 그리고 말려서 먹는 ‘곶감[건시(乾柿)]’이 있다. 어릴 적에 나는 홍시가 ‘무시(무의 경상도 말)’처럼 사투린 줄 알았다. ‘시(柿)’가 감나무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국내 유명 감 생산지인 상주의, 곶감용으로 쓰는 길쭉한 모양의 떫은 감을 ‘둥시’라 하고 청도 특산의 씨 없는 감은 그 모양이 납작하다고 하여 ‘청도 반시’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도 ‘시’는 감이지만 ‘반시(盤柿)’가 한자어인 데 비해 ‘둥시’는 고유어에다 한자어를 붙인 형태다.
김준태가 노래한 ‘감꽃’

감꽃은 초여름 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피어난다. 들에 보리가 익어갈 때쯤 감나무는 비로소 짙고 두꺼운 잎사귀 속에 노란 감꽃을 탐스럽게 달기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점점이 떨어진 감꽃을 주워 먹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 별 모양의 꽤 단단한 꽃송이를 실로 꿴 감꽃 목걸이는 또 어땠는가.

‘단 넉 줄의 시에 영욕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가 압축되어 있다’(안도현)고 한 김준태의 시 ‘감꽃’은 어떤가. 시인은 셈을 배우던 유년의 기억을 모티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감꽃을 세던 아이는 자라서 침 발라 지폐를 세는 기성세대가 되었다. 유년 시절의 감꽃이 환기해 주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남루한가.
가을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익어가는 감으로 마을은 넉넉해진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떨어져 ‘초가 되어가고 있는’ 감 때문에 마을 골목길에선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시골에선 그만큼 흔해 빠진 게 감이었다.
시골에선 지천이었던 감은 그러나, ‘조율이시(棗栗梨柿)’라 하여 대추·밤·배와 함께 제수 과일의 말석(?)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다. 또 전래 민담 속에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 되어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최고의 주전부리 감이 되기도 한다.
박인로가 노래한 ‘홍시’
곶감은 마땅히 과일 구경을 하기 어려웠던 겨울철에 맞춤한 건강 보조 식품의 지위를 누렸다. 곶감에는 비타민A와 사과의 10배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다. 떫은맛을 내는 타닌 때문에 설사를 멎게 하는 효과가 있고 숙취 해소와 기관지 강화에도 좋다고 한다.
요즘 시중에는 ‘반건시’라 하여 아직 분(粉)이 나지 않은 붉은빛의 곶감이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어릴 적의 곶감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 거의 잿빛이 나는 놈이 열십자로 묶어놓은 짚 포장 안에 마치 엽전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곶감이 딱딱하여 노인들이 먹기가 쉽지 않다면 홍시는 껍질을 벗겨내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어 늙은이들에겐 최고의 간식이 되었다. 장독 위에 얹어두었다 서리를 맞아 빨갛게 익은 홍시는 그 선홍의 빛깔만으로도 식욕을 불러일으켰다. 노계 박인로의 시조 ‘조홍시가(早紅柿歌)’는 그런 홍시를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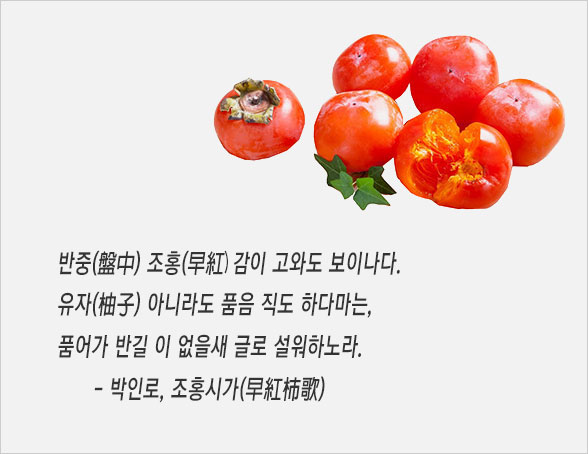
노계가 한음 이덕형을 찾았다가 대접하느라 내놓은 홍시를 보고 지은 노래다. 오나라 육적이 원술의 집을 찾았다가 주인이 내놓은 유자를 몰래 품 안에 숨겨 나왔다는 고사, 육적회귤(陸績懷橘)을 인용하여 ‘품어 가 섬길 이 없음’을 노래했다. 예나 지금이나 어버이는 자식의 봉양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익지 않은 감의 떫은맛을 없애기 위해 우리 어릴 적에는 감을 삭혔다. 돌확 같은 데다 물을 붓고 소금 간을 한 뒤, 거기 감을 담그면 며칠 후에는 떫은맛이 거짓말같이 사라진 삭은 감이 되는 것이다. 요즘은 단감이 워낙 널리 보급된 탓인지 아무도 감을 삭히지 않는다. 감 말고도 먹을 게 지천이기 때문이다.
감은 버릴 게 없다. 떨어진 감을 버려두면 초가 된다. 이런 원리로 익은 감을 발효시켜 감식초를 만들기도 한다. 중국 일부 지방과 우리나라에선 감잎을 말려 감잎차를 만들어 먹는다. 요즘은 감을 잘라서 말린 ‘감말랭이’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 오후, 경산에 사는 처제가 친정어머니와 언니를 초대했다. 와서 놀다 감을 좀 가져가란다. 빗속에 마을로 들어서는데 온통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감나무다. 잎을 죄다 벗고 앙상한 가지에 점점이 박힌 붉은 열매가 인상적이었다.
빗속에 우산을 받치고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었다. 외진 골짜기여서 아직 홍시가 된 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인근 청도의 씨 없는 감인 ‘반시’는 지역만 옮기만 씨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나 청도와 이웃한 처제 마을에선 반시도 제대로 자란다고 했다.
까치밥의 마음
동네 가장자리의 밭에선 배추와 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김장을 하려면 아직 차례가 멀었는데 배추밭을 바라보는 마음은 푸근하기만 하다.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쌀쌀해지리라 한다. 그렇다, 이제 겨울이 멀지 않은 것이다.
곧 서둘러 감을 따고 나면 나무에는 한두 알의 붉은 홍시만이 걸릴 것이다. ‘까치밥’이다. 먹잇감이 모자란 겨울을 견뎌야 하는 날짐승들을 생각해 우리네 조상들은 얼마간의 감을 따지 않고 남겨두었다. 고달픈 살림살이에도 날짐승까지 보듬었던 조상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윽하다. 요즘은 시골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까치밥을 남기는 마음이라면 더 무엇을 말하랴.
2012. 10. 28.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풍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경새재에 당도한 가을, 단풍 (2) | 2019.10.18 |
|---|---|
| 감 따기와 ‘곶감’ 만들기 (0) | 2019.10.17 |
| 영동의 비단강, ‘풍경’에서 ‘정경(情景)’으로 (0) | 2019.10.12 |
| 그 산사의 단풍, 이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네 (0) | 2019.10.04 |
| 의성 조문국(召文國) - 잃어버린 고대 왕국을 찾아서 (0) | 2019.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