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천면에서 베풀어진 2013 코스모스 축제


멕시코 원산인 코스모스 속 한해살이풀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는 이미 가을꽃의 대표 주자로 뿌리를 내렸다. 우리 고유어로는 ‘살사리꽃’.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을철 길가에 핀 꽃은 대부분이 코스모스였다. 하늘거리는 연약한 줄기에 핀 꽃은 화사하면서도 청초했다.
코스모스에 바치는 '헌사'들
그 연련한 빛깔, 그 청초함에 바치는 헌사도 착하다. 시인 윤동주는 “청초한 코스모스는/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시 <코스모스>)라 노래했고 “몸달아/기다리다/피어오른 숨결”이라 노래한 이는 이해인 수녀다. 시인 조정권은 “십삼 촉보다 어두운 가슴을 안고 사는 이 꽃을/고사모사(高士慕師) 꽃”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제 스승을 홀로 사모한다는 뜻’으로 부르는 ‘고사모사’는 코스모스의 음역(音譯)이다. 시인은 “함부로 절을 하고 엎드리는/다른 무리와 달리, 이 꽃은/제 뜻을 높이되/익으면 익을수록/머리를 수그리는 꽃”이라 하여 코스모스의 높은 뜻과 태도를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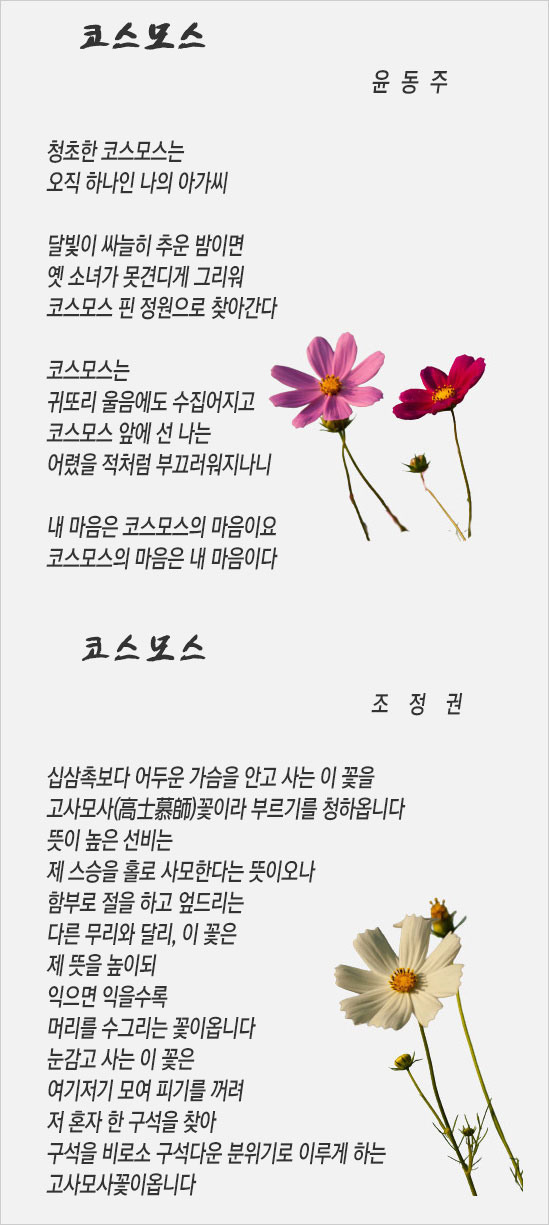






















코스모스는 가을꽃으로 알려졌지만, 기실은 6월부터 10월까지 핀다. 그러나 역시 코스모스는 가을에 핀 꽃이 제격이다.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서 9·10월에 코스모스 축제를 베푸는 까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스모스는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가느다란 몸피를 하늘거리는 게 본령이 아닌가 말이다.
경기도에선 파평과 구리에서, 강원도에서 삼척과 횡성, 전남에선 곡성, 경남에서는 하동과 진주 등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연다. 이미 지난달에 베풀어진 데(파평, 횡성, 곡성)가 있는가 하면 10월 초순까지 이어가는 데도 있다.
제6회 장천 코스모스 페스티벌
구미시 장천면에서 여는 ‘코스모스 페스티벌’(생뚱맞게 '페스티벌'은 또 무엇인지.)은 올해 여섯 번째라고 했다. 인터넷의 장천면 누리집을 살펴봐도 정작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차일피일하다가 어제 장천을 다녀왔다. 장천면 한천 변에서 베풀어지는 축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되어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다.
파장이어서인가, 행사장은 붐비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축제판이란 게 그렇지 않은가. 주 행사장인 천변의 공터에는 여러 동의 천막을 세웠는데 모두가 음식을 파는 집들이다. 그리고 주 무대 쪽엔 사회자가 촌로와 부녀자들을 상대로 민망한 재담을 늘어놓고 있었고 무명의 여가수가 민요를 간드러지게 부르고 있었다.
축제를 베풀고 있긴 하지만 코스모스 꽃밭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다. 코스모스는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둑길 양옆으로 펼쳐진 군락과 행사장 옆 시내의 꽤 큼직한 군락이 다였다. 꽃의 빛깔도 분홍이 중심이고 진홍빛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어쨌거나 꽃 앞에선 사람들은 단순해지고 착해진다. 사람들은 꽃밭에 서거니 앉거니 하면서 연신 사진을 찍는다. 디카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찍는 사람이 반반이다. 꽃 속에 묻히니 어쨌든 어른들도 그리 미워 보이지는 않는다. 삶에 찌든 얼굴들을 꽃의 표정과 어찌 비길까만 그래도 꽃 속에서 입을 벌려 웃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해 보였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꽤 선선했는데,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내리쬐는 햇볕이 따가웠다. 코스모스를 보러 왔지만, 어찌 코스모스만 보겠는가. 객쩍게 끼어든 황화 코스모스, 연파랑 진분홍의 나팔꽃, 별 모양의 유홍초도 살랑대는 코스모스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었다.
행사장 너머로는 아직 황금빛에는 이르지 못한 들이다. 노랗게 물든 들판을 배경으로 코스모스를 렌즈에 담았던 몇 해 전의 가을을 막연히 떠올린다. 다음 주말쯤에는 들판이 누렇게 바뀌어 있을까. 다음 주말을 기약하고 귀갓길에 오르긴 하지만, 올지 말지는, 그때 돼 봐야 알 일이다.
2013. 10. 4.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선산(구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진] 금오산 벚꽃 길과 금오천 인공 물길 (0) | 2019.09.29 |
|---|---|
| 독립운동가의 아흔셋 친손자는 왜 1인시위에 나섰나 (0) | 2019.09.21 |
| ‘거꾸로 가는’ 구미… 독립 운동가 동상은 왜 창고에 방치됐나 (4) | 2019.09.09 |
| 879억 들여 만든 애물단지 ‘새마을 공원’... 이게 끝이 아니다 (0) | 2019.07.24 |
| 구미, 유니클로 매장 앞 ‘일인시위’ (0) | 2019.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