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으며 작물과 함께 농사꾼도 ‘성장’한다

오랜만에 장모님의 비닐하우스에 들렀다. 여든을 넘기시고도 노인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척스레 몸을 움직여 한 마지기가 훨씬 넘는 밭농사를 짓고 계신다. 북향의 나지막한 산비탈에 있는 밭에는 모두 세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두 동은 나란히 나머지 한 동은 맞은편에 엇비슷하게 서 있다.
예년과 같이 주가 되는 작물은 역시 고추다. 해마다 우리 집을 비롯하여 경산과 부산에 사는 동서, 처고모 댁의 김장용 태양초가 여기서 나는 것이다. 키가 훌쩍 큰 품종인데 가운뎃손가락 굵기의 길쭉한 고추가 벌써 주렁주렁 달렸다. 유독 장모님 고추만이 인근에서 가장 빠르고 굵고 실하게 열린다고 아내는 자랑인데, 아마 그건 사실일 것이다.
오른쪽 비닐하우스 위쪽은 참깨를 아래쪽은 고추와 가지, 적상추 따위를 갈아놓았고, 왼쪽 하우스 앞은 고구마와 오이가 심겨 있다. 요즘 넓힌 농로에 면한 비탈에는 박과 호박 덩굴이 우거져 있다. 오른쪽 하우스 뒤에는 토란과 들깨가, 하우스 안에도 고추 말고도 열무 같은 채소가, 입구엔 토마토도 두어 그루 자라고 있다.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만족감인데, 더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느낌 같은 것이다. 정작 내 손길 하나 닿지 않은 작물들인데도 마치 내가 지은 농사처럼 느껴지면서 성취감이 목구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다. 하우스 안의 열기와 내리쬐는 땡볕에 이마에 땀이 방울져 흘러내려도 벅찬 느낌은 가슴을 가득 채운다.
덩굴 속에 하얀 살결을 드러내고 숨어 있는 박 덩이, 자줏빛 꽃을 피우며 익어가고 있는 가지, 하우스 속에서 살이 오르고 있는 고추 따위를 바라보는 기분은 단순하고 간명하다. 자신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나눈 대화다.
“덥지 않았우?”
“아니, 정말 행복했어.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라고 할까…….”
여물어가고 있는 농작물이 주는 느낌을 ‘치유(healing)’라는 하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미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농업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세속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농업과 농사가 보여주는 정직성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하면 저 밭농사를 우리가 지을까?”
“괜찮지 뭐. 그런데 우리 텃밭에 농사지은 지도 꽤 오래됐네…….”
그렇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텃밭을 가꾼 게 2010년이다. 마지막으로 쓴 텃밭 일기에서는 우리 내외의 대화는 이랬다.
“내년에도 할 거야?”
“당신은 어때요? 고추는 조금만 심고 고구마를 좀 많이 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내년에 다시 생각해 보지, 뭐…….”
노동이 이룩해 내는 가치 인식, 그리고 성장
그 ‘내년’에 우리는 새로 텃밭을 얻지 않았다. 그리고 한 해 뒤 우리는 안동을 떠나 이곳으로 옮아왔다. 4년……. 자투리 시간에 거짓처럼 하는 농사일이었지만, 우리는 텃밭과 꽤 멀어진 셈이다. 기껏해야 장모님을 뵈러 와 이 밭을 스쳐 가면서 희미하게 옛일을 더듬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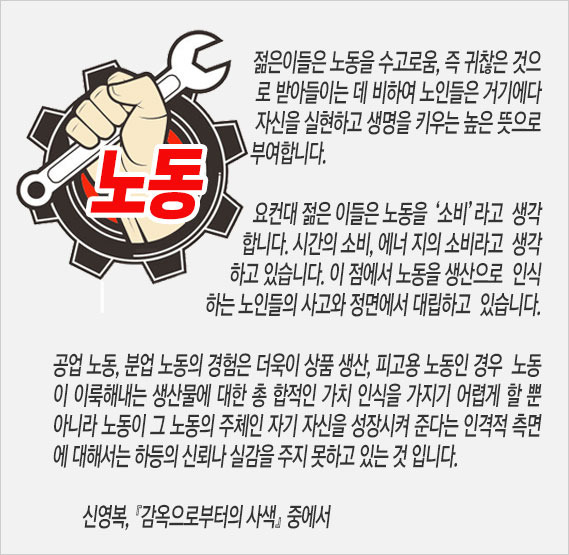
고작 흉내만 내는 수준이었지만 몇 해 동안의 텃밭 농사를 통해 나는 농사짓기가 왜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무하고 치유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듯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는 농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농사는 그것 자체로 현대의 공업노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취감을 선사해 준다.
신영복 선생이 갈파한 것처럼 그것은 ‘노동이 이룩해 내는 생산물에 대한 총합적인 가치 인식’을 제대로 가지게끔 하는 흔치 않은 노동인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노동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준다는 인격적 측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의성 탑리의 산 중턱에서 조그맣게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를 생각한다. 늘 밭에 가 있어 검게 그은 그의 얼굴과 팔뚝에서 쇠귀 선생이 말한 ‘성장’을 확인한다. 이르면 내년이다. 학교를 떠나면 우리 내외는 가끔 장모님의 밭을 가꾸며 퇴직 이후의 삶을 꾸릴 수 있을까.
2014. 7. 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텃밭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 반 고추 농사(Ⅰ) (0) | 2020.06.17 |
|---|---|
| [2017 텃밭 일기 ①] 기어코 농약을 치고 말았다 (0) | 2020.05.18 |
| 초농기(初農記), 첫 농사의 기록 (0) | 2019.06.28 |
| 조바심의 기다림, 백일 만에 ‘감자’가 우리에게 왔다 (2) | 2019.06.28 |
| 첫 수확과 호미, 이 땅 어머니들의 ‘노동’을 생각한다 (2) | 2019.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