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원칙 <한겨레>, 그러나 ‘모아 댄 워즈’는 뭔가

<한겨레>는 창간 때부터 한글 전용의 가로쓰기 체제로 출발하여 우리 언론의 지형을 바꾸어 온 진보 언론이다. 창간 주주로 <한겨레>의 창간을 기다리다가 1988년 5월 15일 집에 배달된 창간호를 읽으면서 자못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백두산 천지를 밑그림으로 목판 글씨로 새겨 넣은 <한겨레신문> 다섯 자는 마치 그 감격시대의 표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한겨레>가 창간된 뒤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존 신문들도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늦게 가로쓰기로 전환한 매체는 <조선>이었던 것 같다. 한글 전용도 대부분의 매체가 <한겨레>를 뒤따랐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과 <동아>는 기사에서 한자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자로 된 신문 제호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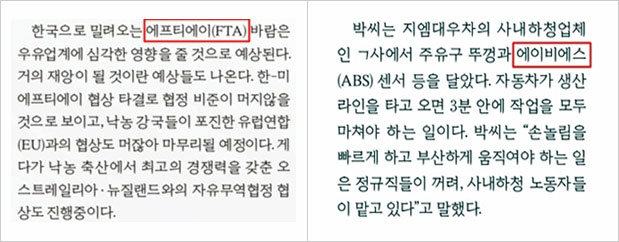
신생지 <한겨레>가 창간되면서 시도한 변화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서 대학생을 이를 때 ‘-군’이나 ‘-양’이라 하지 않고 모두 ‘-씨’로 쓴 게 인상 깊다.
그건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미성숙한 인격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던 우리 사회의 보수성에 들이댄 일종의 혁명적 호칭이 아니었나 싶다.
또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 아무개 여사’라 쓰지 않고, ‘부인 아무개 씨’로 쓴 것도 참신했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사에 이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에서 ‘권양숙 씨’라고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사’ 대신에 ‘씨’를 썼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의가 어긋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한겨레>가 ‘영부인’이나 ‘여사’를 대신 굳이 ‘부인’과 ‘씨’를 쓰는 것은 용어에서 나오는 ‘권위주의적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다. 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괄호 속에 ‘여’ 표시를 하지 않고) 두루 ‘씨’로 쓴 것도 호칭에서부터 남녀를 구별하는 시각을 피하자는 뜻이었다.
<한겨레>가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는 이런 원칙은 나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관행을 무반성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결국 <한겨레>의 표기 원칙은 신문 언어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었고, 우리말을 순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한겨레>의 표기 원칙, ‘한글만 쓰기’
<한겨레>의 표기 원칙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한글만 쓰기’다. 초기에는 더러 괄호 안에다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요즘 <한겨레>에서 한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한글만 쓰기’에 덧붙여 <한겨레>는 영자 표기도 일관성을 지킨다. 영자를 한글로 풀거나 설명 없이 단독으로 표기하는 일은 적어도 <한겨레>에는 없는 것이다.
한때는 기사 제목에도 영자 표기를 꺼리던 <한겨레>는 요즘은 좀 물러진 듯하다. 잘 알려진 시사용어의 경우에는 제목에 그대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원칙을 지킨다. YMCA를 ‘와이엠시에이’로, FTA를 ‘에프티에이’로, MBC를 ‘엠비시’로 표기하면서 괄호 속에 영자를 병기하는 방식은 여전한 것이다.
고집스럽게 한글만 쓰기를 고집하던 <한겨레>도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것일까. 어느 날부터 <한겨레>도 고정란의 제목에 영자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하기야 ‘어륀지’ 열풍이 지나갈 만큼 영어가 모국어를 압도하는 국제화 시대가 <한겨레>를 비켜 갈 리는 없다.
매주 목요일에 간행되는 ‘한겨레 매거진’의 이름이 ‘ESC’다. ESC라면 자연스럽게 컴퓨터 자판 맨 왼편 위에 있는 글쇠를 떠올리겠는데, 이 ‘잡지’의 성격을 고려해 그런 이름을 붙였단다. 그것까지는 좋다. 진보를 지향하는 이 젊은 신문이 그런 추세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한겨레>는 고정란의 이름도 고집스럽게 우리말로 붙여 왔으니 그쯤은 눈 감아 줄 수 있다.
<한겨레>의 고정란은 대개 칼럼인데, 여기 붙은 이름은 모두 평범한 우리말이다. 사내 칼럼으로 ‘아침 햇발’, ‘유레카’, ‘편집국에서’, ‘현장에서’, ‘한겨레 프리즘’ 등이 있고, 사외 칼럼으로 ‘세상 읽기’, ‘야! 한국 사회’, ‘세계의 창’, ‘삶의 창’ 등 대부분 쉬운 우리말이다.
그밖에 ‘우리말 칼럼’과 ‘백승종의 역설’ 등이 있고, 독자들을 자발적 기고를 싣는 독자란‘인 ‘왜냐면’도 있다. 심지어 다른 신문들이 ‘만평’, ‘희평’ 등으로 부르는 만평란도 ‘한겨레 그림판’이니 <한겨레>의 독자성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ESC’를 읽으면서 나는 잠깐 헷갈렸다. 이 한겨레 매거진의 내용은 좀 젊고, 세련되었다. 편집도 그렇거니와 거기 실린 내용은 가끔 내가 소화하기 거북한 게 많다. 한때 연재되던 만화를 나는 읽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금방 헤아리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러면서 나는 결국 스스로 ‘노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ESC’는 불과 8면에 불과한 별지다. 이 별지는 이름에 걸맞게 ‘VOL 118’이라는 형태의 호수를 달고 있다. 118호라는 얘긴데 그렇게 쓰는 게 트렌드(!)에 맞는 것이다. 요즘은 그래도 내가 볼 만한 내용들이 더러 나오는데 한때는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어 나는 대략 제목만 살피곤 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춘 건지 사진 관련 기사가 자주 실린다. 요리 기사도 빠지지 않는다.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6면에는 ‘이기적 상담실’이라는 상담 코너가 있고, ‘조진국의 모어댄워즈’와 ‘투쓰리풀카운트’라는 체육 관련 고정란(칼럼인 듯)이 있다.
문제는 6면, ‘more than words’?

7면의 주제는 ‘엔터테인먼트’다. ‘연예’도 그런 이름을 달면 한층 고상해지는 걸까. 7면에는 ‘너 어제 그거 봤어?’라는 제목의 가벼운 전문가 대담 형식의 주간 방송 비평과 ‘하니누리 놀이터’라는 제목으로 ‘만화 연상퀴즈’와 ‘시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이름의 시사 퀴즈가 실렸다.
문제는 6면이다. 나는 무심코 기사를 읽다가 한글로 쓴 ‘모어 댄 워즈’라는 고정란에 눈길이 머물렀다. 모어 댄 워즈? 영어도 짧은데다 센스도 무디어 빠진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이 혀를 찼다.
“참, 이래 써 놓으면 알아먹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인가 보네요.”
“‘more than words’로 쓰는 거지?”
“예, 맞아요.”
학교에서 동료 영어 교사에게 다시 물어봤다.
“노래 가사에 나온 것 아닌가요? ‘말 이상의 어떤 것’을 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나도 가끔 그 난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내용은 쉬 종잡을 수 없다. 조진국이라는 이는 작가라고 하는데 면이 전혀 없다. 글쎄, <한겨레>의 매거진을 읽으려면 이 정도의 감각과 트렌드는 갖추어야 한다는 뜻인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말만 써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막힌 사람은 아니다. 때로 우리가 쓰는 말속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걸 굳이 부인할 만큼 옹색하지도 않다. 그러나 내가 무식한 탓인지, ‘모어 댄 워즈(more than words)’는 여전히 긴가민가 싶을 뿐이다.
2009. 9. 1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가겨 찻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발 ‘보여지는’ 야구 중계는 그만! (0) | 2021.10.01 |
|---|---|
| 동생의 남편, ‘제부’인가, ‘박 서방’인가 (3) | 2021.09.20 |
| ‘길들여지다’는 ‘길들다’로, ‘잊혀진’도 이제 그만 (3) | 2021.09.07 |
| 이제, ‘짜장면은 짜장면이다’ (0) | 2021.08.31 |
| ‘미용실과 스카프, 양산 ’, 더는 ‘여성 전용’ 아니다 (0) | 2021.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