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남발, 도를 넘었다

“미국 ○○백화점에서 운 좋게 겟한 아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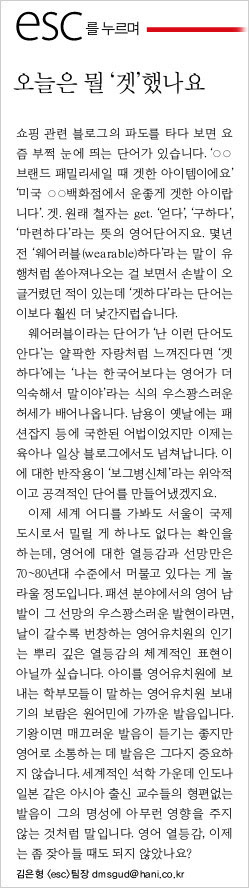
오늘 아침 <한겨레> 김은형 기자의 글[오늘은 뭘 ‘겟’했나요]에 인용된 문장이다. 시류를 잘 알고 있는 독자들은 벌써 여기 쓰인 ‘겟’이 영자 ‘get’이라는 걸 눈치채고도 남겠다. 우리말로 옮기면 볼 것 없이 ‘얻다’이다. 우리말로 써도 두 음절에 불과하니 특별히 영자로 쓰는 게 경제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쓰는 것은 무슨 멋인가.
두어 해 전에 나는 “슬림(slim)하고 샴푸(shampoo)하다?”라는 글을 통해 우리말 접미사 ‘-하다’와 로마자가 ‘이종교배’한 사례를 든 적이 있다. 영자와 결합한 접미사 ‘-하다’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드라이(dry)하다’, ‘패스(pass)하다’, ‘데이트(date)하다’는 이미 국어사전에 올랐을 정도다.
이런 사례를 단순히 ‘언중의 선택’이라 치부할 수만은 없는 까닭은 그것이 단지 낱말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현상의 속내에는 한글과 영어를 ‘촌스러움과 세련됨’, ‘열등한 언어와 우월한 문자’라는 대비로 바라보는 뿌리 깊은 열패감이 숨어 있다. 거기엔 주류 언어를 따르지 못하는 문화적 식민지 백성의 안달과 조바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김은형 기자는 “‘겟하다’에는 ‘나는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익숙해서 말이야’라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허세가 배어나”온다고 말하면서 “이제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밀릴 게 하나도 없다는 확인을 하는데, 영어에 대한 열등감과 선망만은 70~80년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개탄한다.
“분위기가 잔뜩 다운되어 있는데 말이야. 술 한 잔 들이켜니 기분이 절로 업되는 느낌이더라고.”
‘내리다, 가라앉다’와 ‘오르다, 상승하다’의 뜻으로 쓰기 시작한 ‘다운(down)’과 ‘업(up)’은 이제 어지간히 대중화(?)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다.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쓰는 데다가 쓰는 쪽도 듣는 쪽도 무심하기는 매일반이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족이 되지 않을까 근심할 만큼 말이다.
국한혼용체, 더 정확히 말하면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라 할 수 있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떠올린 것은 이때쯤이다. 고교 시절에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로 시작하는 이 한자투성이의 글을 골치 썩이며 배운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걸 달달 외워야 했던 끔찍했던 국어 시간의 추억과 함께.

보기의 예문 ㄱ, ㄴ을 읽어 보고 다시 ㄷ, ㄹ을 확인해 보자. ㄱ, ㄴ에서 요령부득하였던 느낌은 ㄷ, ㄹ에서 아주 깡총하게 정리가 된다. 그게 뜻글자 한자와 다른 소리글자 한글의 힘이다. 이 글에서는 대체로 한자어가 중심이 되고 한글은 토씨나 접사 따위로 쓰였다.
‘기미독립선언서’는 한글은 ‘언문’으로 홀대하면서 주류 문자 한문은 ‘진서’로 기려지던 전근대에서 개화기를 거쳐 막 근현대로 접어들던 시절의 글이다. 깡그리 ‘한자’로 도배된 ‘한문’에 파열구를 낸 것이 여기 쓰인 조사와 접사 들이다. 그게 한글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한글 사용 방식이었던 셈이다.



조선어 사용금지, 조선어 신문의 폐간 등 민족 언어와 문자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글은 순혈 민족주의에 힘입어 그 위상을 높였고 해방과 함께 한글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반세기를 거치면서 한글은 왕조 시대의 ‘한자’에 못잖게 기려지는 주류 언어 영어의 도발 앞에 다시 숨을 죽이는 형국이다.
‘겟’이든, ‘업’과 ‘다운’이든 한글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낯선 느낌이 반감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것을 아예 ‘영자’로 표기할 경우를 생각해 보라.
“○○ brand family sail 때 get한 item이에요.”
<보기>에 든 ‘국한문 혼용’ 문장은 ‘한문’이 한글’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과정의 모습이다. 그러나 위에 든 문장은 오히려 역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장이라고? 멀쩡한 ‘한글’이 자발없이 ‘영자’와 몸을 섞고 있는데 그다음 과정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논리의 비약이거나 기우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나 영어가 단순히 국제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계급적 지표로 기능하고, 그 구사 능력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명백히 정비례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것을 한갓지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무심히 넘길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이다.
2013. 3. 8.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가겨 찻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셍종엉젱’과 ‘세종어제’ (1) | 2020.10.18 |
|---|---|
| “치료하실게요”라고요? (2) | 2020.10.16 |
| 이제 자치법규에서도 ‘사리(砂利)’는 ‘자갈’로 (0) | 2020.10.10 |
| [574돌 한글날] 한글 ‘11,172’ 자 (0) | 2020.10.09 |
| ‘수입산’도 ‘해독약’도 없다…<표준국어대사전>의 배신 (0) | 2020.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