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률에 남은 일본식 용어 정비

법제처에서 법률에 남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한다. ‘납골당’과 ‘엑기스’ 등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등 모두 310건의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용어 37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제처에서는 이 용어들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정할 계획이란다.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이 37개 용어는 공식 법률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 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듯하다.
37개 낱말을 훑어보고 난 느낌은 좀 씁쓸하다. ‘납골당’이나 ‘엑기스’야 워낙 자주 쓰이는 말이니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해득하기 어려운 다음 낱말들은 어떤가. 법과 법원과는 연을 맺지 않은 이로선 좀 요령부득한 말이 아닌가 말이다.
·건정(鍵錠) ·게기(揭記)하다 ·계리(計理) ·구배(勾配) ·사리(砂利) ·주말(朱抹)하다
<표준국어대사전>(아래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정작 ‘건정’은 표제어로도 나오지 않는다. ‘열쇠 건(鍵)’에 ‘제기이름 정(錠)’자니 짐작은 했지만 ‘잠금장치’로 순화한다니 좀 허탈하다. 37개 용어 가운데 ‘시건(施鍵) 장치’도 ‘잠금장치’로 순화한단다.

‘게기하다’도 글자로 ‘들 게(揭)’에 ‘기록할 기(記)’니 대충 뜻을 새길 만하긴 하다. ‘계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리(沙利)’는 ‘모래 사(沙)’자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자갈’이라니 황당하지 않은가. ‘구배’도 낯설기는 일반이다. <사전>에 나와 있듯 ‘물매’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법제처 안에서는 ‘경사’로 순화한단다.
‘주말(朱抹)하다’는 아무 말이나 한자로 쓰려는 생각이 만들어낸, 거의 ‘참사’ 수준의 한자어다. ‘붉을 주(朱)’에 ‘지울 말(抹)’ 잔데, 정말 이런 낱말이 법률용어로 쓰였다니 기가 막힌다. 머리 좋기로 둘째간다면 서러워할 판검사들도 이런 말을 알아먹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대체로 이번 대상 용어들은 일본식 한자어로 보면 될 듯하다. 같은 한자문화권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자 쓰기는 다르다. 그게 한자를 받아들이는 감각의 문제인지 문화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 글자는 ‘거짓 가(假)’와 ‘먼저 선(先)’이다.

‘가(假)’는 ‘임시’의 의미로 주로 쓰는데, 우리말에선 임시 집’을 뜻하는 ‘가가(假家)’에서 온 ‘가게’가 있다. 37개 용어 중 ‘가도’나 ‘가식’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선 이 접두사를 꽤 많이 쓴다. ‘가건물’, ‘가등기’, ‘가계약’, ‘가매장’ 따위로 말이다.
‘가(假)’가 접두사로 쓰일 경우는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도(假道)’나 ‘가식(假植)’은 한자어를 적지 않을 땐 뜻을 새기기가 쉽지 않다. 한자를 섞어서 문자 생활을 하는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말에서는 ‘처(處)’로 쓰는 게 뜻이 분명한데 ‘선(先)’으로 쓰는 경우도 일본어 형식이다. ‘거래선(去來先)’뿐 아니라 ‘수입선(輸入先)’도 같은 예다. ‘행선지(行先地)’의 ‘선’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다.
나머지 정비대상 용어를 살펴본다.
<사전>에는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 이룬 마을. 또는 그 마을을 이룬 곳.’이라고 단순히 풀이하고 있지만 ‘부락’의 어원은 일제 지배와 이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선 쓰인 적이 없는 이 말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천민(賤民)이 사는 마을을 뜻하는 제나라 말을 우리의 마을을 부르는 용어로 쓴 것이다.
부락(부라쿠)은 가죽 공업·형장일 등을 하던 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이들은 봉건시대 신분제도인 사농공상에도 끼지 못한 채 히닌(非人, 사람이 아니다) 등으로 불리며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마다 ‘부락 대항 경기’를 벌였는데 그 어감이 별로여서 왜 ‘마을’로 쓰지 않고 그걸 쓰는지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불입(拂入)이나 불하(拂下)에 쓰이는 ‘불(拂)’은 ‘떨치다, 치르다’의 뜻을 지닌 글자다. 우리말에선 ‘지불(支拂)’ 따위에 쓰는 글자이긴 하지만, 그 쓰임새가 다르다. ‘돈을 내다’의 뜻이라면 ‘바칠 납(納)’자를 써서 ‘납입’, ‘납부’, ‘완납’, ‘미납’ 따위로 쓰는 것이다. ‘아래 하(下)’자와 이어 ‘매각하다’의 뜻으로 쓰는 것은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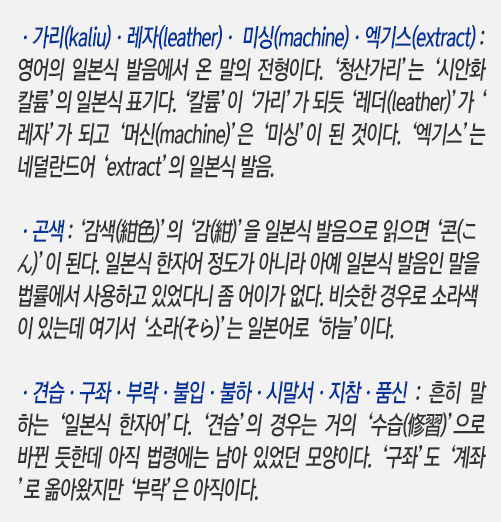
‘사건의 경위’을 이르는 ‘시말(始末)’은 우리 식 한자어로는 ‘전말(顚末)’이다. 최인훈의 단편에 ‘그레이구락부 전말기’라는 작품도 있다. 역시 일제 지배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이 낱말은 교원들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던 80년대 학교에서 자주 쓰였다. 걸핏하면 관리자들의 교원들의 교육적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이다.
‘지참’이나 ‘품신’은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지각’ 대신 ‘지참’이라 쓰는데 갓 임용된 새내기 교사들은 그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디지털 시대의 학교 행정 프로그램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복무 메뉴에도 그것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품신’과 ‘품의(稟議)’는 <사전>에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함’으로 풀이하고 있는 말들이다. 아주 조신하게 어른과 상사를 대접하고 있는 말인데, 수평적 질서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원리와는 꽤 거리가 있는 말이다.
‘신청’이나 ‘건의’ 따위로 써도 충분해 보이는데 이런 낱말이 쓰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상하의 계급이나 지위를 엄격히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품(稟)’은 ‘여쭈다, 사뢰다’의 뜻인데 건조하게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상대의 지위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의식 같은 것 말이다.
말이 한 사회의 성격과 권력관계를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봉건시대를 거쳐 대중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말에는 그런 봉건적 의식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에 스미어 버린 일본식 낱말의 영향도 꽤 크다.
법제처의 법률용어 정비는 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낱말들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사회 일반에서는 거의 쓰지 않게 된 일부 낱말이 아직도 법령에 쓰이고 있음은 우리 사회의 무신경-이를테면 ‘국민학교’를 반세기 가까이 써 온 것 같은-의 일부임은 부정할 수 없다.
2014. 9. 1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가겨 찻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지개는 ‘켜고’ 어깨는 ‘편다’ (0) | 2020.07.23 |
|---|---|
| ‘뿐’과 ‘-ㄹ뿐더러’, 띄어쓰기는 어렵다? (0) | 2020.07.22 |
| 한글날, 공휴일로 복원! (0) | 2020.07.20 |
| ‘들어내다’는 돼도 ‘들어나다’는 없다 (2) | 2020.07.14 |
| 무슨 말이 이래? -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들 (2) | 2020.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