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나의 ‘대춘부(待春賦)’

아직 ‘지난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이르긴 하다. 그러나 요즘 나는 자꾸만 겨울이 이미 저물고 있으며 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겨울 들머리에서 잠깐 추웠을 뿐 추위로 힘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눈이 드문 고장이지만 눈은 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은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이었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상을 기록한 일곱 해 가운데 한 해일 뿐 아니라, 영상 1도를 넘은 유일한 해라는 발표 수치에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는.
서울이 그럴진대, 따뜻한 남쪽에 해당하는 구미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베란다 내벽에 살얼음이 끼고 보일러 배관이 얼었던 2017년 겨울 이래, 겨울은 점점 따뜻해져 왔다. 두꺼운 방한 외투를 꺼내놓고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겨울이었다.
가끔 오후에 외출하면서 살갗에 와 닿는 햇빛이 봄의 그것 같다고 느끼는 때가 적지 않았다. 어저께는 아파트 바로 앞 화단으로 나갔다가 탄성을 질렀다. 해마다 3월이 되어서야 눈에 띄던 목련이 하얀 솜털로 싸인 꽃눈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럽쇼, 그럼 산수유도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 앞의 산수유를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꽁꽁 닫고 있긴 하지만 산수유 겨울눈이 노랗게 망울을 맺고 있었다. 우정 이미 봄이 와 있다는 생각이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내친김에 동네 골목길의 매화도 찾아보았더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자그마하게 매화 꽃눈도 빨갛게 여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오고 있는 봄은 기정사실이다. 가마골 가는 길옆의 매화도 마찬가지였다. 시절이 하 수상하여도 오는 봄을 어찌할 수는 없는 법이다.
돌아와서 지난해 봄의 파일을 열어보니 3월 2일, 꼭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건 지난해 처음 만난 봄, 산수유가 올해보다 좀 더 활짝 열려 있었고, 동네의 매화는 곱고 소담스럽게 꽃을 피웠다. 올 봄은 서둘러 오는 셈일까.


천양희(1942~ ) 시인의 ‘이른 봄의 시’를 찾아 읽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물상들이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봄을 시인은 담담하게 서술한다. ‘햇빛이 웃으며 걸어오고’, ‘바람은 빠르게 오솔길을 깨우고’, ‘메아리는 능선을 짧게 찢’으며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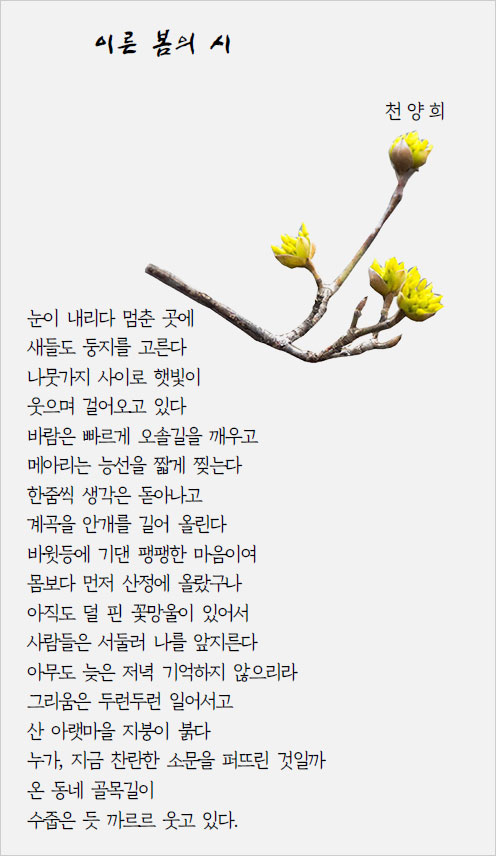
‘두런두런 일어서’는 그리움은 ‘찬란한 소문’을 떠올리는데, ‘온 동네 골목길이/수줍은 듯 까르르 웃고 있’는 봄을 노래한 쉰둘의 시인이 일흔여덟이 되는 세월을 나는 생각한다. 그가 1994년에 펴낸 제4시집 <마음의 수수밭>은 지난해 ‘다시 보기’로 재출간되었다. 그걸 인터넷 서재의 보관함에 쟁여놓고 이 봄을 기다려보기로 한다.
2020. 2. 5.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사의 주례사 - 서로에게 ‘올바른 상대’ 되기 (0) | 2020.02.15 |
|---|---|
| 악플, 혹은 ‘무례’에 대처하는 법 (0) | 2020.02.10 |
| 전화, 함께 나누던 ‘위로와 연대’ (0) | 2020.01.28 |
| “그래도 군대는 가야 한다”고 하는 ‘숙맥’ 조카 (0) | 2020.01.28 |
| 이문열, 다시 ‘홍위병’을 불러내다 (0) | 2020.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