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프레베르(Jacques Prevert, 1900~1977)의 시편을 읽으며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Jacques Prevert, 1900~1977)를 만난 것은 1975년 민음사가 낸 ‘세계시인선’ 25 <귀향>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지금 내 서가에 꽂힌 <귀향>은 1985년에 나온 제4판이다. 이미 누렇게 바랜 이 책의 정가는 1천 원이다. 물론 그 시절의 화폐 가치의 오늘의 그것으로 단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책값 앞에서 나는 참으로 아련해진다.
‘고엽’의 시인 자크 프레베르


시집 <귀향>에 실린 시편 가운데 나는 ‘바르바라(Barbara)’를 즐겨 읽었다. 나는 그 시를 내 잡기장에 옮겨 적었고, 그 뒤로 두고두고 그 구절들을 되뇌곤 했던 것 같다. 그 시절에 내가 시집에서 읽은 게 고작 그것뿐이었을까. 그러나 시방 내겐 그것밖에 마땅히 프레베르에 대해서 떠오르는 기억이 전혀 없다.
26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낡은 시집을 뒤적이다가 간신히 그의 시 ‘고엽(枯葉)’을 노래한 이브 몽탕의 샹송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고엽’은 원래 프레베르의 시나리오 <밤의 문>의 주제가였다. 사랑과 이별을 감상적으로 노래한 이 노래는 이브 몽탕의 매력적인 음성에 실려 프랑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인은 생텍쥐페리도, 사르트르도 카뮈도 아닌, 샹송 ‘고엽’의 노랫말을 지은 프레베르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시인이기 이전에 샹송의 작사가였던 그의 시가 보여준 대중성을 사랑했던 것일까.
프레베르는 파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열다섯 살 때부터 시장과 백화점에서 일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시와 예술에 뜻을 두었고 1926년부터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초현실주의 운동에도 참여했다.



영화 시나리오, 샹송의 작사가로 활약했으나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는 마르셀 카르네(Marcel Carné)와 함께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프랑스 영화의 ‘시적 리얼리즘’의 전통을 창조했다고 평가받는 카르네과 함께 만든 <제니의 집>, <안개 낀 부두>, <저녁의 손님>, <인생유전(천국의 아이들)>, <밤의 문> 등의 시나리오와 대사가 그의 작품이었다.
프레베르는 “이 잡지 저 신문 가리지 않고 곳곳에 기고하였지만, 자신이 시인이라고 자처한 바 없었고 그냥 글을 쓰고자 하는 그때그때의 욕구와 충동, 그리고 기쁨만을 위해 글을 썼다.”(김화영 <귀향> 해설, 이하 같음) 그러나 1946년 최초의 시집 <말(Paroles)>을 펴내자 그는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며 대중들의 절대적 인기를 얻고 되는, 이른바 ‘문학적 사건’을 겪게 된다.
전쟁의 참상과 파괴된 사랑, ‘바르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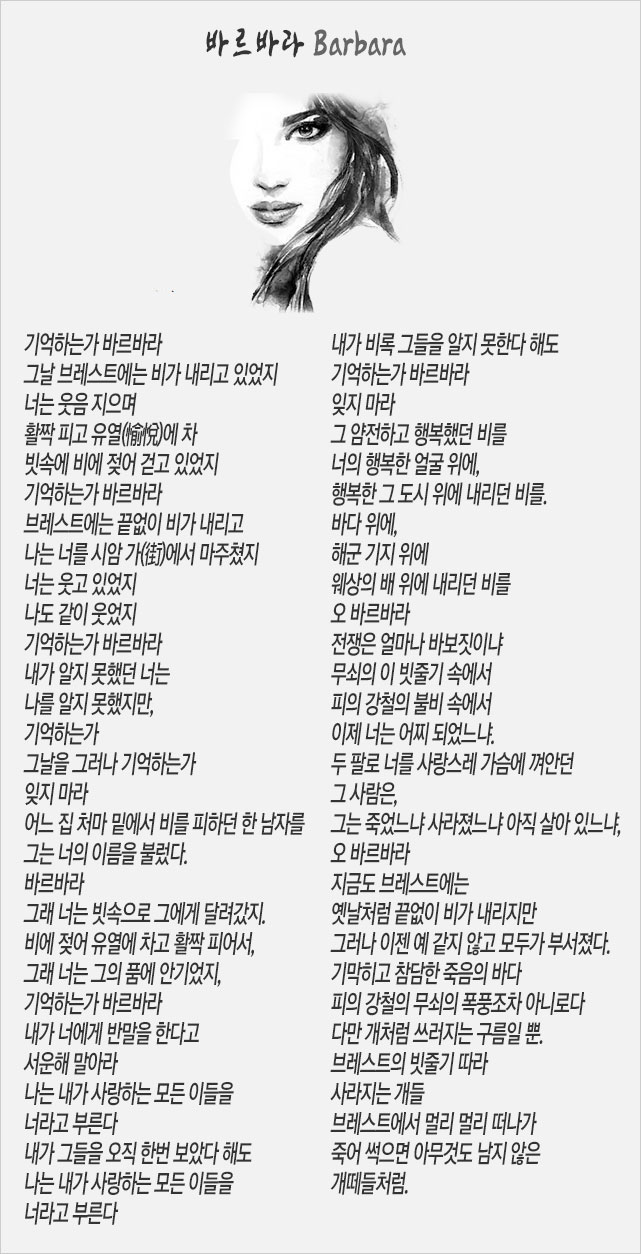
<말(Paroles)>은 발간된 지 몇 주 만에 10만여 부가 팔렸고 프레베르는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이 되었다. 이 시집은 그 후 10년 동안 500여 판 56만 부가 팔려 시집 출판의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에도 그는 <구경거리(Spectacle)>(1951), <비와 좋은 날씨(La pluie et le beau temps)>(1955), <잡동사니(Fatras)>(1965) 등 세 권의 시집을 펴냈다.

시인이기 이전에 그는 샹송의 작사가였다. 시집 출간 이후이긴 하지만 ‘바르바라(Barbara)’도 샹송으로 만들어졌다. ‘고엽(Les Feuilles Mortes)’을 만든 조세프 코스마가 곡을 붙였다. 이브 몽탕은 이 시를 낭송했고 뒤에 노래로도 불렀다.
프레베르는 누구보다 뛰어난 ‘항거와 해학의 시인’이다. 그의 “반항은 보통 그가 ‘그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의 행복과 무관한,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처함으로써 작고 따뜻한 저마다의 행복을 깨뜨리고 삶을 재미없게 만드는, 3인칭 복수에게 행해지기 일쑤다.”
“하나님, 신부, 용병들로 표현된 숨 막히는 질서, 그리고 작은 우리들의 행복과 무관한 ‘권위’에 대한 풍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위 ‘인텔리’라고 불리는 식자들에게도 겨누어진다. 그들도 3인칭이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프레베르는 전쟁에 대한 혐오와 고발도 중요한 시적 주제다. [ 홍승애 낭송 '바르바라']
참혹한 전쟁의 고발 뒤에 아름다우나 파괴된 사랑을 그리고 있는 ‘바르바라’는 그 대표적 작품이다. 프레베르는 브르타뉴 지방에 있는 군항(軍港) 브레스트 거리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 바르바라를 회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낭만적 추억이 아니다.

‘기막히고 참담한 죽음의 바다’, ‘피의 강철의 무쇠의 폭풍’으로 불리는 전쟁의 참상 앞에서 시인은 ‘전쟁은 얼마나 바보짓이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두 팔로 너를 사랑스레 가슴에 껴안던 / 그 사람은,’ ‘죽었느냐 사라졌느냐 아직 살아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비 내리는 브레스트 거리에서 묻어나는 것은 전쟁의 비참함과 개인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쓸쓸함이다. ‘지금도 브레스트에는 / 옛날처럼 끝없이 비가 내리지만 / 그러나 이제는 옛 같지 않고 모두가 부서졌다.’ 그리고 그것은 ‘개처럼 쓰러지는 구름’으로 형상화된다.
사랑스러운 여인 바르바라의 ‘행복한 얼굴’ 위에 내리던 ‘그 얌전하고 행복했던 비’는 ‘무쇠의 이 빗줄기’, ‘피의 강철의 불비’로 바뀌었다. 전쟁 앞에 선 한 아름다운 여인과 그녀의 슬픈 사랑을 노래하는 바르바라는 그래서 아픈 사랑의 시를 넘어서 서늘한 반전의 노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너라고 부른다
내가 그들을 오직 한번 보았다 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너라고 부른다
내가 비록 그들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시절에 내가 자주 인용하곤 했던 구절이다. 당신은 “모든 가장된 문명과 권위와 연극을 벗어 던지면 ‘너’가 되”는 것이다. 프레베르에게 “사랑이란 ‘가정’, ‘결혼’ 따위의 질서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그 어떤 사랑의 이론, 혹은 철학의 체계도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기쁨이며 소박하고 단순한 포옹, 혹은 키스”다.
‘말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시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하고 단순해 뵌다. 구태여 한갓진 비유와 상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마치 물 흐르듯 흐르는 감정과 느낌에 몸을 내맡기는 듯하다. 비평가 가에탕 피콩(Gaëtan, Picon)의 언급은 바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프레베르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말을 한다. 그에게는 문체가 있다기보다는 어조가 있다. (……) 그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의 희귀한 새를 잡기 위하여 미리 정성스레 짠 그물처럼 언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이 그를 찾아와서 속에 잠긴 그의 분노와 멸시와 애정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한다.
- 가에탕 피콩
그의 시에는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영화인으로서의 프레베르의 특성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귀향’, ‘아침 식사’, ‘꽃집에서’나 ‘절망이 벤치 위에 앉아 있다’ 등의 시가 그것이다. 특히 12행시 ‘메시지’는 영화적인 기법이 시와 특이하게 결합한 예로 평가된다.
프레베르는 <시 읽는 아이>, <학교에서 나온 우리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사진과 그림을 곁들인 많은 동화를 출판하여 이 방면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도 했다. ‘전후 프랑스의 환멸과 도전 정신을 표현’한 시인 프레베르는 1977년 4월 북부 프랑스의 셰르부르에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그의 시집을 다시 검색해 보니, 대부분 절판이다. 1975년에 민음사에서 낸 <귀향>은 다섯 편의 시를 더하여 제목을 <꽃집에서>로 바꿔 펴낸 게 있다. 바야흐로 26년이 묵은 내 책은 제책 부분의 풀이 수명을 다했는지 너덜너덜 떨어지기 시작한다. 새 책을 한 권 사나 마나 망설이면서 이브 몽탕의 목소리로 ‘고엽’과 ‘바르바라’를 번갈아 들어본다.
2011. 8. 7. 낮달
*이브 몽탕의 '고엽' 듣기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잭 런던, <강철군화>에 가려진 탁월한 단편들 (0) | 2019.09.05 |
|---|---|
| 허균, 자유와 혁명을 꿈꾼 로맨티시스트의 초상 (0) | 2019.09.01 |
| 삶, 긴 강을 흐르는 물 (0) | 2019.08.21 |
| 그래, ‘희망은 길이다’ (0) | 2019.08.20 |
| ‘고급 거시기’ 거부한 시인 최영미, 왜 출판사 차렸나 (0) | 2019.08.19 |





댓글
낮달2018님의
글이 좋았다면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을 써보세요. 블로거에게 지급되는 응원금은 새로운 창작의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은 만 14세 이상 카카오계정 이용자라면 누구나 편하게 작성,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댓글 목록 등을 통해 응원한 팬과 응원 댓글, 응원금을 강조해 보여줍니다.
응원금은 앱에서는 인앱결제, 웹에서는 카카오페이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