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버들과 물안개의 호수 주산지 옆 청송 심부자댁

‘청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주왕산’이나 ‘주산지’ 따위의 명승지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겠지만 ‘청송교도소’나 지금은 청송제3교도소가 된 ‘청송보호감호소’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터이다. 경북 북부의 궁벽한 산골인 청송이 사람들에게 ‘교도소’나 ‘감호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는 상황은 아무래도 찜찜할 수밖에 없겠다.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의 청송
지난 3월에 법무부 장관이 청송제2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송 지역이 크게 반발한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83년 보호감호소가 설치되면서 악명 높은 교도소 소재지로 알려진 데 이어 청송에 사형집행 시설이 들어서면 청송의 ‘청정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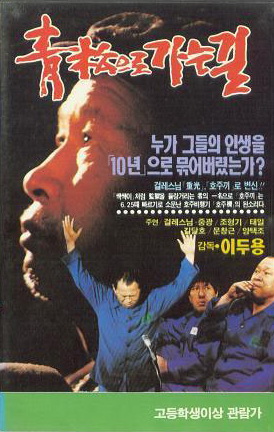
현 정부가 국가 운영의 철칙처럼 부르대는 ‘법치주의’를 이 궁벽한 산골에서 완결(?)시키고자 한 것은 잦은 흉악사건과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사형집행 재개’라는 여론을 떠보기 위한 말치레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이 ‘뜻밖의 돌’을 맞은 지역 주민들의 만만찮은 저항에 정부는 꺼낸 계획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청송의 지역 브랜드 슬로건이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이 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청송군으로서는 기존의 교도소와 감호소, 그리고 궁벽한 시골이라는 이미지를 ‘자연’과 ‘노래’를 통해 반전시키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송이 ‘청송 심씨’의 관향(貫鄕)이라는 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동을 굳이 ‘안동 김씨’나 ‘안동 권씨’의 본관으로 기억하지 않듯이 청송을 굳이 심씨와 이을 이유는 없다. 나는 청송을 일본의 한국계 도예가 ‘심수관(沈壽官)’ 일가의 고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심수관은 임란 뒤인 1598년 일본에 끌려가 사쓰마 도기[薩摩燒]를 만든 심당길(沈當吉)의 후예다. 부친에 이어 ‘습명’(襲名:선대의 이름을 계승함)으로 14대 심수관이 된 이 조선 도공의 후예는 한국 성(姓)을 고집하며 400여 년간 가업을 계승해 오고 있다고 한다. 막상 청송에 심수관 가의 유적이 따로 없는 것은 이들의 선조가 남원에 옮겨 살다가 일본에 끌려간 까닭이라고 한다.
심수관, 심훈과 청송 심씨
청송 심씨는 고려 충렬왕 때 심홍부(沈弘孚, ?~?)를 시조로 받든다. 이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된 것은 심홍부의 증손 덕부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기 때문이다. 덕부의 다섯째 아들 온(溫)은 여식을 충녕대군(뒤의 세종)에게 시집보냈는데 이이가 곧 소헌왕후다.
덕부의 아우 원부는 고려의 국운이 다하자 형과 달리 새 왕조를 거부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를 지킨다. 이른바 두문동 72현(賢) 가운데 하나다. 후손들도 그의 유훈을 받들어 ‘선훈불사(先訓不仕)’라 하여 대대로 벼슬을 멀리하였는데, 현재 청송에 사는 이들은 대체로 이들 원부의 후손이라 한다. 지금 청송에는 심원부의 장증손(長曾孫) 외 10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
청송 심씨는 조선조 500년 간 정승이 열셋, 왕비가 넷, 부마를 넷씩이나 낸 서인(西人) 집안이지만 우리 역사에서 두드러진 인물은 그리 보이지 않는다. 산수화에 새로운 화풍을 이루어 김홍도와 함께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알려진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눈에 띄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소설 ‘상록수’의 작가이자 ‘그날이 오면’의 시인 심훈의 이름이 우뚝할 뿐이다.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는 안동에서 주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거기 이른바 ‘덕천리 심부자 댁’으로 알려진 ‘송소고택’을 두어 해 전에 한번 잠깐 들르고 만 것도 그러저러한 생각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주산지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들러 사진 두어 장 찍고 간 때는 2007년 5월이었다. [관련 글 : 주산지(注山池), 왕버들과 물안개의 호수]



송소고택을 다시 들른 것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오후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찾은 주산지는 아직 봄이 어설펐고, ‘절골’은 입산 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굳이 송소고택을 다시 찾은 까닭은 정작 그 오래된 부잣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었던 까닭이다.
9대의 만석꾼, 청송 심부자 댁 송소고택
양반들의 오래된 집은 안동 인근에선 발에 차인다. 집집이 만만찮은 내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한 내력 따위야 파고들면 여느 사람들에겐 없을까. 골골의 반가를 찾는 일이 시들해진 것은 그런 까닭 탓이다. 그게 그거인 한갓진 양반님들의 삶도 그렇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수백 년 고택도 그렇다. 거기 서린 것이 단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라면 그것은 좀 씁쓸하지 않은가 말이다.
송소고택은 조선 영조 때 만석의 부를 누린 송소(松韶) 심호택이 1880년께 지은 집이다. 심 부자의 재력은 가히 전설적이다. 심 부자는 9대에 걸친 만석꾼으로, 해방 전에도 2만 석을 했다고 한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심 부자의 땅이 없는 곳이 없었다고 전한다.
곡식을 세는 단위인 석(石)은 우리말로 ‘섬’이다.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쓰는데 한 섬은 ‘열 말’, 즉 가마로 치면 두 가마에 해당한다. 부의 규모를 말할 때 쓰는 ‘천석꾼’, ‘만석꾼’은 한 해 수확하는 곡식의 총량이 천 석(2천 가마), 만 석(2만 가마)이라는 말이다.
심 부자가 2만 석을 했다는 말은 무려 4만 가마의 추수를 했다는 뜻이니 그 부의 규모는 짐작할 만하다. 개화기 때 세금을 은화로 내라는 지시에 따라 심 부자가 의성 안계에 있는 전답을 팔아 화폐로 바꾸자니 안계 고을의 돈이란 돈은 전부 모였다고 했다던가. 또 이를 청송으로 옮기는데 그 행렬이 10리나 뻗쳤다고 한다.

송소고택 앞은 일반 여염집 앞이라 보기에는 엄청 너르다. 주차장으로 쓰는 공터에 차가 드문드문 대여 있다. 대문채 벽에 걸린 현수막은 ‘주한 외교사절단’을 환영하고 있다. 대문은 활짝 열렸고, 어쩐지 떠들썩한 분위기가 집 밖으로 넘친다.
헛담으로 구분된 큰 사랑채 오른편, 곧 안채를 막아선 작은 사랑채 앞마당에 남녀 외국인이 그득하다. 주한 외교사절단인 모양이다. 좀 딱딱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회자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막걸리와 우리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 듯했다.
헛담 쪽으로 기다랗게 차린 조리대에 갖가지 음식이 풍성하다. 막걸리와 식혜, 불고기와 각종의 부침개 앞에 봉사할 준비가 끝난 아낙들이 일렬로 조신하게 서 있었다. 사회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거나 음식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의 표정이 흥미로웠다.
뜰에서 열리는 행사와 무관하게 나는 자유롭게 집 안을 돌아다녔다. 송소고택은 흔히 말하는 99칸 집이다. 100칸은 임금만이 소유할 수 있다. 아무리 권세가 드높아도 99칸을 넘을 수 없는 게 신민(臣民)의 한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칸’은 전통건축에서 말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루는 개념이다. 송소고택의 건물은 모두 7동인데 이들의 모두 합한 칸수가 99칸이라는 뜻이겠다.



홍살을 설치한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만나는 큰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집이다. 오른쪽에 작은 사랑이 있고 그 뒤에 안채가 있다. 우측에 작은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안채가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쪽 건물이 찬방이다.
송소고택은 건물에 독립된 마당이 있으며, 공간이 구분되는 등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집이다. 별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큰 사랑채 왼편에 중문으로 이어진 별채 건물이다.
송소고택의 ‘헛담’
송소고택은 120년쯤 되는 집인데도 보수해 그런지 그리 고풍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추운 지방이라 문마다 겹문을 달고 있는 걸 빼면 여느 옛집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정작 눈에 띄는 것은 ‘헛담’이다. 사랑채와 안채로 드나드는 작은 사랑채의 중문 사이 마당에 안채로 드나드는 사람이 사랑채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둔 담이다.

내외가 엄격하던 시절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빤히 사랑채가 보이는데 남정네가 앉아 있는 앞을 지나 안채로 드나들어야 하는 여인들에게 그 길은 곤혹스러운 공간이었을 터이다. 그래서 사랑채를 가리는 헛담을 쌓은 것이니 이는 전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의 산물인 셈이다.
예전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큰 사랑채에 이 집을 관리하는 이들인지, 후손들인지 고운 한복을 갖춰 입은 여인들이 여럿 들락거린다. 대청에는 보료를 줄지어 깔아놓았으니, 나중에 손님 접대를 준비하는 여인들인 모양이다. 치마를 모아 쥐고 조신하게 오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집에서 살다 간 중세의 여인들을 잠깐 그려보기도 했다.
작은 사랑채 앞뜰의 소란에 비기면 안채는 적요했다. 큰 사랑채가 다소 위압적인 모습이라면 안채는 훨씬 단아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단청이 없는, 하얗게 회칠한 외벽과 가라앉은 기와 빛깔 탓일까. 거기 고인 공기조차 오래된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진다.
대청 왼쪽의 방 앞에 하얀 고무신이 놓였다. 보통 방 앞에 놓인 신발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증명이지만 관광객들의 숙박을 받는 송소고택에선 그게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 있겠다. 대개의 고택에서 제공하는 숙박이 그렇듯 이 집엔 장작불 난방과 보일러 난방이 섞여 있다고 .(☞ 누리집 바로가기)은 전하고 있다.
고택의 아궁이를 볼 때마다 나는 거기 넣는 장작불을 그려보면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하룻밤 눅진하게 몸을 지지고 가고 싶어진다. 행사는 상기도 끝나지 않았다. 나는 관리인에게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줄이고 송소고택을 떠났다.
세월은 바야흐로 21세기, 공간만 바꾼다고 해서 고택에서의 삶을 온전히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누리집 게시판을 드나드는 나그네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사라진 ‘전근대의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아스라한 향수 같은 것일 터이다.




2010. 5. 23.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여행, 그 떠남과 이름의 기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주, 허물어진 절터를 찾아서 (0) | 2019.06.18 |
|---|---|
| 경상도 사람의 전라 나들이 ① 전주 한옥마을 (0) | 2019.06.17 |
| 화림동 계곡에 으뜸 정자 ‘농월정(弄月亭)은 없다’ (0) | 2019.05.29 |
| 불국사의 발견, 또는 재발견 (0) | 2019.05.20 |
| [유럽여행-바티칸]초보 여행자, 바티칸에서 길을 잃다 (0) | 2019.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