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 여전히 TK의 눈길이 곱지 않은 까닭

자유한국당 전 현직 국회의원의 막말 행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는 전국 곳곳에서 베풀어졌다. 다섯 번째로 맞는 봄은 유가족들에게 여전히 아픔과 그리움을 환기하는 시간이고, 추모객들에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16일 구미역 앞에서 정오부터 시작된 서명운동과 책 전시 등 시민 캠페인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세월호 5주기 구미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2014년에 여러 차례 밝혔던 촛불문화제가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명에 참여하거나 전단을 받아들고 흘낏 서명대를 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2014년에 세월호 촛불 때의 공기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명 등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무심히 집회 참가자들을 일별하고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도 많았다.
많게는 100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지만, 100명을 못 채운 채 비슷한 방식으로 집회가 진행되곤 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역 앞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택시 기사들의 눈길도 그리 우호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새로 역 앞마당에 관광안내소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마당에서 집회하기가 곤란해 참여 시민들은 역사로 오르는 계단 한쪽 면에 풍선을 들고 옹기종기 앉아서 집회를 치렀다. 집회는 의례적으로 1시간 반쯤 진행되면서 ‘특별수사단 설치’와 사고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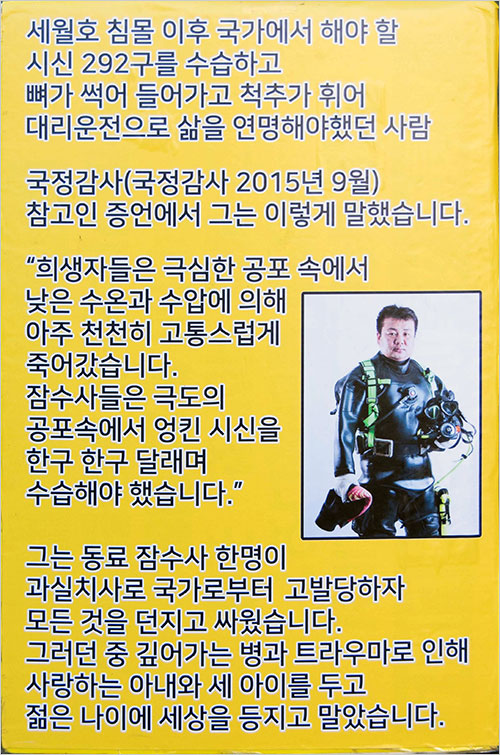
오늘 추모제에는 예전에 보이지 않던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러 보였고, 시장도 낮에 다녀갔다고 했다. 어쨌거나 박근혜 재임 시절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시민들의 무관심이나 비우호적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행사 사회자가 소개한 추모제 준비 과정에서 겪은 일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시내 몇 군데에 펼침막을 다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멈추더니 유리창을 내리고 그러더란다. 그건 이 지역의 오래 묵은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였다.
“야, 고마(그만)하자. 아직도 세월호가(냐)? 정말 질린다!”
세월호가 ‘지겹다’고 하거나 이른바 ‘피로’를 호소하는 일각의 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월호가 지겹다 할 수 있는 건 당사자뿐”이라는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의 일갈은 이 시정(市井)의 정서를 압도적으로 부정하는 진실이다.
새삼 참사 당시 집권당 의원들이 부르댄 ‘세월호 교통사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망발인가를 확인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배가 침몰해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조할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해서 죽어갔다”는 역설 또한 참사의 속내를 드러내 준다.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이 겪은 참담한 고통과 슬픔, 트라우마에 대하여 공감하려 애쓰지 않아서 ‘지겹다’고 한다면 그나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엿보이는 이 ‘그만하자’는 정서는 지역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와 이어진 것이다.
짠한 마음과 ‘콘크리트 지지’
그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수십 년 동안 행사해 온 ‘묻지 마’ 지지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나 반호남 정서에 바탕을 반민주당, 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서는 흔히, 의견이 다른 정당과 세력에 대한 반대와 폄훼로 나타나며, 정권 방어 논리로 자리하곤 하는 것이다.
세월호의 비극, 혹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숱한 실정과 농단에 대한 지역 보수 유권자들의 방어는 눈물겹다. 그들은 애써 실정과 농단이 정권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 문책이 과중하다고 부르대곤 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그를 엄호하는 정서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것은 ‘측은지심’이다. ‘안됐다’, ‘불쌍하다’라는 감정은 그를 지지하는 이쪽 동네 사람들, 특히 5, 60대 이상 여성들의 기본 정서다. 걸핏하면 ‘맘이 짠해서…….’다. 전적으로 부모를 비명에 보낸 그의 개인사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는 양친의 불행한 죽음을 겪었다. 아버지는 종신 집권을 꿈꾸었던 절대권력이었고 그 어머니는 지아비의 독재 이미지를 중화할 수 있는 자애로운 지어미의 상징이었다. 평생 한 번도 제 손으로 생계를 꾸린 적도, 누군가의 아랫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그는 부친이 죽은 뒤 권력의 성채를 비워주고 ‘바깥세상’에 나와야 했다.
여기가 지지자들의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지점이다. 천애 고아(?)가 된 독재자의 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연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절대권력이었던 그 부친은 어쨌든 국민을 절대빈곤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다. 재임 시절의 독재를 기억하기보다는 내 삶이 윤택해진 게 훨씬 기억에 선명하다.
그 '측은지심'은 세월호 앞에서 굴절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박정희 관련 사업에 목을 맬 만큼 이들 유권자의 추억과 회고 정서는 강렬하다. 죽은 권력에 대한 추모를 살아 있는 그 딸자식을 통해 행사하려는 이들 유권자의 회고 정서는 마치 자신이 그 자식의 후견인이나 된 것 같은 착시로 이어진다. 그 ‘짠한 마음’은 꼼짝없이 ‘묻지 마’ 지지로 승화(?)되는 것이다.
더구나 박빙의 승부 끝에 그 딸은 부친이 누렸던 자리에 올랐다. 마치 자기 자신이 권력을 얻은 듯한 만족감이 이들을 잔뜩 고무하지 않았을까. 짠한 마음이란 본디 약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다. 권력을 향한 측은지심은 터무니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묘한 기분은 마치 내가 그를 다독여 그 자리에 올린 듯한 성취감을 덤으로 준다.
그러나 이들의 측은지심은 여기까지다. 권력을 계승한 독재자의 딸에게 바쳐진 측은지심은 진도 앞바다에서 물속에 잠겨 스러져간 꽃다운 소년 소녀들의 죽음 앞에선 굴절된다. 물론 이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정당 지지자들보다 동정심이나 인정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다. 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성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측은지심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져 버렸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선택이 인간이 으레 갖추고 있는 본연의 정서마저 왜곡해 버리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박근혜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았다면 이들의 측은지심은 여느 지역의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이 아니라, 그 골든 타임에서 할 수 있는 구조를 포기해 버린 부작위의 책임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지역민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성찰'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수준 미달의 막말을 내뱉고, 박근혜의 책임과 죄를 부정하는 것은 이들의 정서에 편승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이 다수의 비난보다 훨씬 더 이롭다고 여기는 정치적 판단의 소치인 것이다.
지역감정과 그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포박된 정치적 선택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퇴행케 한 것은 분명하다. 독재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맹목적 지지가 초래한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시민(유권자)의 성찰이다.
그것이 이 시대 지체의 정치적 현실, 여전히 그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 소재마저 밝히지 못한 허송세월과 그것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적 역량을 회복하는 길이다.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이 퇴행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2019. 4. 1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떤 백일몽 (2) | 2019.04.22 |
|---|---|
| ‘통일 트랙터’, ‘분단의 선’을 넘을 수 있을까 (0) | 2019.04.19 |
| 차명진, 선량의 꿈은 접고 ‘착한 이웃’으로 돌아가라 (3) | 2019.04.16 |
| [근조] 세월호 5주기- ‘에스토니아’ 이후, 혹은 ‘세월호 이후’ (0) | 2019.04.14 |
| 가을 나들이-그림, 책, 사람을 만나다 (0) | 2019.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