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 새잎’을 들으며
메이데이(May Day)다.
어제는 역 광장에서 두 번째 촛불이 켜졌다. 오후 내내 개어 있더니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행인들은 비를 피해 종종걸음을 쳤고 참가자들은 역사로 오르는 중앙계단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고 광장 앞 역사를 향해 세운 천막 분향소가 조문객들을 받고 있었다.
빗속에서도 드문드문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어린 학생들, 젊은 연인들과 아이를 안고 온 부부들, 늙수그레한 중장년의 시민들까지 일단 천막 안으로 들어선 이들은 매우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어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죄인’의 마음이 되는 게 세월호 사고의 특징인지 모른다.
삼백여 ‘목숨의 무게’가 고작 이것인가
중앙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이들은 수효는 지난번 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박정희’라는 이름을 단 거리와 체육관을 둔 이 보수 영남의 대표적 도시의 일반적 정서일까.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집회라고 이름 붙이기 무엇한 쓸쓸한 행사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집회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의 정서가 반드시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정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는 천안함 때의 340개의 꼭 20분의 1 수준인 17개다.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만 그것도 실내로 한정해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한 것이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에 비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삼백여 명 목숨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
시민단체에서 분향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시(市)에선 지침이 없어 불가하다고 했단다. 그럼 장소라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 결국, 역전 광장에 천막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꼼짝없이 시민단체에서 분담할 수밖에 없다.
비용부담 때문에 국화는 다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민망해하는 관계자에게 괜찮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위로했다. 일단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가 볼 작정이라고 했다. 조문하려면 도청이 있는 대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으니 이 천막 분향소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안이 될 것이었다.
집회가 시작되어 계단에 앉아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묘한 무력감이 엄습해 왔다. 지난 25일 첫 집회 때도 느꼈던 증상이다. 무언가 한량없이 내 안에 흥건히 고이고 있는 듯한데 이상하게도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2014년의 봄은 너무 잔인하다. ‘꽃답다’는 표현마저 진부한 열여덟 풋풋한 아이들을 포함 삼백여 명의 승객이 캄캄한 심해에 가라앉았다. 사고를 둘러싸고 하나씩 복기되는 사고 전후의 상황과 사고 원인 따위를 따라가면 국민소득 2만6천 달러, 세계 십몇 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작 책임져야 할 이들의 책임은 가볍기만 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국민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이 도덕적 전도 앞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국가’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귀가하니 딸애가, 살려달라고 배의 창문을 두들기는 승객들을 싣고 배가 가라앉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다며 말을 잇지 못한다. 물이 차오르는 선실에서, 혹은 더는 숨 쉴 공기가 남아 있지 않은 배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가 바로 ‘새잎’이었다
새벽에 우연히 핸드폰을 눌렀는데 꽃다지의 노래 ‘강철 새잎’이 흘러나왔다. 메이데이 아침에 이 노래를 들은 건 2009년이었다. 그리고 5년. 나는 다시 ‘강철 새잎’을 듣는다. 새잎을 이야기하기엔 봄이 깊다. 그러나 그 아이들 또한, 새잎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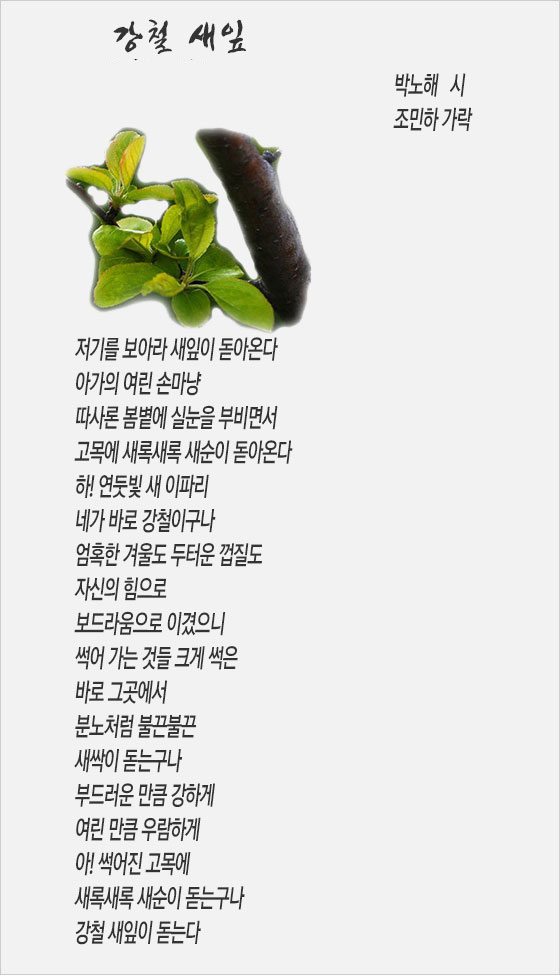
강철처럼 단단하고 ‘엄혹한 겨울’도 ‘보드라움으로 이’겨온 아이들. 진도 앞바다 그 심해에 가라앉은 우리 열여덟 사내아이와 딸아이들도 우리 ‘새잎’이었거늘, ‘부드런 만큼 강하게 여린 만큼 우람하게’, ‘썩어진 고목에서 새록새록’ 돋는 새순이었거늘…….
잘 가거라, 새 잎들아.
너희들 연둣빛 새 이파리,
썩어가는 것들, 크게 썩어가는 바로 그곳에서
분노처럼 불끈불끈 돋던 새잎들……
이제 이 썩은 고목을 넘고 가라.
온갖 미사여구로 칭송해 온
관행과 관습의 기만과 허위를
넘어서 밟고 가라.
2014. 5. 1.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다시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4년 4월(4) 세월호 참사와 ‘여객선 사고’, 안산을 다녀오다 (0) | 2019.04.16 |
|---|---|
| 2014년 4월(3) 세월호, 돌아오지 않는 교사들을 생각한다 (0) | 2019.04.16 |
| 2014년 4월(1) 잔인한 봄―노란 리본의 공감과 분노 (0) | 2019.04.15 |
| 밀양, 2006년 8월(1) (0) | 2019.03.11 |
| 토플 만점 여중생 반대편엔 ‘루저’가 우글 (0) | 2019.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