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희 시집 『오라, 거짓 사랑아』(민음사, 2008)


뒤늦게 문정희의 시집 <오라, 거짓 사랑아>를 읽고 있다. 그의 시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구석이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정서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사랑’은 다른 여성 시인이 그러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게 연륜의 힘일까.

그의 시 ‘유방’을 읽는다. 화자는 유방암 사진을 찍는다. ‘윗옷’을 벗고 ‘맨살’로 ‘기계’ 앞에 선다. ‘에테르’처럼 스며드는 ‘공포’ 속에 ‘패잔병처럼 두 팔 들고’.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몸을, ‘축 늘어진 슬픈 유방’을 성찰하기 시작한다. ‘사춘기 때부터 레이스 헝겊 속에’ ‘싸매놓은’ 그 ‘수치스러운 과일’처럼 ‘깊이 숨겨왔던 유방’을.
노화를 경험하며 몸을 성찰하다
그것은 ‘세상의 아이들을 키운 비옥한 대자연의 구릉’이었지만, ‘오랫동안 진정’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것’이고, ‘또 아기의 것’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지금 그 여자는 윗옷을 모두 ‘벗기운 채’ 기계 앞에 서서 비로소 ‘이 유방이 나의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는 여성주의 시인으로 불리는 모양이다. 모르긴 몰라도 시 ‘유방’에서 여성이 자기 몸의 발견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여성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빛나는 젊음과 뜨거운 애욕의 세월을 넘어 비로소 ‘축 늘어진 슬픈 유방’ 앞에서 그 여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응시하게 된 것이다.
문정희 시인이 유방암 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몸과 유방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한 것처럼 사람들은 노화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몸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듯하다. 더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몸의 모든 기관과 기관 사이, 부위와 부위 사이의 부조화를 통해서 노화를 깨닫듯 노화는 새롭게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해 주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몸’은 한때 젊음의 동의어였던 것 같다. 사랑과 욕망을 현재화하는 그 살아 있는 살과 피, 그게 몸이었던 게다. 그때, 모든 몸의 부위들, 눈과 코, 입과 귀, 목과 가슴, 팔과 다리, 엉덩이와 성기는 그 젊음과 환희를 찬양하는 수단들이었다.
그 각각의 신체 부위들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오직 육체의 강건함과 관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젊음은 그 젊음 때문에, 자신의 청춘, 그 육체를 성찰하기 어렵다. 성찰보다는 그것을 찬양하고 누리는 일이 더 급하고 가까운 일이므로.
팽팽한 근육과 거기서 비롯한 단단한 근력, 외부적 자극에 재빨리 반응하는 몸과 피의 속삭임, 그것은 젊은 육체의 황홀한 합주 같은 것이었다. 어떤 순간에도 빠짐없이 살아 오르는 날카로운 순발력도, 어떤 상처도 금방 거뜬히 아물게 하는 치유의 능력도 그 젊음의 징표였다.
그러나 끝이 없는 젊음은 없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몸도 응답하기 시작한다. 어느 날, 그를 불타오르게 했던 저 도저한 사랑과 욕망 앞에서조차 숨을 죽이는 자신의 살과 피를 깨닫게 되면서 생물학적 시간은 밀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이태 전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가 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고, 운동부하 검사라는 걸 받은 적이 있다. 상반신을 벗고 가슴 여기저기에 전극을 붙인 다음, 러닝머신 같은 기계 위에서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 달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였다.

검사는 힘들지 않았다. 나는 별로 숨 가쁜 줄도 모르고 가볍게 검사를 받았고 별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그러나 그 기계 위에서 나는 갑자기 내 몸이 무력한 고깃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검사대 앞에서 깨닫는 노화와 그 실존
기계는 마치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찾으려는 것처럼 모니터에 어지러운 파장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그것 앞에서 더할 수 없이 무력했기 때문이다.
유방암 검진을 받기 위해 검사대에 섰을 때 시인이 겪었던 감정의 파장도 나의 그것과 비슷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이는 검사대 앞에 맨살로 서서 바라본 자신의 ‘늘어진 유방’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노화와 그 실존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자기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심상하게 바라보았고, 으레 자기 것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젖가슴이 오랜 세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식과 남편의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인은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유방이 지녔던 모든 덕성, 위대한 모성애를 드러내는 그 부드러운 살의 융기, 뜨거운 애욕과 관능으로 빛나는 그 살의 번제(燔祭)가 다만 청춘의 송가였다는 것을.
이제 맨살조차 탄력을 잃고, 칭얼대며 달려드는 아이도, 뜨거운 애무에 목말라 파고드는 사내의 손길도 멀어져 간 이 노년의 삶. 그 앞에서 이제야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아프게 깨우치는 시인의 쓸쓸한 마음은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내들에게 여성의 유방처럼 노화의 순간을 환기하는 것은 성기라기보다는 피폐해지는 몸 그 자체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샤워를 하면서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마치 타인처럼 바라보곤 한다. 그것은 공중목욕탕에서 만나는 중년의 사내들을 바라보는 눈길과 닮았다.
한때는 팽팽한 근육질로 청춘을 구가했던 그들의 늘어지고 쪼그라진 엉덩이, 허약해 보이는 하지들, 구부정한 어깨, 무언가 허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가슴팍 따위는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제 거기에는 근육과 근력, 자극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 각 부위와 부위의 황홀한 합주, 날카로운 순발력 따위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때로 앙상한 나목을 연상케 한다. 잎을 벗은 나무처럼 인간의 몸도 비로소 온갖 젊음의 장식을 벗고서 정직해지는 것이다. ‘영혼의 집’이라는 몸은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민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셈이다. 그리고 그 실존적 사유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일보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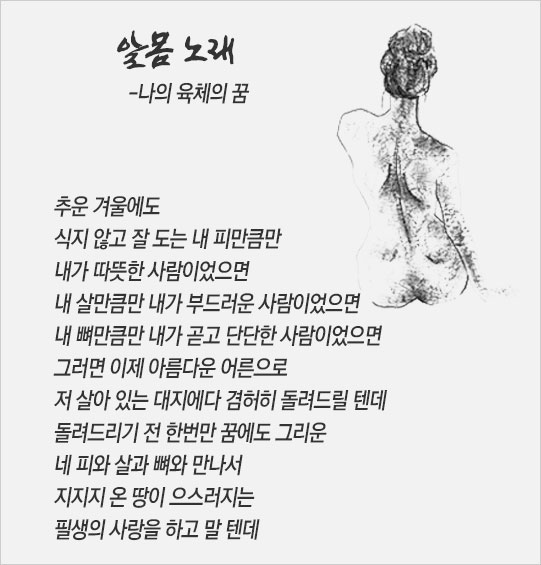
시인의 포기할 수 없는 육체의 꿈
시인은 그러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육체의 꿈은 그렇다. 그녀는 ‘피만큼’ ‘따뜻한 사람’이기를, ‘살만큼’ ‘부드러운 사람’이기를, ‘뼈만큼’ ‘단단한 사람’이기를 꿈꾸면서 그러면 ‘아름다운 어른’으로 ‘대지에다 겸허히 돌려드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한번, ‘그리운 네 피와 살과 뼈와 만나서’ ‘온 땅이 으스러지는 필생의 사랑’을 하고야 말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그이가 “알몸 노래”를 통해서 꿈꾸는 것은 노화와 무관하게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욕망이고, 그 존재 증명이다. 모두가 그이가 꿈꾼 사랑, ‘온 땅이 으스러지는 필생의 사랑’을 꿈꿀 수 있으리라. 나는 그가 말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단단한 사람’, ‘아름다운 어른’으로 대지에다 겸허히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생의 사랑’을 꿈꾸는 시인은 1947년생, 우리 나이로 예순셋이다. 회갑을 일찌감치 지낸 시인의 사랑과 몸에 대한 천착이 내 것처럼 살가운 이유다. 그것은 단순히 햇수의 크기가 아니라 삶과 사랑을 그윽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웅숭깊은 이해의 크기이기도 한 것이다.
2009. 7. 3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신탕집 떠나는 똥만이 마음은 어땠을까 (0) | 2019.12.20 |
|---|---|
| 아이에게 ‘안중근 의사’를 알려주고 싶다면 (0) | 2019.12.07 |
| 게으름뱅이 독자의 ‘책 읽기’ (0) | 2019.11.18 |
| 신화, ‘집단 정체성’의 기억들 (0) | 2019.11.13 |
| 아이라쿵께요, 키가 커삐가 치마가 짧아진 거라예 (0) | 2019.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