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벌식 자판은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요즘이야 모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지만, 한때는 타자기가 가장 첨단의 문서작성기인 때가 있었다. 나는 1977년 군 복무 중에 타자기를 쓰기 시작했다. 글쇠만 한글 자모로 바꾼 미제 레밍턴 타자기였다. 당시의 자판은 자음과 모음 모두가 두 벌인 네벌식이었다. 나는 이른바 독수리 타법으로 능숙하게 서류를 만들곤 했다.
초성과 받침으로 쓰는 자음이 두 벌이지만, 모음은 어떻게 두 벌인가. 받침이 없을 때 쓰는 모음과 받침이 있을 때 붙이는 모음은 달라야 한다. 그건 말하자면 기계식 타자기의 한계였던 셈이다.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국산 클로버 타자기를 샀다. 마라톤 타자기도 있었는데 어쩐지 클로버가 끌렸던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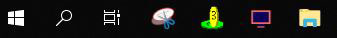
네벌식 자판에 능숙해지자 전동타자기와 전자타자기가 나왔다. 전동을 건너 전자타자기로 가기로 작정하고 전자타자기를 마련한 87년에 두벌식으로 갈아탔다. 3년 후, 286 컴퓨터를 마련하던 1990년에 세벌식으로 바꾸고 어느새 20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세벌식을 쓰는 것은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세벌식을 쓰는 곳은 거의 없다. 학교, 관공서, 개인 할 것 없이 아예 세벌식의 존재조차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두벌식을 쓴다. 아이들은 두벌식과 세벌식의 뜻도 잘 모른다.
초성과 종성이 뒤바뀌고 꼬이는 두벌식 오타

수업 중에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할 경우가 더러 있다. 주로 한글 프레젠테이션을 쓰는데, 부득이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웹에서 검색도 해야 한다. 그런데 교실마다 컴퓨터는 모두 두벌식이다. 부득이 나는 각 교실의 컴퓨터마다 두벌식/세벌식 전환 프로그램 ‘Han3Tool’을 깔아두었다. [han3tool 받는곳]
작업표시줄 아래의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 프로그램은 자판을 두벌식과 세벌식으로 바꾸어준다. 이 프로그램은 ‘날개셋’이라는 한글 입력기를 개발한 김용묵이라는 분이 개발한 것인데 세벌식 사용자에게는 거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세벌식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알아먹는다. 두벌식의 도깨비불 현상도 설명하면 머리를 주억거린다. 그러면서 두벌식 오타에 관해 이야기하면 역시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도 많다. 오타는 세벌식보다 두벌식이 훨씬 높다.
두벌식은 초성과 종성으로 구분해야 할 자음을 하나로 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받침으로 쓰일지 다음 글자의 초성으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받침으로 붙고 보는 도깨비불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빠르게 타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타의 원인도 두벌식 때문이다.
걸핏하면 초성과 종성이 뒤바뀌고 꼬인다. ‘생일’이 ‘생리’로 바뀌는 이런 오타를 이른바 ‘두벌식 오타’라고 할 수 있다. ‘생일’을 입력하면서 ‘ㅇ’을 두 번 연속 입력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며 헷갈리면서 ‘일’자의 받침 ‘ㄹ’을 먼저 입력해 버리는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벌식 사용자라면 위의 표에 드러난 ‘두벌식 오타’가 아마 눈에 익을 것이다. 이 오타는 받침과 다음 글자의 초성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서 둘째 음절의 초성과 받침이 뒤바뀌어 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뭐임’은 ‘뭥미’가 되고 ‘빨리’는 ‘빠릴’이, ‘완전’은 ‘오나전’이 된다. ‘제발’은 ‘젭라’가 되어 버린다. 초성과 받침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벌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오타다.
세벌식, 아흔아홉 개의 이점과 한 개의 불편…
두벌식과 세벌식 자판을 비교한 아래 표를 보면 명확해진다. 우선 보급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두벌식이 90%인데 반해 세벌식은 고작 10%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항목 간 비교에서 두벌식은 맥을 추지 못한다.

평균 속도나 평균 능률은 낮으면서도 오타율은 두벌식이 2~3배 높다. 글쇠수는 세벌식이 4단에 걸쳐 쓰지만, 두벌식은 3단에 그친다. 그러나 연타나 윗글쇠는 세벌식이 훨씬 적다. 이 점은 오타의 확률과 이어지기도 한다.
이 비교는 당연히 세벌식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를 얻긴 하지만 현실은 늘 글쎄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세벌식을 지원하지만, 키보드 중에서 세벌식 자판은 없다. 하드웨어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9:1의 보급률로 그대로 이어진다.
아흔아홉 개의 이점을 갖고도 절대 열세의 보급률과 오래 써 온 자판을 바꾸기를 꺼리는 개인 사용자의 보수성 때문에 지금 세벌식은 여전히 소수자의 위치를 벗지 못한다. 미국에서도 쿼티보다 30%쯤 빠른 드보락 자판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집의 아이들에게조차 세벌식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소수가 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벌식을 쓰는 것은 사실은, 그리 크게 불편한 일은 아니다. 그런 불편은 세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비기면 오히려 작은 것이니 말이다. 요컨대 필요한 것은 세벌식 전환이 옳다는 인식과 실천이다.
2009. 5. 12.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가겨 찻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글 이야기] <한겨레> ‘섹션’과 <JTBC> ‘뉴스룸’의 영자 타이틀 유감 (0) | 2019.10.06 |
|---|---|
| [한글 이야기] ‘KB 국민은행’에서 ‘MG 새마을금고’까지 (0) | 2019.10.05 |
| 부톤섬으로 간 한글 ② (0) | 2019.09.26 |
| 한글, 인도네시아 부톤섬으로 가다 (0) | 2019.09.25 |
| 나는 ‘즐거운 주말’이 되고 싶지 않다 (0) | 2019.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