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영택의 펜화 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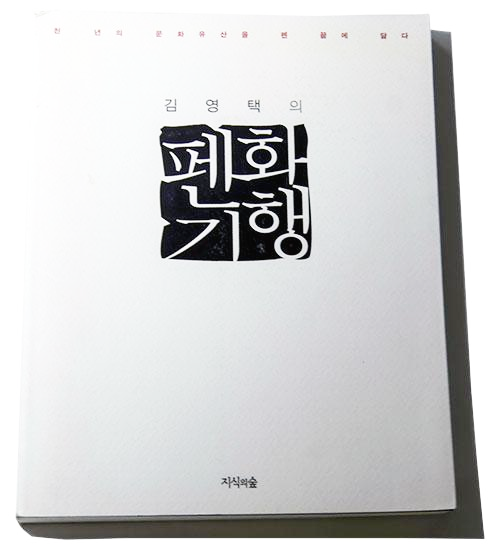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은 사진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듯하다. 더러 풍경이나 사물을 담기도 했지만 전 시대의 필름 카메라는 주로 사람을 찍는 데 한정되었으니 그것은 만만찮은 비용 때문이다. 필름 구매에서부터 현상과 인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줄곧 드는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디카’의 등장은 그런 여가 문화를 일거에 바꾸어 놓았다. 이름난 유적지나 명승지에선 디카를 들고 풍경이나 유적을 담는 사람들로 붐빈다. 필름 걱정도 인화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파일로 보관하거나 필요한 것만 인화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은 최소한에 그친다. 바야흐로 디카는 이 디지털 시대의 총아가 된 것이다.
유적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우리는 무심결에 거기 의존해 버린다. 사진에 기대지 않을 땐 맨눈으로 낱낱이 보고 기억해 둘 터인데 사진기에다 담는 것으로 대상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간단히 메모해야 할 사항도 휴대전화로 찍으려 덤비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사진 찍기에 바빠서 정작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을 번번이 놓치면서 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대상과 그 본질을 이해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화가는 단순히 구도를 잡고 대상을 그 구도에 가두는 일이 아니라, 그 구도 속에서 대상은 주변의 사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 속살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놓는가를 고민하고 이해해야 하니 말이다.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영택 화백이 펜화 60여 점과 함께 엮은 기행문집 <김영택의 펜화 기행>(지식의숲, 2007)은 바로 그러한 사유를 통해 태어난 그림으로 우리 땅의 절집과 정자, 집과 정원, 궁궐을 톺아본 기록이다. 그는 우리 문화유산을 ‘산, 물, 흙, 사람, 하늘’이라는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밀한 펜화와 함께 그것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나직하게 얘기하고 있다.

펜화는 말 그대로 펜으로 그린 그림이다. 펜은 우리의 붓과 달리 ‘뾰족하고 딱딱해서 가늘고 길게 그을 수 있는’ 필기구다. 보름 동안 50만 번의 선을 긋는 제의와도 같은 과정을 거쳐 한 장의 펜화가 태어난다. 따라서 그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는 여러 차례 대상을 바라보고 칼질처럼 정교한 선을 그으며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갈무리하고 대상에 담긴 천년의 세월을 살려낸다.
지은이는 ‘통도사 범종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난’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가 전생에 통도사에서 불화를 그리던 불모(佛母: 불화를 그리는 스님), 영산전 팔상탱을 그린 유성 스님이었다는 어느 스님의 말을 전하면서 통도사와의 인연을 소개한다.
그래서일까. 책 곳곳에 그려진 절집의 건축물에 대한 감상이나 이해는 여느 답사객의 그것과는 다른 깊이와 울림을 보여준다. 스스로 열세 해 동안 채식만 해온 이로서, 무릇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말하는 그의 숨결은 따뜻하고 나지막하다.
“잘 지은 건물이나 아름답고 장대한 산을 펜화로 옮길 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두세 시, 잡념이 끊긴 마음 끝에 종이를 스치는 철필의 소리는 마치 불경을 사경(寫經)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 80만 번의 선을 그어 그린 곳(45쪽)
“새벽안개가 낮게 드리운 계곡에 무리 지어 핀 꽃무릇이 습기를 머금어 선홍색으로 보일 때에는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던 애잔한 기억들로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 선홍빛 꽃무릇 그리울 때면(52쪽)

그림으로 대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는 오랜 시간의 관찰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 가까이 다가간 듯하다. 펜화로 태어난 건축 문화재에 대한 그의 얘기는 단순한 그림쟁이의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주 나지막한 어조지만 그것은 대상에 대한 그의 이해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단박에 알려준다.
그는 통도사 불이문이 심한 경사 위에 서 있어서 기단의 높이를 조정하여 경사의 차이를 최소화한 걸 발견한다. 그리고 거기서 서양의 그것과 달리 우리 건축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식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을 선인들의 ‘가람 조형 의식’과 ‘자연 친화적 지혜’라고 생각하니 화가로서의 그의 눈썰미는 우리 건축 미학을 깨닫는 수준에까지 이른 셈이다.
그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은 ‘내 작품’이라는 욕심을 버린 장인에서 비롯한다고 믿는다. 낙관이나 서명이 있는 백자가 모두 가짜이듯 모두가 비슷비슷한 모양을 갖춘 우리 건축 문화재에는 그러한 ‘무아의 미’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천생 화가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그림쟁이로서의 그의 미의식은 대상을 그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있는 인공의 흔적들을 지워내기도 한다. 그것을 그는 자신의 ‘바람을 담은 그림으로 펜화의 장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그리면서 그는 이중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져 바깥 울타리를 빼었고, 영동 강선대의 일본식 석축과 쇠 난간을 우리식 석축과 목조 계자난간으로 고쳐 그렸다. 함양 거연정(居然亭)을 그리면서는 정자에 바짝 붙여 지은 철제 홍예교가 정자의 아름다움에 되레 해가 된다고 빼놓았고, 법당을 가리고 있는 통도사 대광명전은 앞의 목련 두 그루를 빼 버리고 그리기도 했다.
“보기만 해도 날카로운 철조망의 뾰족한 부분들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때 자연히 저런 철조망들이 사라지겠지요? 눈에 아무 거리끼는 것 없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155쪽)
서울 주변의 성곽을 그리면서 성 앞에 여러 겹으로 둘러쳐진 철조망이 보기 흉하여 빼놓고 그렸다면서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인공의 두드러짐이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지는 자연의 맨살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여는 글’에서 솔직담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가 펜화에 담고 싶어 하는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은 ‘한국 전통건축이 세계 제일’이라는 국수주의적 주장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무아의 아름다움’이며, 세계의 건축이 추구해야 될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축’입니다. 우리 건축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펜화에 담아 전 세계인들이 보고 느끼고 즐겼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여는 글

1993년 국제상표센터가 전 세계 그래픽 디자이너 중 탁월한 업적을 쌓은 톱 디자이너 54명에게 수여한 ‘Design Ambassador’에 국내 최초로 뽑혔던 화가 김영택은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반해 전국을 여행하면서 펜으로 전통문화재를 그리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오랜 그의 그림 여정의 결과물인 셈이다.
펜 그림과 함께 깊고 그윽한 사랑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을 따라가는 여정은 담백하면서도 호젓하다.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탐색하는 그의 눈길에 동참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거니와 수십만 번의 선을 그어서 태어난 정밀한 펜화의 세계를 마음으로 더듬어 보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거두는 소담스러운 기쁨이다.
작가는 한 줄의 문장을 쓰기 위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달게 받아들인다 했다. 김영택의 펜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한 줄 한 줄 그은 금 안에 담긴 게 예사롭지 않은 통증이라는 게 저절로 깨우쳐질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지만 그것을 찾는 길이 고통의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다.
2008. 1. 28. 낮달
펜화, 마음 끝에 스치는 사경(寫經)의 철필소리
[서평] <김영택의 펜화 기행>
www.ohmynews.com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례사 비평, 끼리끼리 나누는 ‘우의의 연대’? (0) | 2019.09.18 |
|---|---|
| ‘황석영’을 다시 읽으며 (0) | 2019.09.17 |
| 일본인 교장 패대기친 소년, 정말 불온했을까 (0) | 2019.09.15 |
| ‘열녀(烈女)’, 혹은 ‘수절(守節)’ 이야기 (0) | 2019.09.14 |
| “우리는 그 외롭고 캄캄한 벽 속에서 무엇을 찾았나” (0) | 2019.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