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학 새 시집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

안동의 안상학 시인이 시집을 새로 냈다. 2008년에 낸 <아배 생각> 이후 6년 만이다. 나는 그 소식을 <한겨레>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 며칠 후에 시인의 동무인 안동의 후배로부터 주소를 보내달라는 전갈을 받고 나는 그렇게 답했다.
“그러잖아도 <한겨레> 기사를 읽었어. 경상북도엔 안상학밖에 없네!”
우리 고장에서 시집을 내는 이가 어찌 안상학 시인밖에 없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 시대 지상의 가치로 추앙받는 돈과 무관하게 힘들여 시를 쓰고 이 한여름에 시집을 펴내는 여느 시인을 죄다 알지 못하니 역시 그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안상학, 다섯 번째 시집 출간

여섯 해 전 <아배 생각>을 냈을 때 나는 이 지면에다 그의 시집에 대해 이런저런 성근 감상을 주절댔다.[관련 글 :‘밥 못 먹여 주는’ 시와 함께 살아온 시인의 20년 세월] 중언부언했지만 나는 거기서 그가 매우 열심히 살고 있는 시인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고 그의 삶을 예사롭지 않게 느꼈다는 얘길 했다.
여러 권의 시집을 사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나눈 것은 전적으로 그의 ‘열심’에 손뼉을 치는 일로 그것만 한 게 없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섯 해, 우리네 소시민에겐 그만그만한 일상에 그쳤지만, 시인은 여전히 마음을 앓으면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는 걸 새 시집으로 증명해 낸 셈이다.
어쩌다 한 지역에 이웃해 살다 보니 내 서가에는 이번 시집까지 포함하여 그의 시집 네 권이 꽂혀 있다. 등단한 지 3년 만에 낸 첫 시집 <그대 무사한가>(1991, 한길사)는 없다. 세 번째 시집 <오래된 엽서>의 출판기념회에서 나는 직전에 나온 시집 <안동소주>도 얻었었다.
등단한 지 26년에 다섯 번째 시집을 펴냈으니 그는 평균 5년에 한 권꼴로 꾸준히 시집을 내 온 것이다. 여러 삶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시를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 시집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실천문학사)에 실린 쉰아홉 편의 시는 시집 끝에 붙인 시인의 말처럼 ‘함께 소요한’ 도반이었다고 해도 좋겠다.
내 인생의 대지에 나는 시를 뿌렸다. 내가 고른 씨다. 못난 손길로도 예쁘게 싹이 텄고, 슬픈 마음으로 어루만져도 기쁘게 자랐다. 꽃이 피었던 기억은 있는데 열매는 글쎄다. 시의 열매는 무엇일까 묻지 않았다. 삶이 여물면 시도 여물겠지 하며 지냈다. 사실 그것이 열매가 아닐까 생각하며 서두르지 않았다. 남의 논밭 기웃거리지 않았고, 남의 작물이며 작황에 마음 쓰지 않았다. 그저 내가 뿌린 씨 하나도 버거워하며 나는 나의 대지에서 시와 함께 소요했다. 꽤 오래되었다.
- ‘시인의 말’ 중에서

스물아홉에 낸 그의 첫 시집에 낸 시편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비슷한 제목의 시편 속에서 그의 젊음을 유추해 볼 뿐이다.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1987년 11월의 신천’을 새로 읽는데 행간마다 스물여섯 풋풋한 청년의 숨결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다. 설사 앞서 나온 그의 시집을 죄다 꿰고 있다고 한들 그의 시 세계나 그 변화 과정을 살필 만한 안목이 내겐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내 소감은 ‘시 좋네!’거나 ‘그저 그렇네’와 같은 인상 비평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아배 생각>이 나왔을 때, 나는 얼핏 그의 시가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시인이 나이를 먹으면 시도 늙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내게 그것은 시에 별다른 변화 없이 세월의 켜만 쌓인다고 느낄 때 쓰는 표현이다. 혹은 쓸데없이 노회한 척하는 ‘애늙은이’에게 쓰는 말이다.
뉘우침,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온도

지천명을 훌쩍 넘긴 나이니 그의 시선도 이제 깊어지고 그윽해진 것은 분명하다. 시가 짧아지거나 더러는 길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런 시에 비친 그의 모습이 생뚱맞아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겪어온 연륜 덕분일 터이다.
표제작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는 뉘우침의 시다. 그 뉘우침은 쉰이 넘어 자신의 흠결이 가감 없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만나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노래에 담긴 감정의 결이야 독자의 것이겠지만, 종결어미 ‘-네’로 끝나는 이 회오(悔悟)가 뿜어내는 서정 앞에 나는 잠깐 흥건해졌다.
종결어미 ‘-네’가 가진 울림은 독특하다. 내게만 그런가, 나는 유난히 이 어미 앞에 약하다. 기형도의 시 ‘빈집’이 가진 울림도 상당 부분 그 어미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길 만큼. 그것은 아주 몸에 붙이지도,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내치지도 않는 그만그만한 마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온도의 서정이 아닌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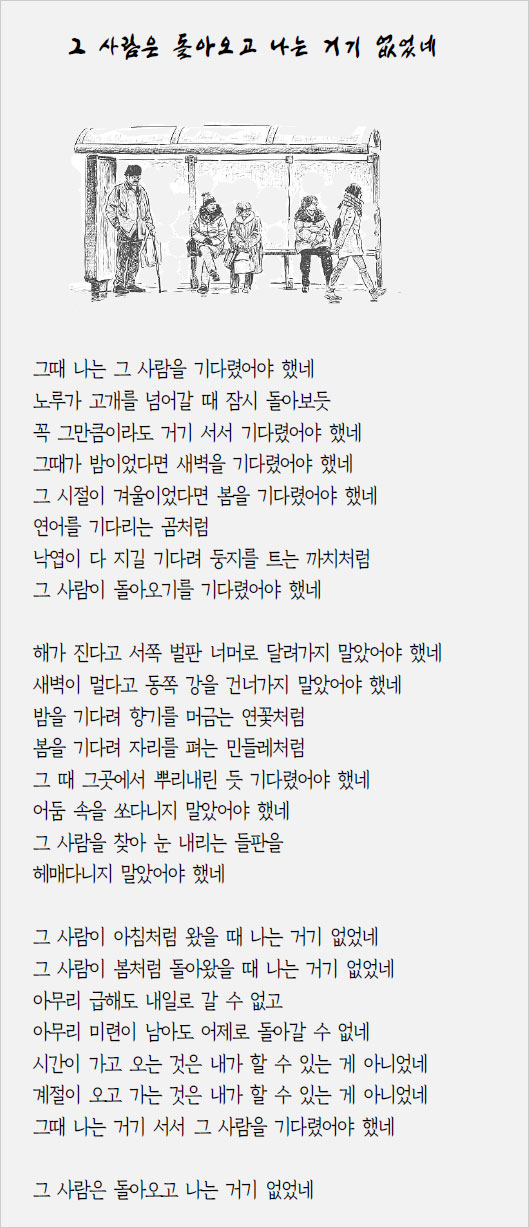
이 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 ‘늦가을’에 드러나는 여유와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에는 더러는 유치하게 느껴질 만한 시어와 표현들이 눈에 띈다. ‘당위’와 ‘금지’의 뉘우침 ‘-어야 했네’에 서린 철 지난 회한의 감정은 그러나 ‘그 사람은 돌아오고 나는 거기 없었네’, 상황의 종결점, 내 부재의 확인으로 끝난다. 어떤가, 그것은 우리네 삶의 한 자락을 닮지 않았는가.
나는 이 시에서 드러난 어쩌면 다소 거칠어 보이는 독백 속에 그의 시가 여전히 건강을 잃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팔레스타인 1,300인’이나 ‘평화라는 이름의 칼’ 같은 시에서 드러나는 현실 인식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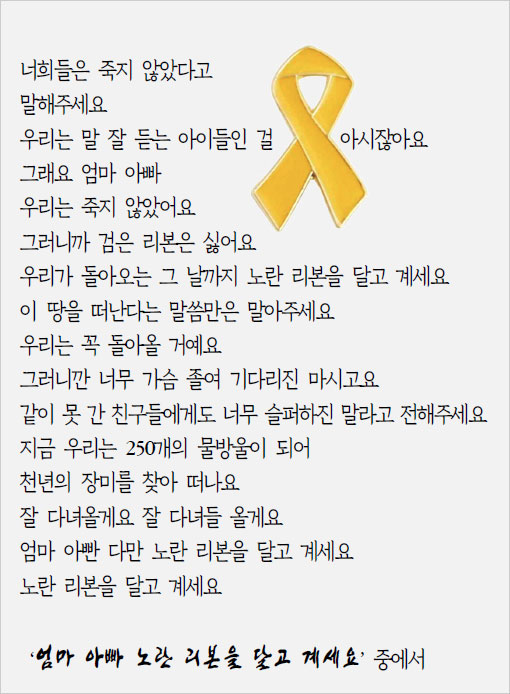
세월호와 함께 심해에 가라앉은 단원고등학교 250여 학생을 그린 ‘엄마 아빠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는 <한겨레>에 연재된 한국작가회의 애도 시 가운데 한 편이다. 시인은 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시인의 외동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내게서 문학을 배웠다. 그 애는 이제 스물몇 살, 처녀가 되었으리라. 시집을 뒤적이면서 나는 잠깐 안상학과 그의 동무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려본다.
2014. 7. 28.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창비의 ‘독점구조’와 김사인의 ‘만해문학상 사절’ (0) | 2022.09.03 |
|---|---|
| 21년차 검사의 ‘부적격 F 평가’를 각오하고 쓰는 대국민 고발장 (1) | 2022.08.18 |
| ‘제국대학의 조센징’, 그 엇갈린 엘리트의 초상 (0) | 2022.06.28 |
| 알라딘의 인터넷 ‘서재’ 이야기 (0) | 2022.05.16 |
| 고은 시 ‘화살’을 읽으며 (0) | 2022.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