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대 시집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김주대 시인이 시집을 낸다는 사실을 나는 우연히 그의 블로그(오마이뉴스 블로그였는데 지금은 서비스 중지됨)에 들렀다가 알았다. 서로의 블로그를 오가며 나누던 교유가 거의 끊긴 것은 그가 블로그에 글은 쓰되, 이웃 ‘마실’을 잘 다니지 않게 되면서부터다. 댓글을 품앗이하는 형식의 블로거 간 교유는 지속적인 내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김주대, ‘소셜 펀딩’으로 시집을 내다
뒤늦게 <오마이뉴스> 블로그(오블)에 자리 잡았지만 매우 정력적인 활동으로 이웃들과 교감하던 김 시인이 ‘마실’ 다니기와 댓글 부조를 끊은 것은 아마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형식을 즐기게 되면서부터인 듯하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년 같은 천진함으로 시와 사진, 그림을 통해 다분히 실험적(?)인 문학 활동을 펼치던 그에겐 블로그보단 ‘페이스북’이 가진 역동성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다.
그는 그림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듯해 쓱쓱 싹싹, 그린 그림의 울림이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인이 그린 그림(그걸 문인화라고 하는 모양이다.)은 지난해 전시회로도 소개가 되었단다. 이래저래 다재다능한 시인의 넘치는 예술적 열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출되었던 셈이다.
이번 새 시집의 출간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 예사롭지 않은 방식 덕분에 <한겨레>에 인터뷰까지 실렸다. [관련 기사 : 혼자 쓰고 울던 시인, 페친들 후원으로 시집 출간]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번 시집을 ‘소셜 펀딩’ 방식으로 냈다. 소셜 펀딩은 소셜 네트워크를 뜻하는 ‘소셜(Social)’과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 (Funding)’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298명의 후원금으로 새 시집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을 펴냈다. 주로 벤처기업이나 영화 제작 등에서 쓰이는 소셜 펀딩이 시인의 시집 출간으로 영역을 넓힌 셈이다. 그는 아마 최초의 소셜 펀딩 시집을 낸 시인으로 기억될 듯하다.
눈 밝은 이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이다. 그의 시집 출간을 전후한 소식을 전하는 내 이야기가 모두 전언(傳言)이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는 걸. 까닭은 간단하다. 나는 그의 숱한 블로그 이웃 중 한 사람으로 그와는 내가 사는 도시에서 한 차례 만나 술잔을 나눈 게 다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의 ‘페친’이 아니었다. 나는 2011년에 두어 달 남짓 페이스북에서 놀다가 탈퇴해 버린 사람이다. 내 담벼락에 도배된 ‘남’의 얘기를 듣는 게 민망하고 그런 형식으로 사회적 교유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글 : 나는 공유되고 싶지 않다]
당연히 나는 그가 시도한 소셜 펀딩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새 시집 출간에 ‘미력’도 보태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말에 서울에서 그의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이른바 ‘페친’들과 함께 블로그 이웃들이 모여서 술잔을 기울였던 모양이다. 시골에 살면서 서울 길로 나서는 게 쉽지 않긴 하지만 나는 거기도 참석하지 못했다. 타고난 게으름에다 몸이 마음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다.

나는 뒤늦게 시집 출간을 댓글로 축하했고 며칠 전에야 그의 새 시집을 온라인서점을 통해서 샀다. 절판된 그의 첫 시집 <도화동 40계단>(청사, 1990) 외에 그가 낸 시집 네 권이 온전히 내 서가에 꽂히게 되었다. 나는 어정쩡한 독후감 형식으로 그의 시집 <꽃이 너를 지운다>(2007)와 <그리움의 넓이>(2013)를 소개한 바 있다. [관련 글 : <그리움의 넓이>]
페이스북에 기반한 역동적 소통의 결과

고교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시를 바라보는 내 눈은 여전히 아마추어의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굳이 그의 시편이 가진 울림과 지평을 난삽한 언어로 재고, 다는 일은 삼가고자 한다. 99편의 시편들이 저마다 가진 울림은 펀딩에 참여한 298명의 페친들의 ‘좋아요’로 갈음하는 걸로 충분할 터이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밝힌 대로 김주대 시인이 가진 매우 자유분방하고 번득이는 감각은 여전히 이 시집에서 살아 있다. 그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사고가 여전히 ‘그리움과 슬픔’과 같은 ‘사람다움’의 정서로부터 비롯하고 있음도 다르지 않다.
그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정서는 어쩌면 블로그라는 ‘낡고’ 더딘 방식보다 그가 2012년부터 입문했다는 ‘페이스북’이 훨씬 잘 어울릴 듯하다.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댓글로 이어지는 블로그를 바탕으로 한 구태의연한 소통에 비기면 실시간으로 손쉽고 훨씬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기반한 새 방식이 훨씬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시집에 실린 99편의 시 가운데서 적지 않은 작품이 한 줄, 또는 두 줄짜리 단형(短形) 시라는 점은 그것이 페북이라는 소통 수단에 어울리는 형식이었기 때문이었을 법하다. 그러나 그것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시인의 사유와 어우러지면서 마치 한 줄의 적지 않은 울림의 잠언처럼 다가온다.
시를 어떻게 이해하든 시를 읽는 것은 결국 독자의 몫이다. 페친들이 시인이 날마다 올려두는 시편에 환호한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새겼기 때문일 것이다. 시집이 “경험과 기억의 진정성이라는 수원(水源)에서 시작하여 시와 삶의 형식에 이르기까지, 두루 성찰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대하고도 역동적인 사유의 도록(圖錄)”(유성호 교수 해설)이 되는 것도 독자들의 몫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전에는 제가 쓴 시를 저 혼자 읽으며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몇천 명 페이스북 친구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 행복하게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 <한겨레> 인터뷰에서
혼자서 울기보다는 몇천 명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백번 낫다. 그에게 다시 시와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펴 준 ‘페친’은 소중하고 고마운 벗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자유분방한 시작과 천착의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 시골 사람들에게 훨씬 멀다. 내년쯤, 내가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서울로 가서 어느 한갓진 선술집에서 그와 한잔 술이라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시 그를 만날 때까지 김주대 시인이 ‘바퀴벌레처럼 잘 죽지도 않는 단단한 시’(‘오래된 상상’)를 끊임없이 써내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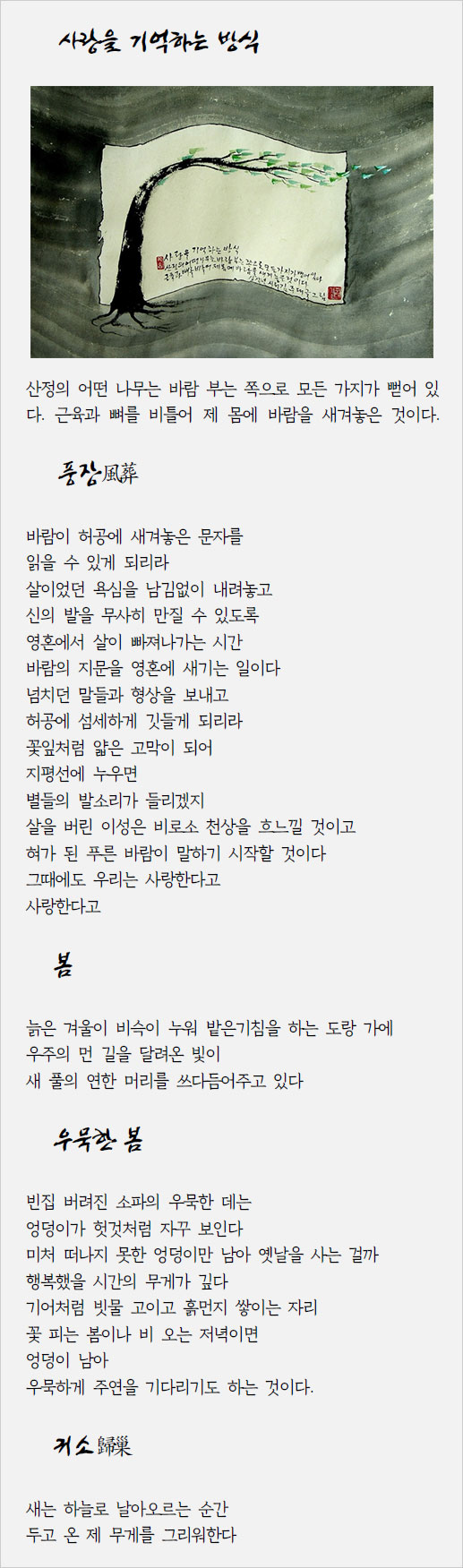
2014. 7. 17.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행복한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흰흰산 이규배 시인, ‘공무도하가’ 해석을 뒤집다 (0) | 2021.08.07 |
|---|---|
| 아빠 용돈을 걱정하는 13살 딸, 눈물겹다 (1) | 2021.07.24 |
| 살아 있는 문학 수업, 김 선생의 ‘교과 나들이’ (1) | 2021.07.10 |
| ‘밥 못 먹여 주는’ 시와 함께 살아온 시인의 20년 세월 (0) | 2021.06.16 |
| 열일곱 아들 때문에…조선 양반이 보낸 ‘욕망의 편지’ (2) | 2021.05.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