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어버이 계시지 않은 ‘어버이날’을 맞으며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공연히 오지랖이 넓어지는 증세가 도진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었다.
“잠깐…, 내일 이야기를 좀 하자. ……무슨 날인지 알지?”
“? ……, !”
“체육대회요!”
“어버이날요!”
“준비들은 하고 있겠지?”
“…….”
“문자나 보내죠, 뭐.”
“꽃이나 달아드려야죠.”
아이들은 좀 풀이 죽은 듯 침묵하거나 다소 심드렁하게 대꾸한다. 아이들에게 내일 치르는 체육대회는 가깝고, 어버이날은 멀다. 열여덟 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나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치기에는 어린 나이고,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자의식을 갖기에는 넘치는 나이다. 뜻밖의 답도 있다.
“부끄러워서요…….”
나는 아이가 말한 부끄러움의 의미를 이해한다. 18살 무렵이라면 나도 그랬으니까. 피를 나눈 어버이에게 마치 타인에게 하듯 ‘감사’와 ‘은혜’를 말하는 것은 낯설고 겸연쩍은 일이다. 금방 표정을 바꾸고 정색을 하는 걸 상대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가 근심스러운 나이다.
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충 그런 요지의 얘기를 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려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나는 내일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살아생전에 따뜻이 모시지 못한 불효가 무거워진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야 불효를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기도 하다…….
너희들이 어디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것은 너희의 뜻과는 무관한 우연 같지만, 어쩌면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인연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단언하건대, 너희들 부모님은 너희를 위해서라면 생살을 기꺼이 베어 팔 수도 있는 분들이다. 그게 부모다.
너희들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꽃 한 송이, 편지 한 구절만으로 어버이들은 배가 부르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하실지 모른다. 그게 부모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좋다.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으로도 고단한 삶에 지친 어버이의 마음은 녹아들 거야…….
잊지 말아라. 열여덟, 너희는 어리지 않다. 부모가 진 짐을 나누지 못하더라도 그 짐이 무겁지 않으냐고 위로하기엔 충분한 나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마음먹고 이날을 맞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오는데 마음이 한없이 쓸쓸해졌다. 새삼스레 부모님의 부재가 아프게 짚인 것이다. 친부모님 대신 내게는 처가에 홀로 남은 장모님이 계신다.
이제 남은 분은 장모님 한 분뿐
주말에 같이 갈까 했는데, 장모님께서 참외를 따 놨으니 가져가라고 전화하셔서 아내가 내일 다녀오기로 했다. 장모님은 올해 일흔여덟, 80 노인이다. 그런데도 아직 일을 벗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다 고추와 참외 농사를 짓고 계신다. 지친 듯한 노인의 얼굴을 뵐 때마다 몸이 오그라드는 죄스러움을 벗지 못한다.
젊은이들처럼 재바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하우스 하나에다 참외(동네 전체가 참외 농사로 유명한 곳이다.)농사를 짓는 까닭은 뻔하다. 철이 되어 몇 상자라도 따내면 쥐어지는 현금이 요긴할뿐더러 시집간 딸네들에게 한 상자씩 보내주는 게 또 한몫이다.
아직도 밭일을 마치지 못하는 노인을 볼 때마다 딸 셋은 물론이거니와 세 사위는 겸연쩍고 죄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이 어디 만만한가.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용을 쓰고 있지만, 노령의 장모 한 분을 모시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장모님은 인근 동리에서 ‘치마 두른 장부’로 불리는 분이다. 며느리와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건사하고 일으킨 수십 년 세월 동안, 당신께서 감내하신 간난의 삶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어렵사리 집안을 꾸려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일했건만 이 노년조차 편안하지 않으니…, 수하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5년여에 걸친 해직 기간, 장모님께선 내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따로 벌이도 없이 월 2, 30만 원쯤 주어지는 생계비에 의지해 살던 때니 쪼들리는 살림이야 말할 수 없었다. 불편한 건 사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딸이다. 그런데도 다섯 해 동안 당신께서는 농조라도 내 선택을 나무라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당신께서는 기운 잃은 딸에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찡그리지 말라’고 하셨고, 늘 주머니가 비어 있는 맏사위의 용돈을 걱정하셨다. 처가에 들르면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장모님께서 아내 몰래 찔러주는 용돈을 받아 나오는 경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다. 당신의 말씀은 한결같았다.
“걱정할 것 없네. 다 잘 될 거야. 자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 선택에 대한 이해를 따로 가지실 만큼 깨인 분은 어차피 아니다. 당신께선 단지 사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신 것일 뿐이다. 장모님뿐 아니다. 워낙 과묵하셨던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처조모님까지도 맏사위, 맏 손서를 씩씩하게 바라보아 주셨다. 그러니 다른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주 힘든 시기에는 따로 여행비용을 쥐여 주시며 식구들 데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신 분이 장모님이셨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장모님께서도 많이 늙으셨다. 여장부다운 패기야 그대로지만 쇠락해진 육신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가끔 지치고 약해진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안쓰럽기 짝이 없다.
그나마 훈장 남편을 둔 맏딸이 안정적으로 사는 편이어서 아내가 가깝지는 않지만 자주 처가를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는 편이다. 농사일이 바쁘면 이삼일씩 아예 거기 묵으며 일을 거들기도 한다. 불평하지 않고 애를 쓰는 아내를 보면 어디서나 맏이의 짐이 만만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맏사위인 나도 그리 빠지는 편은 아니다.
허세가 아니라 나는 언제라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 각오가 되어 있는 편이다. 지난 3월에 당신의 생신 때에는 아내가 머물며 이웃의 노인들에게 음식 대접도 하고 맏이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나는 근무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전화만 하고 말았다. 나중에 당신께선 전화를 거시고 울먹이셨다. 고맙다고. 아이를 보내줘서 생일을 잘 지냈다고. 글쎄, 마땅히 할 일인데 공치사를 듣는 게 겸연쩍기만 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장모님, 건강하게만 지내세요. 제가 제대로 8순 잔치를 모시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껄인 말은 아니다. 아내와 얘기 끝에 나는 필요하면 잔치를 맡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무어가 문제겠는가. 시골에서 잔치 한 번쯤이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문제는 따로 있다. 당신께서는 일은 덜 하시고 건강은 제대로 챙기면서 좀 편하게 여든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어디 편찮으신 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쇠하셨고, 여전히 일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딱히 해결점이 없으니 자식들의 안타까움도 늘어만 갈 뿐이다.
내일 처가로 떠나는 아내에게 나는 그렇게 말해 두었다. 내가 따로 10만 원을 줄게, 당신이 보태서 장모님 용돈 드리고 와. 이것저것 재느라고 손이 오그라드는 아내니 내가 보태주는 게 맞을 듯해서다. 오후에 전화라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문득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싸아해 온다.
홍민, 그러고 보니 오래된 가수다. 이 저음의 가수가 부르는 김소월의 노래 ‘부모’를 무심히 들어본다. 어머니께서 가신 지 어언 7년, 당신께선 24년 전에 먼저 가신 아버지를 만나 이 자식들이 지켜내는 고단한 세월을 지켜보고 계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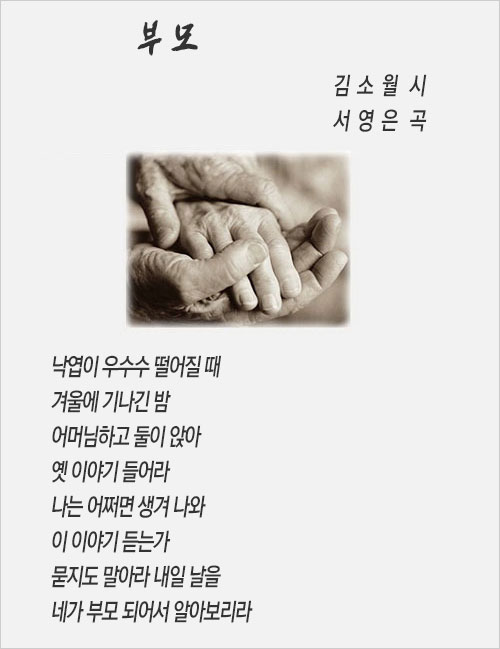
2009. 5. 7. 낮달
장모님께선 2015년 10월 17일에 저세상으로 가셨다. 이 글을 쓰고 꼭 6년 뒤다. 너무 황망히 가시는 바람에 자식들의 애통함도 컸다. 장모님을 여의면서 우리 내외는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이제 명절이면 찾아뵐 어른도 없어진 것이다. 서운하지만 그게 세대의 순환이니 어쩔 것인가. [관련 글 : 배웅, 한 세대의 순환 앞에서]
'이 풍진 세상에 > 길 위에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경북 대선,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0) | 2020.05.11 |
|---|---|
| 참 스승 윤영규, ‘교육 민주화 선언’ 스물세 돌 (0) | 2020.05.10 |
| 세상의 모든 ‘자식들’, 모든 ‘어버이’ (0) | 2020.05.09 |
| ‘짐 되기 싫다’ 목숨 끊는 부모의 길 (0) | 2020.05.07 |
| 메르켈과 아베, 혹은 ‘기억의 간극’ (0) | 2020.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