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오의 시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어제는 아내, 딸애와 함께 장모님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캤다. 노인네가 힘들여 심은 것을 우리는 잠깐의 노동으로 수확해 겨우내 그걸로 궁금한 입을 달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이 다르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노인의 거룩한 노동과 그 결과를 노략질하는 자일 뿐이다.
‘황금들판’이라고 부르기엔 좀 이르지만 10월 초순의 들녘에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여름내 참외를 따냈던 대형 비닐하우스에 막혔다가 이어지는 들판 저편으로 짙푸른 하늘이 성큼 높았다. 드러난 살갗에 감기는 햇볕이 따뜻했고 가끔 이는 바람이 고개 숙인 벼들을 흔들고는 들판 저쪽으로 스러지곤 했다.



사진기를 들고 나는 잠깐 논두렁에 서 있었다. 나락의 낟알은 아직 실해 보이지 않았다. 벼의 낟알이 옹글게 여물려면 얼마간의 햇볕이 더 필요할까. 한로(10월 8일) 지나 상강(10월 24일)으로 가면서 이 들녘은 곧 비게 될 것이었다.
벼와 쌀과 밥
농경 국가로 발전해 온 수천 년 역사에서 논농사의 주곡은 벼, 혹은 나락으로 불리었다. 벼는 방아를 찧어 껍질을 벗겨내면 ‘쌀’이 되었고, 그 쌀을 익히면 주식인 ‘밥’이 되었다. 민중들은 그 ‘밥’에 목숨을 걸고 지배계급의 압제를 견뎌내야 했다.
이성부(1942~2012) 시인은 ‘벼’에서 이 주곡의 생산자인 농민들을 나락으로 비유했다. 김수영이 ‘풀’을 민중으로 비유한 것에 비기면 이는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유였다. 70년대 참여시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이 작품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공동체적 유대, 역사를 위한 자기희생’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관련 글 : 이성부 시인, ‘벼’와 ‘우리들의 양식’ 남기고 떠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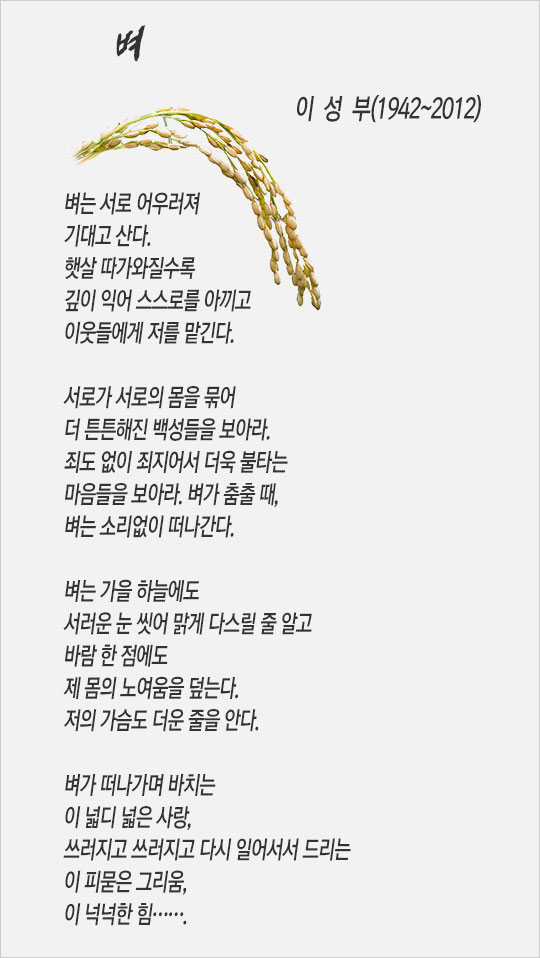


우리 논농사의 주종인 ‘벼’에다 ‘피’를 더해 이를 민중의 상징으로 노래한 이는 경북 의성 출신의 시인 하종오(1954~ )다. 시인은 시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에서 이 민중의 상징을 ‘우리’라고 부르면서 공동체의 동질감(연대의식)을 강조했다.
하종오의 시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피는 벼와 비슷한 아시아 원산의 한해살이풀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오곡의 하나였다고 한다. 피는 벼농사가 잘 안 되는 북쪽 지방, 다른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땅이나 계절에 재배가 가능한 중요한 구황작물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쌀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피는 식용으로 재배되지 않게 되었다.
내 어릴 적 기억에 따르면 피는 논에 벼와 섞인 잡초 취급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가끔 ‘피뽑기’라는 일손 돕기에 동원되곤 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한 잡곡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피는 논에서는 성가신 잡초로 취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맛과 영양도 형편없는 것으로 천대받아 온 듯하다. ‘사람이 초췌하여 풀이 죽고 기운이 없어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듯하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피는 생육 기간이 짧은 데다 중산간지, 간척지, 척박한 저습지 등 토양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생육에 필요한 물 요구량도 적다. 특히 육종이 덜 이루어진 원종에 가까워서 병충해에 강하며 일부 아미노산이나 광물질 함량이 뛰어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곡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고 한다. 천대받아온 피의 ‘반전’이다. [시 전문 텍스트로 읽기]

이성부 시인이 벼를 끈질긴 생명력과 자기희생의 미덕을 지닌 민중으로 바라보았다면 하종오는 거기에 피를 더해 ‘우리’로 묶어낸다. 얼핏 보면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라는 제목은 벼와 피가 서로 다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인은 서로 다르지만, 이전부터 함께 살아온 벼와 피의 동질성을 꿰뚫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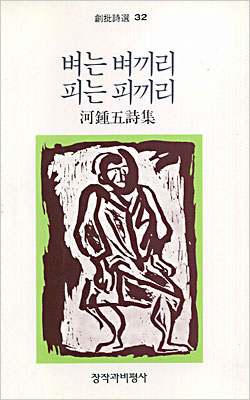
시인은 벼와 피가 ‘넓디넓은 평야 이루기 위해’ 태어났고, ‘아무 데서나’ 잎 돋아내고, ‘흙에 뿌리 박았’다고 노래한다. 넓디넓은 평야는 민초들의 땅, 아무 데서나 뿌리박는 벼와 피는 곧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민중들의 생명과 삶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는 ‘날뛰던 송장 메뚜기’도 잠재워냈다. 송장 메뚜기는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력이면서 드넓은 평야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걸림돌이다. 비록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벼와 피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 시인이 ‘우리야 살기는 함께 살았제’라고 노래하는 까닭이 거기 있다.
화자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민중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낸다. ‘오뉴월 하루 볕’은 벼와 피를 자라게 하는 요소지만 한편으로 거기 드리운 것은 이 땅을 할퀴고 간 한국전쟁(6·25)의 그림자다. 소박한 독백의 형식이지만 이들의 전언은 예사롭지 않다.
벼와 피의 간절한 염원, 통일
뒤이은 ‘총알받이 땅 지뢰밭’에 이르러서야 독자들은 그것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의 비유고, ‘알알이 씨앗’으로 묻히는 벼와 피는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친다. 그 땅에 ‘묻혔다가’ ‘터지면 흩어져 이쪽저쪽 움 돋아 / 우리나라 평야 이루며 살고 싶었’다는 술회 앞에서 비로소 독자들은 이들의 독백이 분단 현실의 극복, 통일에 대한 지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고백은 간절하다. 통일에 대한 염원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참말로’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은 ‘갈라설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은 분단과 대립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벼와 피의 정체는 이 땅에 뿌리박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중이고 그들은 통일을 염원한다. 시는 반복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분단 극복 의지를 심화한다. 공존하는 벼와 피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분단의 비극을 고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이 시를 표제작으로 하는 시집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1981)는 절판되고 없다. 나는 고교 시절에 대구 YMCA 복도에서 열리는 시화전에 들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스무 살의 시인을 기억한다.
첫 시집 이후 시인은 1983년 시집 <넋이야 넋이로다>(창비)로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을 받았다. 그리고 스무 권 가까운 시집을 펴내는 정력적인 시작 활동에 정진했다. 그는 참 치열하게 시를 썼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 비어 있는 20대를 회상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 서가엔 그의 시집이 한 권도 없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그는 2004년 <반대쪽 천국>을 펴내면서 이주민 문제를 화두로 삼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한 시편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가을이 가기 전에 그의 시집을 사서 읽어야겠다고 마음먹는데 어쩐지 마음 한복판으로 휑하니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온다.
2015. 10. 10.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함께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배려와 관용으로 자라는 ‘아이의 세계’ - 빌라드 <이해의 선물> (4) | 2023.12.25 |
|---|---|
| 아이들의 글, 순위를 매겨주세요 (1) | 2021.10.28 |
| 신경림 ‘장미에게’ (0) | 2021.06.29 |
| 너무 많다! ‘대통령의 업적’ (0) | 2021.06.22 |
| 김광규 시 ‘나뭇잎 하나’ (0) | 2021.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