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과꽃, ‘능금’에서 사과까지
[사진] 사과꽃과 시 세 편
*PC에서 ‘가로 이미지’는 클릭하면 큰 규격(1000×667픽셀)으로 볼 수 있음.

사과와 사과꽃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미 장황하게 했다.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는데, 올해는 여러 차례 사과밭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유에스비(USB) 에러로 파일이 손상되는 바람에 한 번 가고 말 걸 두세 번 걸음을 하면서 살펴보니 좀 느낌이 다른 사진이 나왔다. [관련 글 : 성년이 되어서야 만난 ‘사과꽃’, 그리고 사과 이야기]
능금은 한때 ‘사과의 통칭’이었다
우리 세대가 모두 그랬을 듯싶은데, 우리는 사과보다 능금에 더 익숙했다. 경상도라서 더 그랬는지 모른다. 지금도 대구·경북의 과물(果物) 동업조합의 이름이 능금협동조합인 까닭도 거기 있을 것이다. 능금은 예로부터 재래종인 능금나무(Malus asiatica)를 재배했다.
‘능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송나라 손목이 지은 《계림유사(鷄林類事)》(12세기)에 “林樆(임금)은 (고려말로) 悶子訃(민자부)라 한다(林樆曰 悶子訃”라는 언급이다. 송나라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高麗圖經)》(1123)에는 고려에 來檎(내금)이 자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林樆)’과 ‘내금(來檎)’이 능금과 사과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 숙종 때 쓰인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18세기 초)에는 사과(楂果)와 임금(林檎)의 재배법이 각각 실려 있다고 한다.

‘사과’의 옛 형태가 남은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1601)의 ‘ᄉᆞ과’이다. 이 낱말이 《훈몽자회(訓蒙字會)》(1527)에서는 ‘사과(沙果)’, 《산림경제》에서는 ‘사과(楂果)’로 차자(借字) 표기되었다. 19세기까지는 능금나무와 사과나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크기 등의 차이로만 구분해서 불렀으나, 20세기 초 능금나무가 다른 종으로 분류된 뒤에 ‘사과’는 오늘날의 사과를 부르는 말로 정착하였다.



사과가 ‘사과(沙果 : 모래 사, 과실 과)’인 이유
‘사과’의 한자어는 ‘사과(沙果 : 모래 사, 과실 과)’로 ‘모래 과일’의 뜻이다. 이는 사과의 단면이 모래알처럼 오돌토돌한 면이라는 데 연유한 것이라 한다. 사과는 1884년 무렵에 선교사들이 서양 품종을 들여와 관상수로 심었다. 대구·경북 지방에는 1899년 의료 선교사로 온 우드브릿지 존슨(Woodbridge Johnson)이 대구 약전골목에 현재 동산의료원 전신인 제중원을 세우고 집 근처에 미국에서 가져온 사과 72그루를 처음 심었다. 존슨이 심은 사과나무는 잘 자라 뒷날 이름난 ‘대구 사과’의 원조가 되었다. 지금도 청라언덕에는 대구 최초 사과나무의 후손이 자라고 있다.
우리는 사과 대신 능금이라는 이름을 오래 썼는데 사과로 완전히 갈아탄 건 1980년대 이후가 아닌가 싶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1969에 이영숙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을이 오기 전에’라는 대중가요가 크게 히트했다. 그 노랫말에 ‘지난여름 능금이 익어갈 때’라는 구절이 있다. 그게 옛 재래종 능금을 말하는 게 아님은 명백하니, 적어도 70년대까지는 ‘능금’이라는 낱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능금과 사과를 제재로 한 시 세 편을 읽으며
인터넷 검색으로 ‘능금’이라는 시 한 편과 ‘사과꽃’을 제재로 한 시 두 편을 골랐다. 김춘수(1922~2004) 시인의 시 ‘능금’은 ‘능금’이 익어 가는 자연 현상을 통해 존재의 신비를 발견하고 거기서 느끼는 경이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이로움이란 그리움의 숙성과 자연의 교감(交感)에 따른 충만함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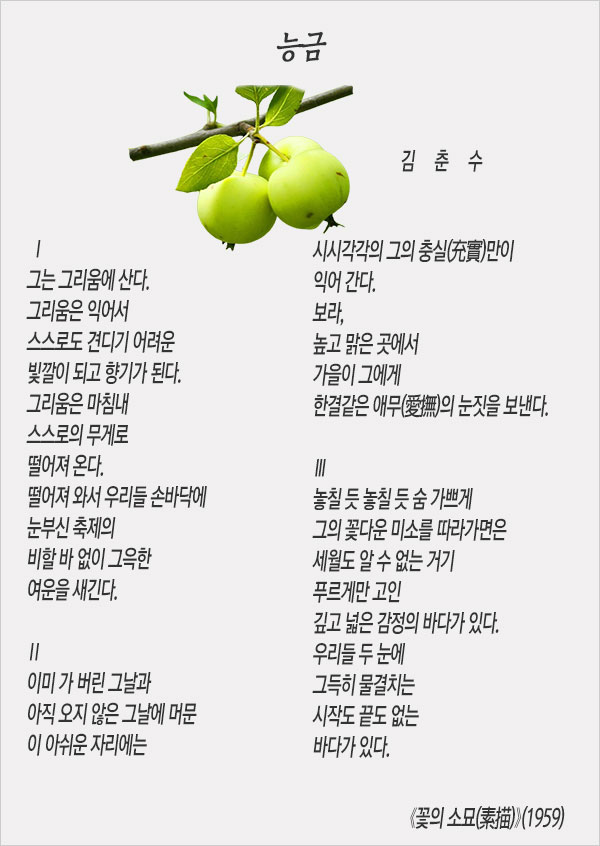

‘그’로 기술되는 능금은 ‘그리움’ 그 자체다. 그것은 숙성하여 빛깔과 향기를 지닌 실체가 되고, 그 자신의 무게로 떨어져 인간에게로 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그 과실에서 ‘깊고 넓은 감정’과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 곧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도종환의 시 ‘사과꽃’에서 사과꽃은 화자의 성장 배경이면서 동시에 그 꿈의 비유이다. 이별이라는 성장의 아픔을 고백하고 나니 사과꽃이 피었고, 그리움을 지우고 나면 하얗게 피는 사과꽃. 사과꽃은 서정적 자아의 꿈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이기도 하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그리움을 가누노라니 어느새 사과꽃이 하얗게 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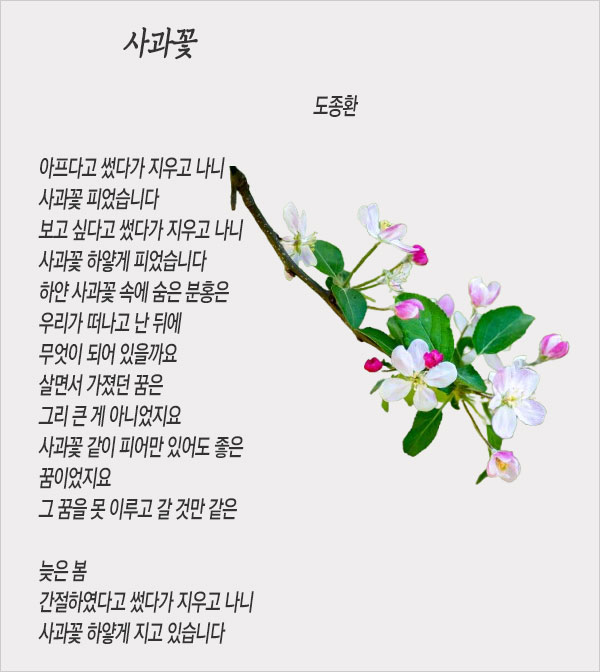

고재종의 시 ‘사과꽃 길에서 나는 우네’는 도종환의 시처럼 사랑과 아픔을 노래한다. 화자는 사과꽃 길을 ‘찰랑찰랑’ 걸어서 떠난 너를 보내고 나서, 모든 길이 그곳으로 열리고, 사과 가지마다 네 얼굴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확인한다. 볼따구니 빨개진 너를 보내고 ‘발목 삔 오랜 그리움’ 속에서, 길이란 길은 모두 네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날로 여기며 화자는 설렌다. 그것은 사랑을 앓고, 또 그것을 잃으며 자라는 모든 사랑의 성장통의 일반적 증상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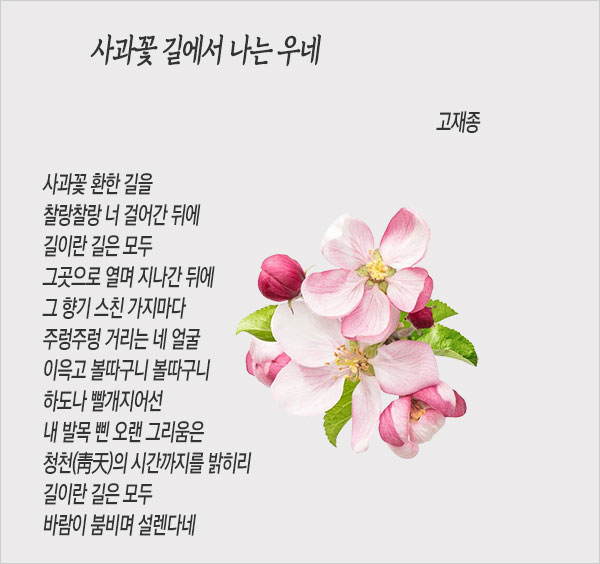

사과꽃은 수더분하면서도 어찌 보면 매우 고혹적이다. 소박해 보이다가도 흘겨보는 아름다운 눈매가 보는 이를 설레게 한다. 진홍빛으로 시작하여 점점 그 빛깔을 흐리면서 사과꽃은 그 진 자리에 열매를 남긴다. 만추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풍요의 과실로 거듭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얗게 피는 사과꽃을 오래 바라본다.
2025. 4. 28. 낮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