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가위 전날이다. 따로 차례를 모시지 않는 우리 집 풍경은 조금 쓸쓸하다. 귀향한 아들 녀석과 제 누이는 어젯밤 내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더니 아직도 늦잠이다. 아내는 ‘그래도 섭섭할까 봐’ 부침개 몇 종류를 준비한다. 대형 전기 팬을 거실 바닥에 놓고 갖가지 준비를 해 놓으면 아이들이 달려들어 거들 것이다.
한가위 전날 풍경
마련할 음식이래야 단출하기만 하다. 쇠고기 산적과 두부전, 명태전을 조금 부치고 나면 명절 준비는 끝이다. 떡을 잘 먹지 않으니 우리 집에선 송편도 준비하지 않는다. 명절이라고 식솔들을 이끌고 가야 할 본가도 큰집도 없으니 내일 성묘를 마치고 아이들 외가를 들러 오면 그뿐이다.
여든이 내일모레인 장모님이 손자와 함께 지키고 있는 처가의 고적(孤寂)을 우리 식구가 흩트려 놓을 것이다. 처제 둘 중 하나는 못 온다는 기별이 왔다. 오랜만에 벌인 가족들의 법석 앞에서 안노인이 받는 위로는 얼마나 되겠는가. 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버린 빈집에 남겨질 노인과 소년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해진다.

늦은 아침을 들고 난 아이들이 저희 엄마를 도와 거실 바닥에다 신문지를 깔고 전 부칠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컴퓨터를 켠다. 마땅히 저희와 함께 아내를 거들어야 할 터이지만, 그럴 기회는 좀체 없다. 하다 못해 설거지하는 것도 내가 조금 거들라치면 아이들이 만류하는 편인 까닭이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아내의 가사노동을 기꺼이 돕는 세대는 아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성일 뿐, 몸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다. 나는 가사노동이 전업주부인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아비가 거기 나서는 걸 구경만 하기에는 편하지 않을 터이다.
‘명절증후군’이라는 새말을 만들어 낼 만큼 명절에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사노동은 만만찮다. 그게 어찌 단순한 노동량의 문제만이겠는가. 문제는 명절마다 연출되는 가족들의 화목과 동질성 확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소외다. 음식을 장만하고 차례상을 차리는 주체면서도 참례보다는 설거지나 담당해야 하는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명절 풍경의 구조적 모순 말이다.
어느새 전 부치는 냄새가 좁은 실내를 가득 채운다. 어저께 우연히 만난 문정희 시인의 시 ‘작은 부엌 노래’를 읽는다. ‘불평등한 결혼 제도’를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과 ‘여성의 변화’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맞춤한 시다. [시 전문 텍스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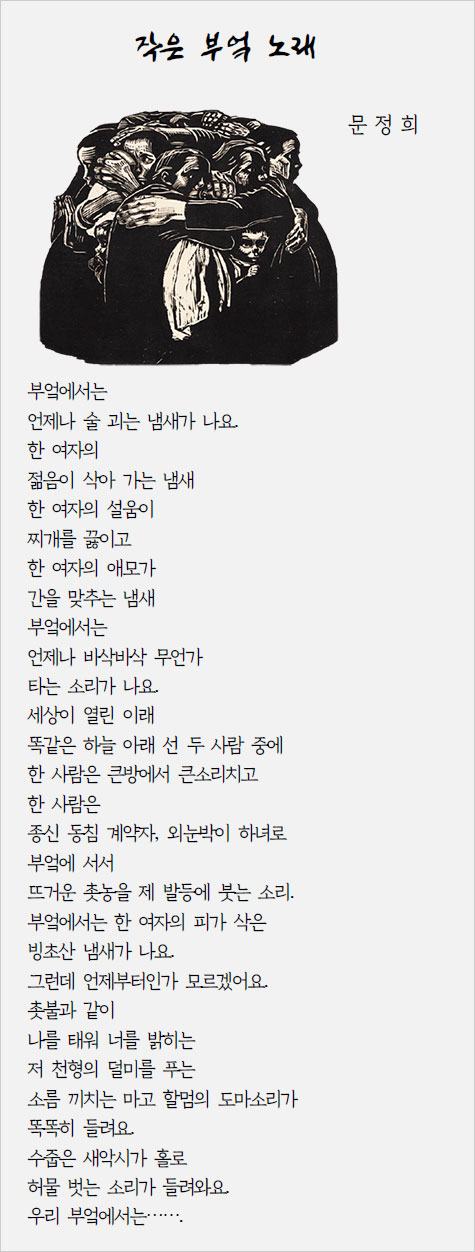
불평등한 결혼 제도, 문정희의 ‘작은 부엌 노래’
‘세상이 열린 이래 / 똑같은 하늘 아래 선’ 사이지만 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거기서 ‘종신 동침 계약자’로, ‘외눈박이 하녀’로 ‘뜨거운 촛농’을 발등에 부어야 했던 여자는 어느 날 ‘마고 할멈의 도마 소리’를 듣는다.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 허물 벗는 소리’도 듣는다.
마고 할미는 우리나라 신화의 원형, 창세신화의 주인공이다. 환웅이나 단군 같은 남성 신이 아니라 여성성을 띤 천신(天神)이다. 그이의 도마 소리는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 저 천형의 덜미를 푸는 / 소름 끼치는’ 소리’다. 당연히 그이가 도마 위에서 만들어내는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세상’일 터이다.
오랜 질곡의 삶, 그 구각(舊殼)을 깨고 ‘허물’을 벗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가 된다. 여성의 깨달음을 통해 그 의미는 바야흐로 사회화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그 작은 부엌에서 세상은 시나브로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인의 노래는 벅차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다.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나영이 사건’은 이 땅에 켜켜이 쌓인 성적 불평등, 그 부당한 권력 관계의 현주소요, 그 미니어처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전을 부치고 있는 딸애가 가꾸어갈 세상은 어떨까. 그 옆에서 도우미 노릇을 하는 아들아이가 만들어 갈 세상은 또 어떨지……. 나는 우리 세대가 미루어 놓은 이 과제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의 마지막 구절을 천천히 되뇌어 보았다.
2009. 10. 2. 낮달
'이 풍진 세상에 > 마이너리티(minority)를 위하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 못 해도 대체복무제는 찬성 (0) | 2019.10.26 |
|---|---|
| 문정희 시인, 여자의 ‘몸속 강물’을 노래하다 (0) | 2019.09.27 |
| 로자 파크스, 행동과 참여 (0) | 2019.02.26 |
| 다시 난설헌을 생각한다 (2) | 2019.02.10 |
| 성차별, 2013년 미국과 대한민국 (0) | 2019.02.07 |





댓글